비강과 부비동의 악성종양은 전체 악성종양의 약 1% 이하이며, 두경부 악성종양의 약 3%를 차지하는 드문 종양이다[
1,
5]. 비부비동암의 최초 내원 시 증상은 코막힘, 콧물, 두통, 안면부 압박감 및 후각 저하 등 알레르기 비염 및 비부비동염을 비롯한 보다 흔한 양성 질환에서도 자주 관찰되며, 양성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악성 종양의 진단이 늦어질 수 있다. 이비인후과적 증상에 동반된 치통, 안면 변형, 개구장애, 두경부 신경병증, 눈물 과다, 복시, 시력저하 및 안구돌출 등의 증상은 악성질환의 높은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세심한 평가를 요한다[
6,
7]. 조직학적으로는 편평세포암종이 약 42%-90%를 차지하며 가장 흔하게 분포하는 암종으로 보고된다[
2,
5,
8]. 그 다음으로는 선암종, 성숙 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 신경상피종성 신생물 등이 흔하게 보고된다[
5]. 선암종은 사골동에 가장 흔하게 기원하며, 이는 발암물질들이 주로 중비갑개에 부착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선암종의 5년 생존률은 약 40%-60% 정도로 보고된다[
4]. 장형 선암종은 비교적 드문 아형으로 유럽에서는 10만 명당 남성에서 0.26명, 여성에서 0.04명의 연령표준화발생률을 보이며, 미국에서는 10만 명당 남성에 0.058명, 여성에서 0.034명의 연령 표준화발생률을 보고하였다[
9]. 장형 선암종은 대부분 남성에서 발생하며, 호발연령은 평균 50-64세로 보고된다. 발병위치는 사골동(40%), 비강(25%), 그리고 상악동(20%) 순으로 흔하며 인접한 구조물 침범이 흔한 공격적인 임상양상을 보인다[
3]. 비부비동의 장형 선암종 중 장형 선암종의 경우 특징적으로, 장기적인 직업적 노출과 연관이 있다. 목공 종사력 및 목재분진 노출력은 비부비동암에 2배의 오즈비를 보이는데, 선암종에 국한할 경우 13-41배의 오즈비를 보인다[
6,
10]. 포름알데히드, 가죽 분진, 니켈, 크롬, 탄닌 등 또한 연관있는 발암물질로 제시되고 있다[
1,
2,
4]. 본 증례의 경우 상기 유발요인들에 대한 명확한 노출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장형 선암종은 타액선형 선암종과 비장형 선암종에 비해 비교적 나쁜 예후를 보이기 때문에 감별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 전자는 직업적 노출과 연관이 있으며 후자는 없는 것이 하나의 감별점이고 면역조직화학염색 또한 감별에 도움을 주는데, 장형 선암종은 면역표지자 CK20, CDX-2, villin, MUC-2이 확인된다. 그리고 장형 선암종의 경우 전이성 위장관암과의 감별이 필요한데, 특히 장상 그리고 점액상 장형 선암종의 경우 조직학적 소견만으론 위장관암과 구분이 어렵다. 장형 선암종과 위장관암 모두 CK20, CDX-2, MUC2, villin의 발현을 보이지만 CK7 양성소견이 장형 선암종을 시사할 수 있다. 또한 부비동암의 발암과정의 초기 단계에 일어나는 형태학적 변화를 관찰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명확한 조직학적인 변화를 발견하진 못하였고 이에 분자상의 변화를 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Valente 등은 목재 분진에 대한 노출로 선암종의 발병 위험이 높은 환자군에서 p53의 과발현을 보고한 바 있다[
1,
11]. 비부비동 선암종의 치료는 수술적 절제 및 수술 후 방사선치료가 고려된다[
3,
5,
8]. 다만 비부비동암의 경우 안와, 두개저 등 중요한 구조물에 인접해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술 방법은 비외 접근법과 내시경적 접근으로 나뉜다. 내시경 수술의 경우, 이환율이 적고 미용적 우수함으로 인해, 종양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내시경적으로도 충분한 안전연을 확보하며 완전한 절제가 가능할 경우 선호된다. 비외 접근법의 경우, 종양의 침범 범위에 따라 부분 상악절제술, 상악 전절제술, 근치적 상악절제술, 그리고 전두개저 및 안와첨부 등이 침범된 경우 두개안면 절제술 등이 시행된다[
4,
8,
12]. 본 증례의 경우, 상악동 외부 구조물까지 침범이 의심되어 종양의 완전한 절제를 위해 비외 접근법으로서 상악전절제술을 계획하였다. 비부비동 선암종은 일반적으로 비특이적인 임상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진행되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 성적이 나쁜 것으로 생각된다. 선암종의 5년 생존율은 약 50%이며, 대부분의 환자가 3기 이상의 진행된 병기에서 발견된다. 또한 수술 단독치료에 비해 수술과 방사선치료의 병행이 보다 나은 예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형 선암종의 경우, 일반적으로 타액선형과 비장형 선암종에 비하여 보다 침습적인 임상양상을 보이며 국소 재발율도 보다 높게 확인된다. 장형 선암종 중 고형상 및 점액상 선암종이 다른 아형에 비해 일반적으로 예후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13]. 본 증례의 경우 점액상 장형 선암종으로서, 비록 상악 전절제술 및 경부절제술을 통해 완전한 수술적 절제 및 수술 후 보조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지만, 조직학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주기적인 추적관찰 및 영상검사를 통한 재발의 조기 진단 및 관리가 필수적일 것이라 사료된다. 본 증례는 인증된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았다(IRB No. KYUH 2024-01-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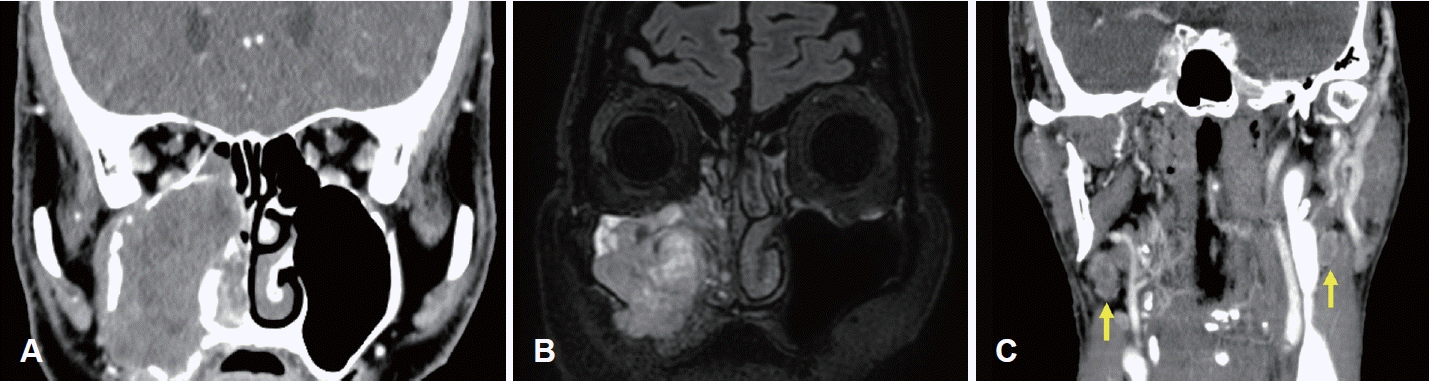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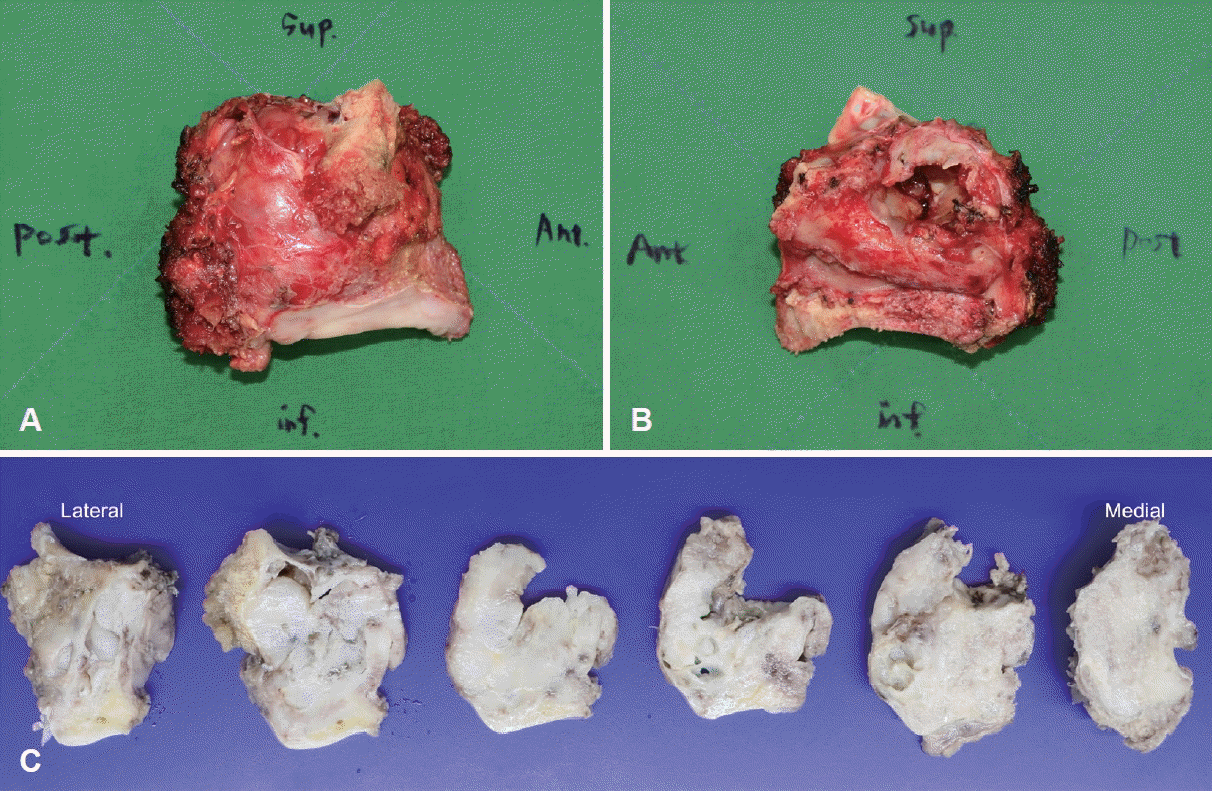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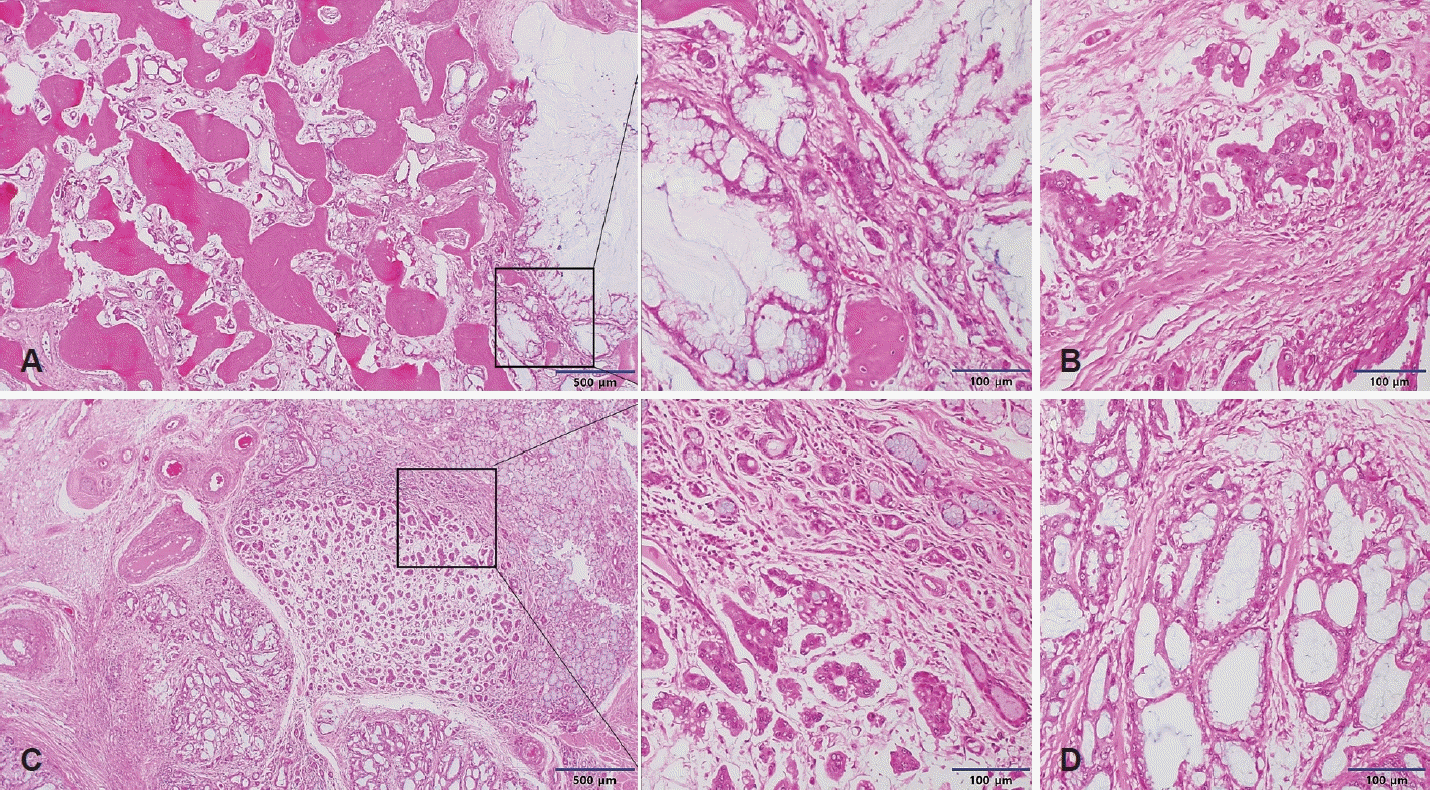




 PDF
PDF Citation
Citation Print
Pr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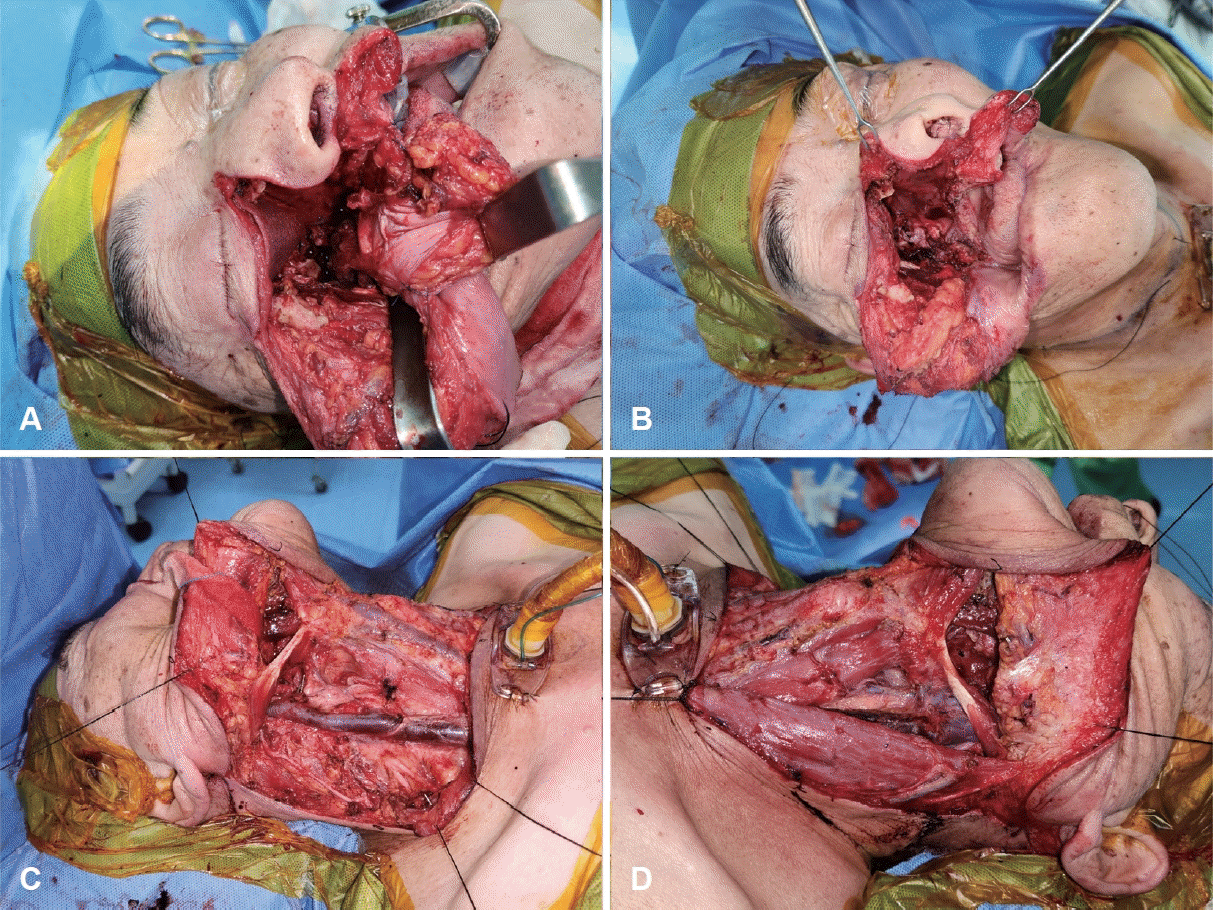
 XML Download
XML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