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ang J, Jang YY, Kim J, Han SH, Lee KR, Kim M, et al. South Korea’s responses to stop the COVID-19 pandemic. Am J Infect Control. 2020; 48(9):1080–6.

3. Center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and Center Disease Control Headquarters. Occurence status [Internet]. Osong: Center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and Center Disease Control Headquarters; 2023 [cited Feb 20, 2023]. Available from:
https://ncov.kdca.go.kr/.
4. Center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and Center Disease Control Headquarters. Public advice & notice [Internet]. Osong: Center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and Center Disease Control Headquarters; 2023 [cited Feb 20, 2023]. Available from:
https://ncov.kdca.go.kr/duBoardList.do.
5. Ha BY, Bae YS, Ryu HS, Jeon MK. Experience of nurses in charge of COVID-19 screening at general hospitals in Korea. J Korean Acad Nurs. 2022; 52(1):66–79.

6. Kim HY, Kim M, Jung SO, Kim HJ. The experience of ward nurses participating in COVID-19 patient care. J Korea Soc Wellness. 2022; 17(1):311–21.

7. Chung S, Seong M, Park JY. Nurses’ experience in COVID-19 patient care. J Korean Acad Nurs Adm. 2022; 28(2):142–53.

8. Kim GH, You JO, Lee M, Choi Y, Lee YM, Shin JH. Factors affecting burnout among tertiary hospital nurses during the COVID-19 outbreak.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21; 30(4):390–9.

9. Sullivan D, Sullivan V, Weatherspoon D, Frazer C. Comparison of nurse burnout,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Nurs Clin North Am. 2022; 57(1):79–99.

11. Shin R, Baek HJ, Ahn DB. Influence of job stress and resilience on the burnout of nurses who works at the designated public relief hospital. J Korea Cont Assoc. 2021; 21(9):595–608.
12. Kim H, Kim D, Kim M, Kim Y, Bang S, Lee G, et al. Factors influencing burnout of nurses working in a hospital nationally designated for COVID-19 patients. Korean J Adult Nurs. 2022; 34(1):74–84.

13. Park SM, Ha YJ. Effects of job stress, social supprt, and resilience on burnout of nurses in the national infectious disease hospital. J Korea Soc Wellness. 2022; 17(4):75–81.

14. Hong JY, Chae J, Song MR, Kim EM. A utilization strategy of nursing staff by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nurse staffing level of medium and small-sized hospitals. J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 2017; 18(8):162–70.
15. Demerouti E, Bakker AB, Nachreiner F, Schaufeli WB. The job demands-resources model of burnout. J Appl Psychol. 2001; 86(3):499–512.

16. Fletcher D, Sarkar M. Psychological resilience. Eur Psychol. 2013; 18(1):12–23.

17. Kim JS, Choi JS. Factors influencing emergency nurses’ burnout during an outbreak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in Korea. Asian Nurs Res (Korean Soc Nurs Sci). 2016; 10(4):295–9.

19. Na YJ.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oldenburg burnout inventory (OLBI) [dissertation]. Suwon: Ajou University;2013. Korean.
20. Park MM, Park JW. Development of resilience scale for nurses. J Korean Acad Fundam Nurs. 2016; 23(1):32–41.

21. Kim SH, Park SH. Verification of validity and reliability of resilience scale for nurses. JKDAS. 2016; 18(4B):2257–69.
22. Lee HJ, Jung M. The effect of workplace bullying, job str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in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s. J Korea Cont Assoc. 2020; 20(8):572–82.
23. Hwang S, Kwon KT. Burnout among healthcare workers during COVID-19 pandemic. Korean J Healthcare Assoc Infect Control Prev. 2022; 27(1):28–34.

24. Seo YE, Kim HC, Yoo SY, Lee KU, Lee HW, Lee SH. Factors associated with burnout among healthcare workers during an outbreak of MERS. Psychiatry Investig. 2020; 17(7):674–80.

25. Oh H, Lee NK.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lived experience of nurses caring for patients with COVID-19 in Korea. J Korean Acad Nurs. 2021; 51(5):561–72.

26. Karasek RA Jr. Job demands, job decision latitude, and mental strain: implications for job redesign. Adm Sci Q. 1979; 24(2):285–308.

27. Budisavljevic A, Kelemenic-Drazin R, Silovski T, Plestina S, Plavetic ND. Correlation between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burnout syndrome in oncologists amid the Covid-19 pandemic. Support Care Cancer. 2023; 31(4):207.

28. Jo S, Kurt S, Bennett JA, Mayer K, Pituch KA, Simpson V, et al. Nurses' resilience in the face of coronavirus (COVID-19): an international view. Nurs Health Sci. 2021; 23(3):646–57.
29. Stacey G, Cook G. A scoping review exploring how the conceptualisation of resilience in nursing influences interventions aimed at increasing resilience. Int Pract Dev J. 2019; 9(1):1–16.

30. Henshall C, Davey Z, Jackson D. Nursing resilience interventions-a way forward in challenging Healthcare territories. J Clin Nurs. 2020; 29(19-20):3597–9.





 PDF
PDF Citation
Citation Print
Pr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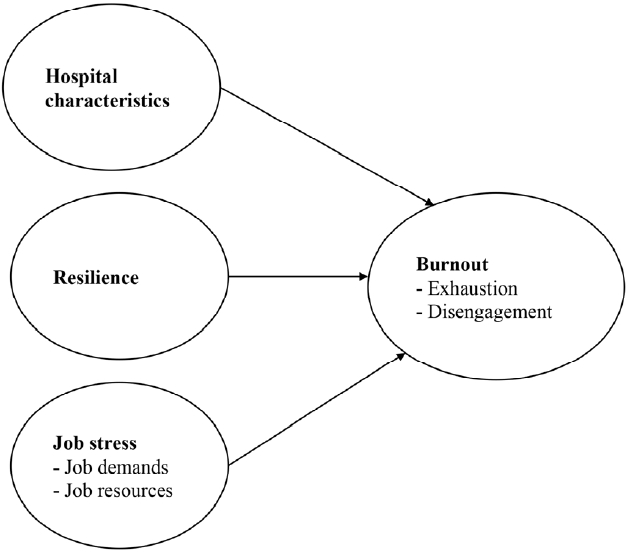
 XML Download
XML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