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A medial opening wedge supramalleolar osteotomy (SMO) introduced by Takakura et al. is a useful realignment procedure for patients with ankle joint arthritis and varus malalignment by shifting the weight-bearing axis laterally and redistributing the loads on the ankle joint. When pain persists after arthroscopic microfracture in patients with medial osteochondral lesion of the talus (OLT), redo arthroscopy, osteochondral autograft transplantation, autologous chondrocyte implantation, or matrix-induced chondrogenesis might be indicated. On the other hand, there is in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for realignment surgery through SMO, while the effect of realignment surgery has been studied consecutively for osteochondral lesions of the knee. Therefore, this paper reports a patient with medial OLT who underwent redo arthroscopy combined with SMO for persistent pain after primary arthroscopic microfracture.
Go to : 
거골에 발생한 골연골병변은 족관절과 접하고 있는 거골 덮개의 연골 손상 및 이와 동반된 연골하골의 골수부종 혹은 낭종성 병변을 모두 아우르는 범주의 질환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병변의 위치 및 크기에 따라 접근법 및 치료방법이 달리 선택될 수 있겠으나 술기가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일반적으로는 관절경 하 미세골절술(arthroscopic microfracture)이 일차적인 치료방법으로 선호되고 있다. 관절경적 미세골절술은 장기 추시상 65%∼90%의 환자에서 양호 또는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1) 관절경적 미세골절술 이후 충분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동일한 부위에 통증이 남는 경우 치료의 실패로 생각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절경 하 이차 미세골절술1)이나 자가골연골 이식술,2) 자가연골세포 이식술,3) 골수흡인물 농축액 및 기질유래 연골형성4)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슬관절에서 골연골병변의 치료 방법으로 고위 경골 절골술(high tibial osteotomy)을 통한 관절 재정렬술을 이용하는 데에 비해5,6) 족관절의 골연골병변에서 절골술을 통한 관절 재정렬술의 효과가 발표된 바는 아직까지 없다.
족관절에 발생한 내반 관절염에서 관절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시행되는 내측 개방성 쐐기형 과상부 절골술(medial opening wedge supramalleolar osteotomy)의 경우 관절을 재정렬시키고 거골의 중심을 외측으로 전위시켜 수술 이후에 족관절에 부하되는 하중의 분산 정도를 변화시키는 술식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본 술식을 통하더라도 거골의 경사는 교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골의 경사 정도가 심하지 않고 족관절 내과와 거골 내측 관절면의 소실만 유발되어 있는 Takakura 병기 2기나 3A기의 내반 관절염에서 유용한 술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저자들은 관절경 하 미세골절술을 시행 받은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거골의 내측 골연골병변을 가진 환자에 대하여 과상부 절골술을 동반한 이차 관절경 수술을 시행하여 치료한 경험을 관련된 연구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과상부 절골술을 이용한 관절 재정렬 및 하중 재분산을 통하여 관절경적 미세골절술로 실패한 거골의 내측 골연골병변의 통증 경감 및 골연골병변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증례보고는 저자들의 소속기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IRB no. 2023-01-011).
Go to : 
과거력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54세 여자 환자로, 내원 3년 전 계단에서 내려오던 도중 발을 헛디디면서 접질린 뒤부터 좌측 족관절 통증이 발생하였다. 타 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거골의 내측 골연골병변이 확인되어 6개월간 경구용 소염진통제, 물리치료 등을 포함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 2년 반 전 관절경 하 미세골절술을 시행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 2년 이상 보존적 치료 및 주기적 경과관찰을 하였음에도 통증이 크게 경감되지 않았기에 재수술을 권고받아 본원으로 내원하였다. 족관절의 통증은 장시간 서있거나 오래 걸을 때 악화되는 양상이었으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 특히 불편감이 커진다고 호소하였다. 신체 검진상 족관절 내측에 압통이 확인되었고 관절 주변부로 전반적인 부종이 관찰되었다. American Or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 (AOFAS) 족관절 및 후족부 점수는 64점, Foot & Ankle Ability Measure (FAAM) 측정 항목 중 일상생활(activity of daily living)이 52점(84점 만점), 스포츠 항목에서 13점(32점 만점)으로 측정되었다. 족관절 기립 방사선 전후면(Fig. 1A) 및 측면(Fig. 1B) 검사에서 특이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는 않았으며 경골천장 및 거골은 지표면에 대해서 경도의 내반위에 존재하였고, 후족부 정렬상(Fig. 1C) 검사에서는 후족부의 외반이 관찰되었다. 측정 가능한 방사선학적 지표 중 경골전방관절면각(tibial anterior surface angle)은 88°, 거골경사각(talar tilt)은 0.2° 내반, 경골측면관절면각(tibial lateral surface angle)은 78°로 확인되었다. 관절연골 상태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검사의 T2강조영상에서(Fig. 2) 이전에 수술 받았던 거골의 내측 관절면의 연골 손상 및 작은 낭종형태로 골수 내 신호증강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술 이후에도 거골의 내측 골연골병변이 완전히 치료되지 못하고 여전히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환자와의 충분한 상의 후 거골의 내측 골연골병변에 대한 이차 관절경 수술 및 족관절의 체중 부하 축을 변화시켜서 통증을 경감시키고 골연골병변의 회복을 돕고자 비골절골을 동반하지 않는 경골의 과상부 절골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수술은 전신마취하에 앙와위에서 시행되었으며, 우선 발목 관절경 검사를 시행하여 거골의 내측 골연골병변을 확인하고 변연절제술 및 미세골절술을 다시 시행하였다(Fig. 3A). 이후 내측 과상부에서 경비인대결합의 근위부를 향하여 외측 피질골의 일부를 남긴 채 전동톱을 이용하여 절골을 실시하였으며 내측 절골부위를 개방시키고 6 mm 쐐기가 부착된 Puddu 금속판(Arthrex Inc., Naples, FL, USA)을 고정하였다(Fig. 3B, C).
수술 후 6주간 단하지 석고 고정을 실시한 채로 목발을 이용하여 체중 부하를 금지시켰으며 이후 석고 고정을 제거하고 부분적 체중 부하부터 서서히 시작하였다. 수술 후 3개월째 절골부위가 유합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한 후에 완전 체중 부하 및 스포츠 활동을 허용하였다. 2차 수술 후 최종 3년 5개월까지 외래 추시하였으며 최종 추시 때 촬영한 방사선 사진상 경골천장 및 거골이 지표면에 대하여 외반위로 변화되었고 후족부의 정렬은 술 전보다 더욱 외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 경골전방관절면각은 94°, 거골경사각은 술 전과 마찬가지로 0.2° 내반, 경골측면관절면각은 81°로 계측되었다. 일상생활 및 장시간 보행, 운동 중 통증 및 불편함을 전혀 호소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AOFAS 점수상 92점, FAAM 일상생활 항목이 77점, 스포츠 항목에서 24점으로 술 전보다 크게 향상되었다.
Go to : 
본 증례를 통하여 저자들은 소위 실패한 미세골절술(failed microfracture), 즉 관절경 하 골수자극술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거골의 내측 골연골병변에서 이차 관절경 수술과 함께 내측 개방성 쐐기형 과상부 절골술을 시행하여 좋은 임상적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러한 임상적 결과의 개선이 이차 관절경 수술로 인한 것이었는지, 과상부 절골술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는지는 대해서는 본 증례 하나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고 이차 관절경 수술 없이 과상부 절골술만을 시행한 환자군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Savva 등7)은 낭종성 변화를 동반하지 않고 2.0 cm2 미만의 중간 크기 이하 골연골병변이라면 이차 관절경 수술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거골의 골연골병변 이차 관절경 수술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살펴보면8) 일차 관절경 수술에 비해서는 결과가 일정하지 않고 임상적 개선을 이루더라도 그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약 1/3의 환자에서는 이차 관절경 수술 이후에 또 다른 수술이 요구되었다고 보고하며,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환자군에 대한 확실한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추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유사한 주제에 대해 발표한 Choi 등1)의 연구에서도 이차 관절경 하 미세골절술은 연골 손상의 크기가 150 mm2 미만이고 연골하골의 변성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분별력 있게 사용되어야만 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서론에서 제시했던 대로 실패한 일차 관절경 하 골수자극술에 이후 이차 관절경 수술 이외에 고려할 만한 선택지로는 자가골연골 이식술,2) 자가연골세포 이식술,3) 골수흡인물 농축액 및 기질유래 연골형성4)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중 자가골연골 이식술이나 자가연골세포 이식술의 경우 공여부인 슬관절에 동통 및 추가적인 절개 및 수술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위에서 언급된 세 가지 술식 모두에서 관절경적 접근이 어려운 경우 추가적인 내과절골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과절골술로 인한 관절면 불일치로 인하여 새로운 통증이 발생하거나 기존 통증이 술후에도 잔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반면 본 증례에서 실시한 과상부 절골술의 경우 실제 문제가 발생한 족관절의 연골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술식이 아니기 때문에 술자나 환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거골 경사도가 작고 관절염의 소견이 동반하지 않은 단순 골연골병변에 시행하는 경우이므로 현재 정립되어 있는 과상부 절골술의 적응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슬관절에 발생한 골연골 결손에 대하여 고위 경골 절골술을 통한 정렬변화를 유도하면 연골 결손부에 대한 응력집중이 분산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5) 최근에는 국소적인 골연골 결손에 대해서도 자가골연골 이식술과 함께 고위 경골 절골술을 시도하는 방법까지 발표되고 있다.6) 이에 비해 족관절에서 발생한 거골의 골연골병변의 경우 내반 변형이 동반되어 있고 크기가 큰 낭종성 골연골병변에서 자가골연골 이식술과 함께 원위 경골 이중 절골술을 시행하여 발표된 적은 있지만9) 내반 변형이나 내측 관절 간격의 좁아짐 없이 단순히 골연골병변만 있는 경우 경골 절골술을 시행하여 치험한 예는 아직까지 발표된 바가 없다.
Kim 등10)은 거골의 골연골병변에 있어서 과상부 절골술 혹은 과하부 절골술을 통하여 하지의 정렬을 교정하여 병변을 치료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며, 아직까지 그 수가 많지는 않으나 향후 치료의 새로운 축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저자들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나 아직까지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좋은 결과가 보고되고 있고 술식이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는 일차 관절경 하 골수자극술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본 증례처럼 1) 일차 관절경에 실패하여 수술적 치료가 다시 필요한 경우 시행에 큰 부담이 없는 이차 관절경 검사와 동반하여 시행하거나, 2) 일차 관절경 하 골수자극술을 할 때라도 수술 실패의 가능성이 있는 골연골병변이라면(크기가 크거나 낭종을 동반한 경우, 거골 어깨 쪽 병변) 일차 관절경 술식과 함께 과상부 절골술을 고려해 봄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향후 많은 연구 결과가 쌓이고 임상적 유용성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모인 이후에 적응증을 넓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요약하면, 일차 관절경 수술에 실패한 거골 내측 골연골병변에 대해서 내반 변형이 동반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차 관절경 수술과 함께 족관절의 정렬 변화를 통하여 부하되는 하중의 분산 정도를 바꾸어 주는 과상부 절골술을 통하여 좋은 임상적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방사선학적 지표 중에는 거골 및 경골 천장의 지표면에 대한 위치가 수술 전 내반위에서 수술 후 외반위로 바뀐 것이 주목할 만하였으며, 추후 본 술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Go to : 
REFERENCES
1. Choi WJ, Park KH, Lee M, Chung K, Lee JW. 2015; Redomicrofracture as a treatment for osteochondral lesion of talus after the failure of arthroscopic microfracture. J Korean Foot Ankle Soc. 19:43–6. doi: 10.14193/jkfas.2015.19.2.43. DOI: 10.14193/jkfas.2015.19.2.43.

2. Yoon HS, Park YJ, Lee M, Choi WJ, Lee JW. 2014; Osteochondral autologous transplantation is superior to repeat arthroscopy for the treatment of osteochondral lesions of the talus after failed primary arthroscopic treatment. Am J Sports Med. 42:1896–903. doi: 10.1177/0363546514535186. DOI: 10.1177/0363546514535186. PMID: 24907287.

3. Kim JS. 2015; Autologous chondrocyte implantation as a secondary procedure after failed microfracture for osteochondral lesion of talus. J Korean Foot Ankle Soc. 19:7–10. doi: 10.14193/jkfas.2015.19.1.7. DOI: 10.14193/jkfas.2015.19.1.7.

4. Kim BS, Na Y, Kwon WH. 2020; Operative treatment for osteochondral lesions of the talus: bone marrow aspirate concentrate and matrix-induced chondrogenesis. J Korean Foot Ankle Soc. 24:61–8. doi: 10.14193/jkfas.2020.24.2.61. DOI: 10.14193/jkfas.2020.24.2.61.

5. Mina C, Garrett WE Jr, Pietrobon R, Glisson R, Higgins L. 2008; High tibial osteotomy for unloading osteochondral defects in the medial compartment of the knee. Am J Sports Med. 36:949–55. doi: 10.1177/0363546508315471. DOI: 10.1177/0363546508315471. PMID: 18413679.

6. Agarwalla A, Christian DR, Liu JN, Garcia GH, Redondo ML, Gowd AK, et al. 2020; Return to work following high tibial osteotomy with concomitant osteochondral allograft transplantation. Arthroscopy. 36:808–15. doi: 10.1016/j.arthro.2019.08.046. DOI: 10.1016/j.arthro.2019.08.046. PMID: 31870751.

7. Savva N, Jabur M, Davies M, Saxby T. 2007; Osteochondral lesions of the talus: results of repeat arthroscopic debridement. Foot Ankle Int. 28:669–73. doi: 10.3113/FAI.2007.0669. DOI: 10.3113/FAI.2007.0669. PMID: 17592696.

8. Arshad Z, Aslam A, Iqbal AM, Bhatia M. 2022; Should arthroscopic bone marrow stimulation be used in the management of secondary osteochondral lesions of the talus? A systematic review. Clin Orthop Relat Res. 480:1112–25. doi: 10.1097/CORR.0000000000002134. DOI: 10.1097/CORR.0000000000002134. PMID: 35130190. PMCID: PMC9263474.

9. Li X, Zhu Y, Xu Y, Wang B, Liu J, Xu X. 2017; Osteochondral autograft transplantation with biplanar distal tibial osteotomy for patients with concomitant large osteochondral lesion of the talus and varus ankle malalignment. BMC Musculoskelet Disord. 18:23. doi: 10.1186/s12891-016-1367-2. DOI: 10.1186/s12891-016-1367-2. PMID: 28103870. PMCID: PMC5244526.

10. Kim YM, Kim KI, Han B. 2020; If the lower extremity alignment is corrected, will osteochondral lesions of the talus improve? J Korean Foot Ankle Soc. 24:42–7. doi: 10.14193/jkfas.2020.24.2.42. DOI: 10.14193/jkfas.2020.24.2.42.

Go to : 




 PDF
PDF Citation
Citation Print
Pr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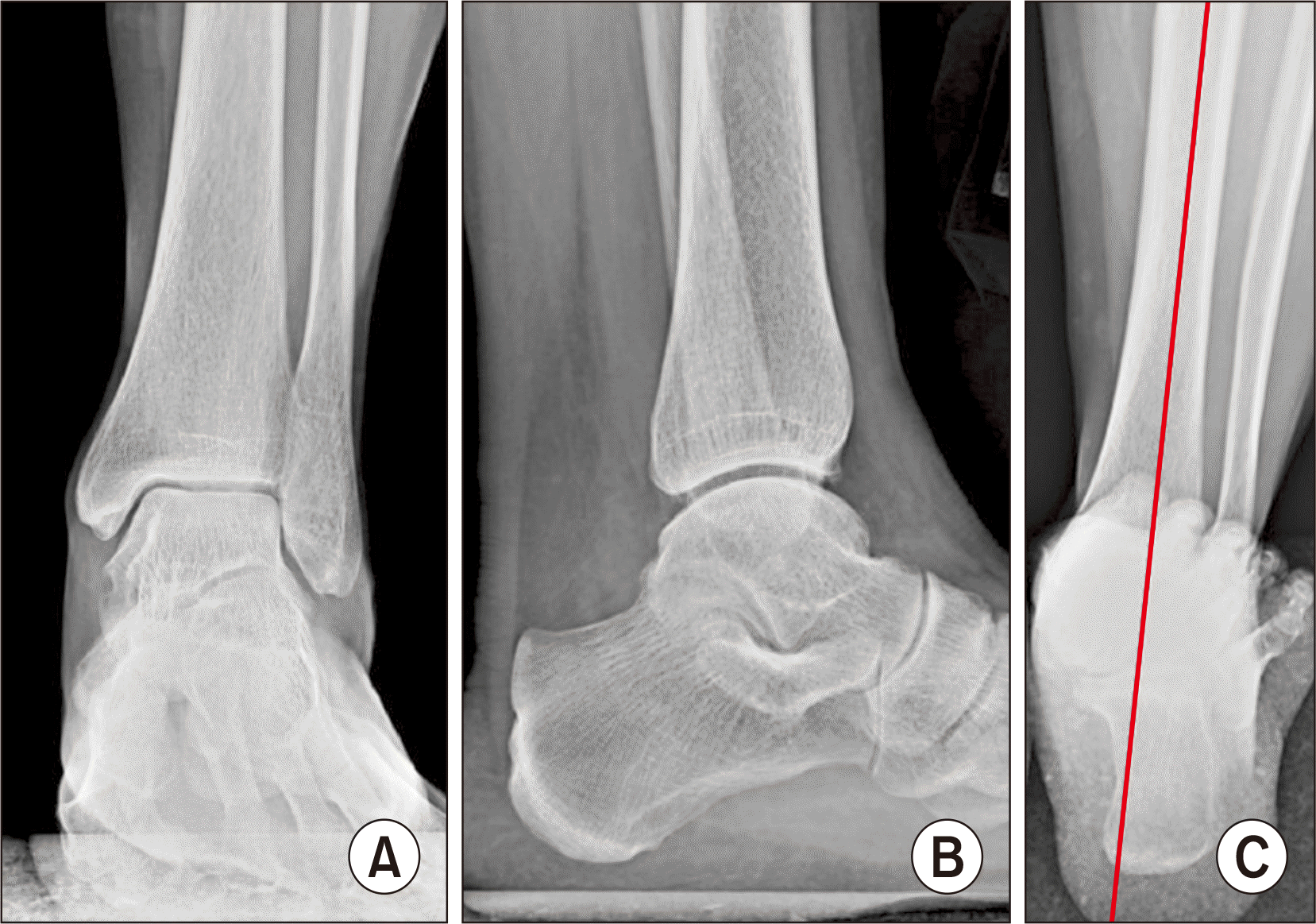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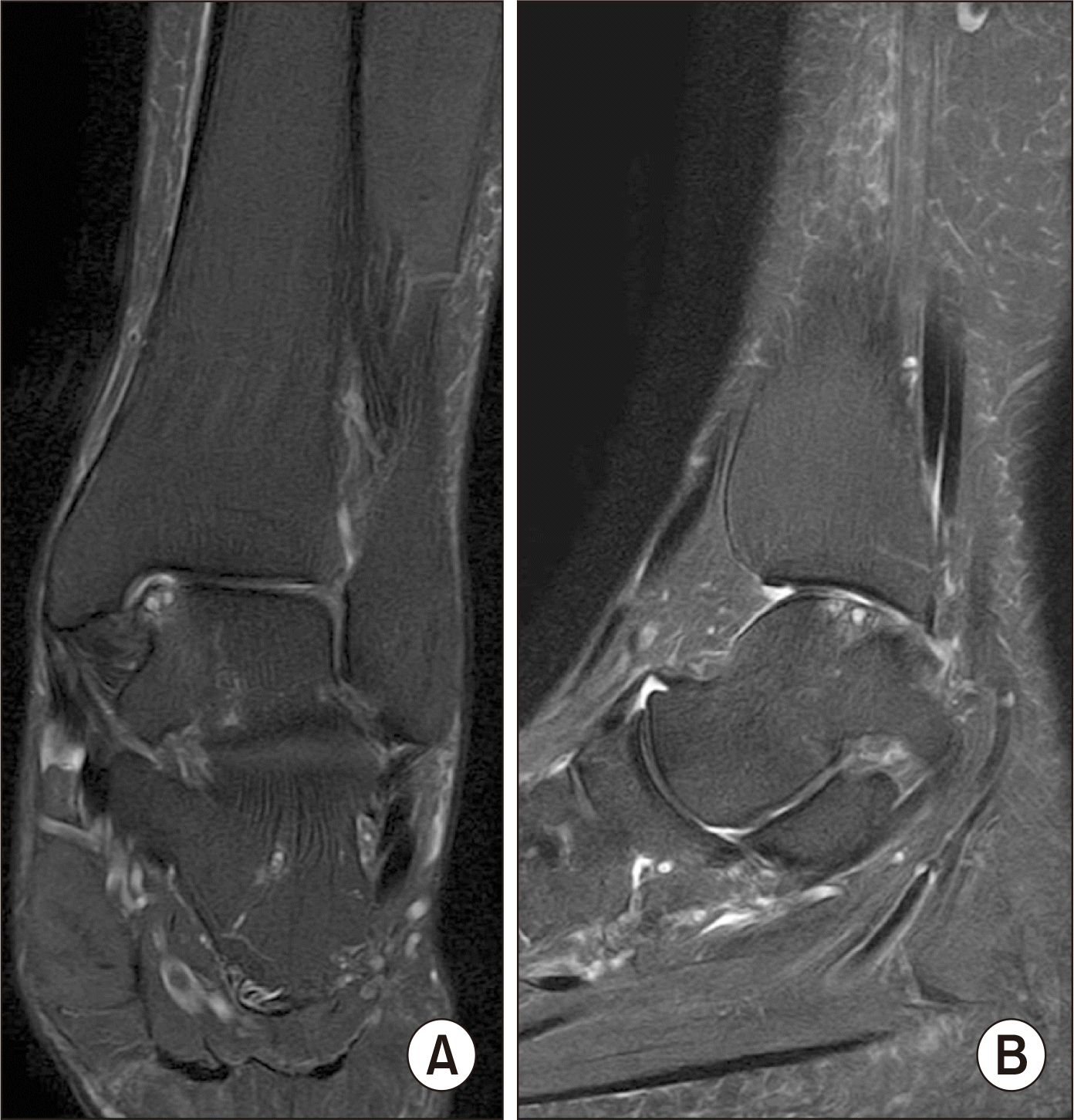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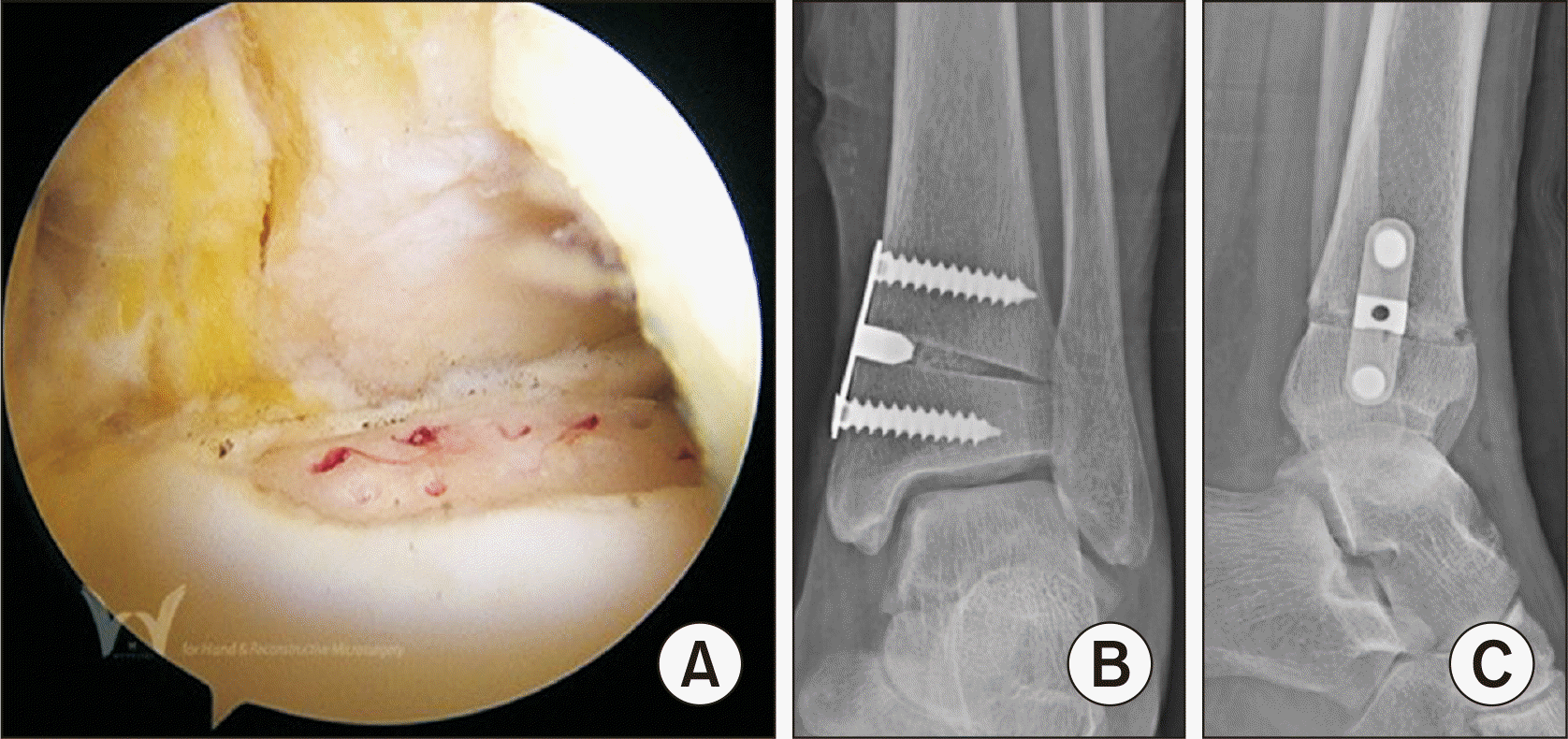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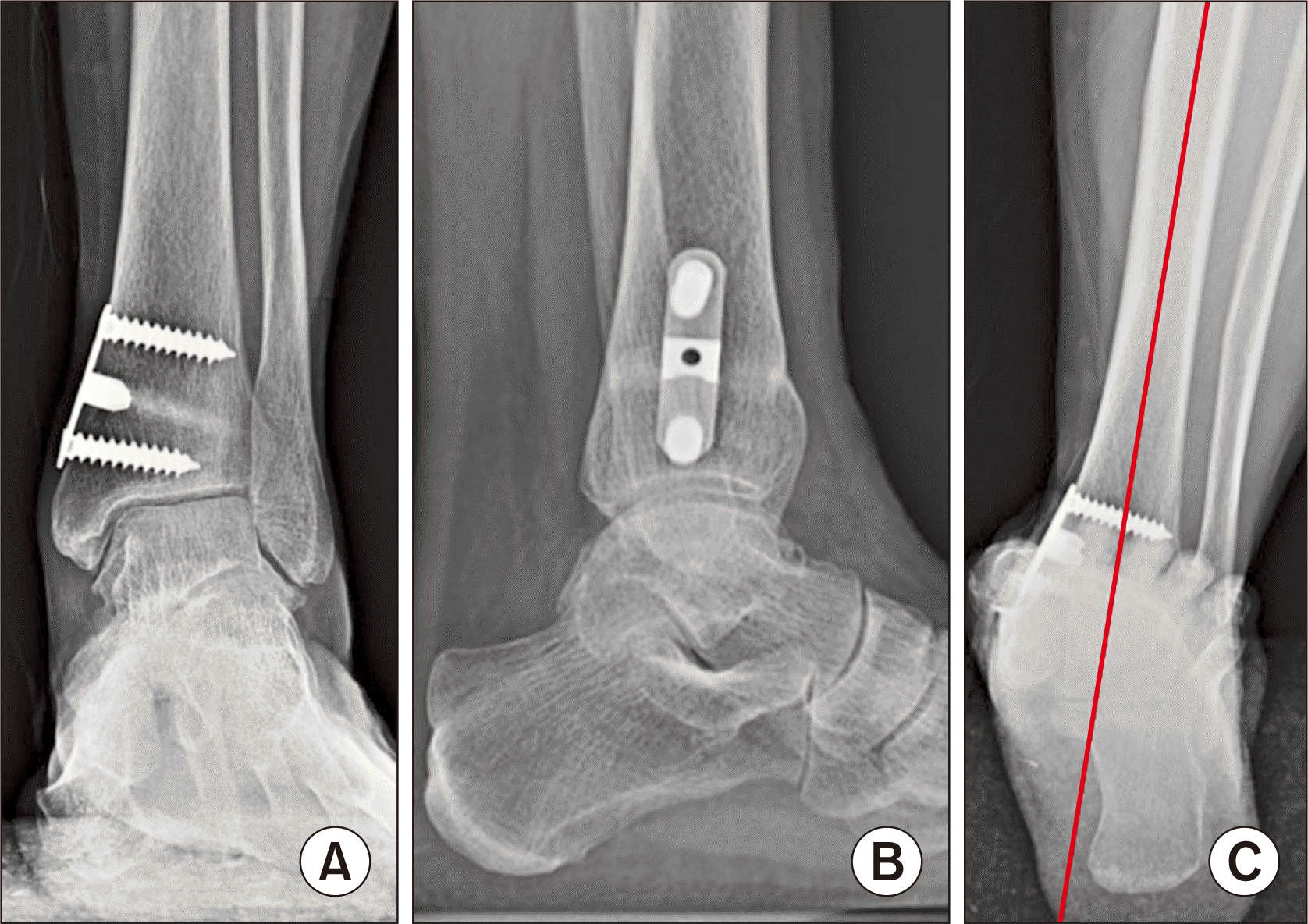
 XML Download
XML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