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연구 재료 및 방법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치주치료를 시행한 22명의 환자, 124개의 치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치아 관련요인은 치료 당시에 수술을 진행한 술자에 의해 임상적으로 기록된 요인으로 치주수술 당일 최대 치주낭 깊이, 치근의수, 치근 이개부 이환, 근관치료 여부, 보철상태를 기록하였다. 내원 당시의 초진 기록을 기준으로 환자관련 요인은 성별, 나이, 흡연 여부, 첫 내원 당시 치주질환으로 상실된 치아 여부, 당뇨병 이환 여부, 5년간 유지관리 응답도가 있으며 각각 요인들을 기록하였다. 각각의 요인들의 치아 상실 여부와 관련한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Go to :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gnostic factors related to tooth loss after 5 years of periodontal surgery in periodontal disease patients.
Materials and Methods
From January to December 2017, 22 patients and 124 teeth who underwent periodontal treatment through periodontal surgery were targeted. At the time of treatment, the measured values were evaluated after recording the maximum probing depth, average periodontal probing depth, number of root, furcation involvement, pulp vitality, and prosthesis state on the day of periodontal surgery. Based on the initial records at the time of visit, patient-related factors were gender, age, smoking, tooth loss due to periodontal disease at the time of first visit, diabetes, and maintenance period. The influence of each factor on tooth loss was evaluated.
Go to : 
치주질환은 미생물과 관련된 숙주매개 염증성 질환으로 치주조직의 부착상실 및 치조골 소실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치주인대의 소실, 상피의 치근단 방향으로의 이동, 치근면을 따라 치면세균막의 근단측으로 이동이 발생하면서 치주질환의 진행이 이루어진다.1 이러한 치주질환의 진행이 발생하면 치아 상실의 위험성이 증가한다.치주질환에 이환된 환자들 중 치주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환자는 치료를 시행한 환자들에 비해 발치 대상 치아가 증가하여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2 치주치료의 목적은 치주질환의 치료 후 구강 내의 치은연하 및 치은연상치태가 없도록 하며, 병적 치주낭을 없애 치주질환에 이환된 자연치를 오랫동안 건강하고, 기능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치주 술식 중 치주 판막술이 시행된다.
치주판막술은 치주질환에 이환된 부위로의 적절한 치태조절을 위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치주낭을 감소시킨다.3 또한 이전의 연구에서 치주판막술을 통해 치주질환의 진행을 억제하고, 건강한 치주조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2
치주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특히 환자에게 여러가지 문제들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치주질환에 이환된 치아를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발치를 한 후 수복을 할 것인지 결정한 후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평가되거나 고평가된 예후는 환자로 하여금 시간적, 금전적으로 손해를 일으키게 되므로 치아의 예후를 적절히 판단하는것이 중요하다. 임상적으로 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개인마다 임상적으로 발현되는 질병의 결과가 달라 치아의치료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치아상실에 영향을 줄 수있는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치아의 예후와 관련된 요인은 치아와 관련된 요인과 숙주인 환자와 관련된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4
이번 연구의 목적은 치주판막술 5년 후 치아의 상실 여부를 조사하여 치아 상실과 관련된 예후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치아 상실과 관련된 예후요인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Tooth-related factor & patient-related factor
Go to : 
본 연구는 단국대학교 치과병원 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IRB No. DKUDH IRB 2022-10-003)을 얻고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치주판막술을 통해 치주치료를 시행한 22명의 환자, 124개의 치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환자는 치주수술 전에 스케일링을 진행하였고, 4분악으로 나누어 필요한 부위에 치주수술을 시행하였다. 환자의 치료 과정은 Fig. 1에 나타내었다.
치료 당시, 수술을 진행한 술자에 의해 임상적으로 기록된 요인으로 치아의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대 치주낭 깊이, 치근의 수, 치근 이개부 이환, 보철 상태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기록하였다.5-7
최대 치주낭 깊이: Williams probe를 통해서 치아당 근심 협면, 협면 중앙부 ,원심 협면, 근심 설면(구개면), 설면(구개면) 중앙부, 원심 설면(구개면) 6개의 부위에서 치은변연에서 치주낭 최심부까지의 깊이를 측정한 후 6개의 치주낭 중에서 가장 깊은 곳의 부위를 기준으로 7 mm 이상인 치아와 7 mm 미만인 치아로 분류하였다.
치근 이개부 이환: Hamp 등에 의한 치근 이개부 병소의 분류에 따라 Nabers probe를 이용하여 측정된 치근 이개부를 Class I, II, III로 기록하였다.8
보철 상태: 보철물 여부에 따라 지대치로 사용되지 않은 치아, 지대치로 사용된 치아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치아 상실: 치주 수술 후 5년인 2021년의 치아 상실 여부를 기록하였다.
모든 환자는 첫 내원 당일에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촬영하였고. 치아의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골 소실, 근관치료 여부, 치근의 수를 기록하였다.
골 소실: 골 소실은 각각의 치아에서 백악법랑경계에서 치근첨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로 골 소실의 정도를 나타내었으며 근심과 원심측 중에서 골 소실이 많이 발생한 부위를 30%이상과 30%미만으로 기록하였다.
근관치료 여부: 방사선 사진상에서 일부 혹은 전체 치근관이 충전이 된 경우 실활치로, 충전되지 않은 경우는 생활치로 기록하였다.
치근의 수: 방사선 사진 소견에서 관찰되는 치근 개수를 기록하였다.
내원 당시의 초진 기록을 기준으로 환자관련 요인은성별, 나이, 흡연 여부, 첫 내원 당시 치주질환으로 발치된 치아의 수, 당뇨병 이환 여부, 유지관리 응답도가 있으며 각각 요인들을 평가하였다.
성별: 환자의 성별을 기록하였다.
나이: 내원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흡연 여부: 흡연 시 10개비를 기준으로 10개비/하루 이상인 환자는 heavy smoker, 10개비/하루 미만인 환자는 smoker, 비흡연자는 non-smoker로 기록하였다.
첫 내원 당시 치주질환으로 상실된 치아 여부: 이전의 치주질환으로 인해서 발치된 치아 존재 유무에 따라 기록하였다.
당뇨병: 당뇨병 이환 유무에 따라 기록하였다.유지관리 응답도: 치주치료 후 환자의 내원에 따라서 1년미만, 1년이상 3년 미만, 3년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으로 4가지로 나누어 유지관리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 26.0 for Window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치아 관련 요인과 환자 관련 요인에 대해 다중공선성을 평가하였다.
둘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서 환자 관련 요인이 발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셋째, 일반화 추정 방정식을 통해서 치아관련 요인이 발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Go to : 
본 연구는 2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치아에 해당하는 환자 관련요인을 살펴보면 “심한 흡연자(흡연 10개비/하루 이상)”의 응답자는 2명으로 9%를 차지하였다. 비흡연자는 19명(8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흡연자(흡연 10개비/하루 미만)는 1명(4%)을 차지하였다. 당뇨병 이환 여부에 관한 조사에서, 당뇨병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의 1명(4%), 없는 응답자는 21명(96%)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50대가 10명(45%)으로 가장 높은 분포도를 보였고, 그 다음이 40대 7명(31%), 60대 3명(13%), 30대 2명(9%)으로 조사되었다. 이전에
치주질환으로 발치 된 치아가 있는 응답자는 발치 치아없음이 18명(82%), 발치 치아 있음이 4명(18%)으로 조사되었다. 유지관리기간은 5년 이상은 12명(5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년 미만은 5명(22%), 3년이상 5년 미만은 3명(13%), 1년이상 3년 미만은 2명(9%)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 6명(25.8%)에 비해 여자가 16명(74.2%)으로 월등이 높게 조사되었다. 이 연구의 연구대상자 특성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Patient character
본 연구는 총 124개의 치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치아에 해당하는 환자 특성을 살펴보면 30%이상의 골 소실을 보이는 치아는 66개(53.5%), 30%미만의 골 소실을 보이는 치아는 58개(46.8%)로 분류되었다. 치근 이개부 이환은 Class 1은 63개(50.8%), Class 2는 37개(30.6%), Class 3는 23 개(18.6%)의 치아로 분류되었다. 근관치료 여부는 실활치는 5개(4%), 생활치는 119개(96%)로 분류되었다. 지대치 여부는 지대치로 사용되지 않은 치아는 116개(93.6%), 지대치로 사용된 치아는 8개(6.4%)로 분류되었다. 치근의 수는 치근이 1개인 치아는 11개(9.2%), 2개인 치아는 58개(46.7%), 3개인 치아는 55개(44.1%)로 분류되었다. 최대 치주낭 깊이는 7 mm 미만인 치아는 83개(66%), 7 mm 이상인 치아는 41개(33%)로 분류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Table 3에 제시하였다.
Tooth-related factor character
본 연구에서 치주치료 5년 후 follow up을 시행한 결과 124개의치아 중 18개의 치아 상실을 보였으며, 22명의 환자 중 12명의 환자에서 치아상실을 보였다. 12명의 환자에서 3개의 치아상실을 보이는 환자는 2명, 2개의 치아 상실을 보이는 환자는 2명, 1개의 치아 상실을 보이는 환자는 8명으로 나타났고 결과는 Fig. 2에 제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기분석 결과에 따라 환자의 특성(성별, 나이, 흡연, 유지기간, 당뇨, 치아 상실여부)이 발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환자 관련요인이 발치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for patient-related factor
치아 관련 요인의 다중 공선성을 평가한 결과 치아 관련 요인 중 골 소실, 치근 이개부 이환, 최대 치주낭 깊이 세가지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대 치주낭 깊이의 P값은 0.000, 골 소실의 P값은 0.021 치근 이개부 이환의 P값은 0.124로 나타났고, 이때 최대 치주낭 깊이와 골 소실 값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Odds ratio는 골 소실이 30% 이상일때 41.9배, 최대 치주낭 깊이가 7 mm일 때 34.6배로 나타났다.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Tooth-related factor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results
Go to : 
치주치료의 목표는 평생에 걸쳐 치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전의 장기간의 연구는 적절한 치주수술과 유지관리를 받은 환자에서 치아상실을 방지하거나 현저히 줄일수 있다고 하였다.9
이번 연구의 결과는 치아 상실이 환자들에게서 균등하게 나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치아 판막술은 시행한 22명의 환자에서 12명인 54%만 치아상실을 겪었으며, 이는 124개의 치아 중 18개의 치아상실을 보인다. 또한 18개의 치아 중 6개가 2명의 환자에서 상실을 보였으며
이 결과는 유지관리 동안 치아상실의 대부분을 몇몇 소수의 환자에게서 발생한다는 이전의 연구와 일치한다.10
이전에도 치주수술 후 치아의 예후를 평가한 다양한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연구마다 기간이 상이하였기 때문에 한 해 환자당 치아상실율로 비교할 수 있으며 그 수치는 0.09 - 0.15의 값을 보인다.11-13 이번 연구에서 5년동안 22명의 환자에서 18개의 치아상실을 보였으며, 이는 연당 0.16개의 치아 상실율로 이전의 연구에서와 유사한 값을 나타낸다.
Matuliene 등은 최대 치주낭 깊이가 7 mm 이상인 경우 치주치료가 완벽하지 않고 추후 다른 치주치료가 필요할것이라고 하였으며, 유지관리 기간이 10년미만의 환자를 기준으로 7 mm 이상의 치주낭 깊이를 가지는 환자에서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치아 상실의 위험이 18배 높다고 하였다.14 이번 연구에서도 높은 위험성을 보였으며 Odds ratio는 34의 값을 보였으며 이는 적은 환자 수 및 유지관리 기간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초기 골 소실의 정도는 여러 연구에서 치아 상실의 높은 위험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골 소실이 1% 증
아 상실에 대해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Odds ratio 41.9). Graetz의 연구는 골 소실이 70%이상 존재하는 경우 치아 상실의 위험이 23배 증가하는 것으로 골 소실을 치아상실의 예후인자인 것을 확인하였다.17
치근 이개부 침범은 치아상실에 연관된다는 이전 연구에서와 달리18 이번 연구에서는 유의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며(Odds ratio < 1, P:0.124) 추후 연구에서는 소구치, 대구치에 따른 해부학적 특성 및 치근 개수에 따른 위생관리의 가능성 등의 차이로 인해 더 세분화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연구에서 치아 관련 요인 중에서 골 소실과 최대치주낭 깊이가 통계적으로 발치의 위험 가능성을 높여치아의 상실에 대한 위험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은 이전에 이루어 졌던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그러므로 치아 상실 에 대한 위험요인 평가 시 최대 치주낭 깊이와 골 소실이 치아 상실의 가능성에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여 치료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환자 관련 요인은 성별, 유지관리기간, 치아 상실 여부, 연령, 흡연 여부, 당뇨로 나뉘었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심각한 골 소실, 깊은 치주낭을 보이는 환자에서 유지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환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치아 상실이 52.4%에서 15.8%로 현저하게 감소된다는 보고가 있으며18 장기간의 유지관리 기간을 가지는 환자의 치아 예후에 관한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는 여러 연구들 사이에서 발견된 상당한 이질성으로 인해 결정적인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힘들다고 하였으며 흡연, 나이, 유지관리 기간 등이 치아 상실에 연관 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19,20
이번 연구의 한계점으로 대부분의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후향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이번 연구에서 환자 차트를 통해 치아 상실의 원인을 조사하였으나, 종종 원인을 알지 못할 때도 존재하여 상실된 치아가 치주적 원인으로 상실되었는지 신경치료와 관련하여 상실되었는지구별할 수 없을 수 있었다. 치아 상실의 원인은 여러 요소가 관여되고, 술자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항상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며 몇 년에 걸쳐 유지관리를 받지 못한 환자는 종종 개인 병원에서 발치를 시행하여 이는 치아 상실의 원인과 시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이 2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유사한 연구들에 비해 대상자가 적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더 정확한 모델에 기초한 많은 대상자를포함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Go to : 
References
1. Takata T, Donath K. 1988; The mechanism of pocket formation: a light microscopic study on undecalcified human material. J Periodontol. 59:215–21. DOI: 10.1902/jop.1988.59.4.215. PMID: 3164372.
2. Becker W, Berg L, Becker BE. 1979; Untreated periodontal disease: a longitudinal study. J Periodontol. 50:234–44. DOI: 10.1902/jop.1979.50.5.234. PMID: 287779.
3. AlJehani YA. 2014; Risk factors of periodontal disease: review of the literature. Int J Dent. 2014:182513. DOI: 10.1155/2014/182513. PMID: 24963294. PMCID: PMC4055151. PMID: fa574e85e0364446b21f39c83969f610.
4. Lindhe J, Socransky SS, Nyman S, Haffajee A, Westfelt E. 1982; "Critical probing depths" in periodontal therapy. J Clin Periodontol. 9:323–36. DOI: 10.1111/j.1600-051X.1982.tb02099.x. PMID: 6764782.

5. Michalowicz BS, Hodges JS, Pihlstrom BL. 2013; Is change in probing depth a reliable predictor of change in clinical attachment loss? J Am Dent Assoc. 144:171–8. DOI: 10.14219/jada.archive.2013.0096. PMID: 23372133.
6. Nibali L, Sun C, Akcalı A, Yeh YC, Tu YK, Donos N. 2018; The effect of horizontal and vertical furcation involvement on molar survival: A retrospective study. J Clin Periodontol. 45:373–81. DOI: 10.1111/jcpe.12850. PMID: 29219193.
7. Gilbert AD. 2017; Is the risk of loss of pulp vitality increased by periodontitis and its treatment? Periodontal Practice Today. 4:187–92.
8. Hamp SE, Nyman S, Lindhe J. 1975; Periodontal treatment of multi rooted teeth. Results after 5 years. J Clin Periodontol. 2:126–35. DOI: 10.1111/j.1600-051X.1975.tb01734.x. PMID: 1058213.
9. Axelsson P, Nyström B, Lindhe J. 2004; The long-term effect of a plaque control program on tooth mortality, caries and periodontal disease in adults. Results after 30 years of maintenance. J Clin Periodontol. 31:749–57. DOI: 10.1111/j.1600-051X.2004.00563.x. PMID: 15312097.
10. Chambrone L, Chambrone D, Lima LA, Chambrone LA. 2010; Predictors of tooth loss during long-term periodontal maintenance: a systematic review of observational studies. J Clin Periodontol. 37:675–84. DOI: 10.1111/j.1600-051X.2010.01587.x. PMID: 20528960.
11. McFall WT Jr. 1982; Tooth loss in 100 treated patients with periodontal disease: A long-term study. J Periodontol. 53:539–49. DOI: 10.1902/jop.1982.53.9.539. PMID: 6957591.
12. Jansson L, Lagervall M. 2008; Periodontitis progession in patients subjected to supportive maintenance care. Swed Dent J. 32:105–14. PMID: 18973081.
13. Pretzl B, Kaltschmitt J, Kim TS, Reitmeir P, Eickholz P. 2008; Tooth loss after active periodontal therapy. 2: tooth-related factors. J Clin Periodontol. 35:175–82. DOI: 10.1111/j.1600-051X.2007.01182.x. PMID: 18199151.
14. Matuliene G, Pjetursson BE, Salvi GE, Schmidlin K, Brägger U, Zwahlen M, Lang NP. 2008; Influence of residual pockets on progression of periodontitis and tooth loss: results after 11 years of maintenance. J Clin Periodontol. 35:685–95. DOI: 10.1111/j.1600-051X.2008.01245.x. PMID: 18549447.
15. Dannewitz B, Zeidler A, Hüsing J, Saure D, Pfefferle T, Eickholz P, Pretzl B. 2016; Loss of molars in periodontally treated patients: results 10 years and more after active periodontal therapy. J Clin Periodontol. 43:53–62. DOI: 10.1111/jcpe.12488. PMID: 26660235.
16. Faggion CM Jr, Petersilka G, Lange DE, Gerss J, Flemmig TF. 2007; Prognostic model for tooth survival in patients treated for periodontitis. J Clin Periodontol. 34:226–31. DOI: 10.1111/j.1600-051X.2006.01045.x. PMID: 17257157.
17. Graetz C, Plaumann A, Schlattmann P, Kahl M, Springer C, Sälzer S, Gomer K, Dörfer C, Schwendicke F. 2017; Long-term tooth retention in chronic periodontitis-results after 18 years of a conservative periodontal treatment regimen in a university setting. J Clin Periodontol. 44:169–77. DOI: 10.1111/jcpe.12680. PMID: 28028838.
18. Rahim-Wöstefeld S, El Sayed N, Weber D, Kaltschmitt J, Bäumer A, El-Sayed S, Eickholz P, Pretzl B. 2020; Tooth-related factors for tooth loss 20 years after active periodontal therapy - A partially prospective study. J Clin Periodontol. 47:1227–36. DOI: 10.1111/jcpe.13348. PMID: 32696485.
19. Buhlin K, Hultin M, Norderyd O, Persson L, Pockley AG, Pussinen PJ, Rabe P, Klinge B, Gustafsson A. 2009; Periodontal treatment influences risk markers for atherosclerosis in patients with severe periodontitis. Atherosclerosis. 206:518–22. DOI: 10.1016/j.atherosclerosis.2009.03.035. PMID: 19411077.

20. Haber J. 1994; Smoking is a major risk factor for periodontitis. Curr Opin Periodontol. 12–8.
Go to : 




 PDF
PDF Citation
Citation Print
Pr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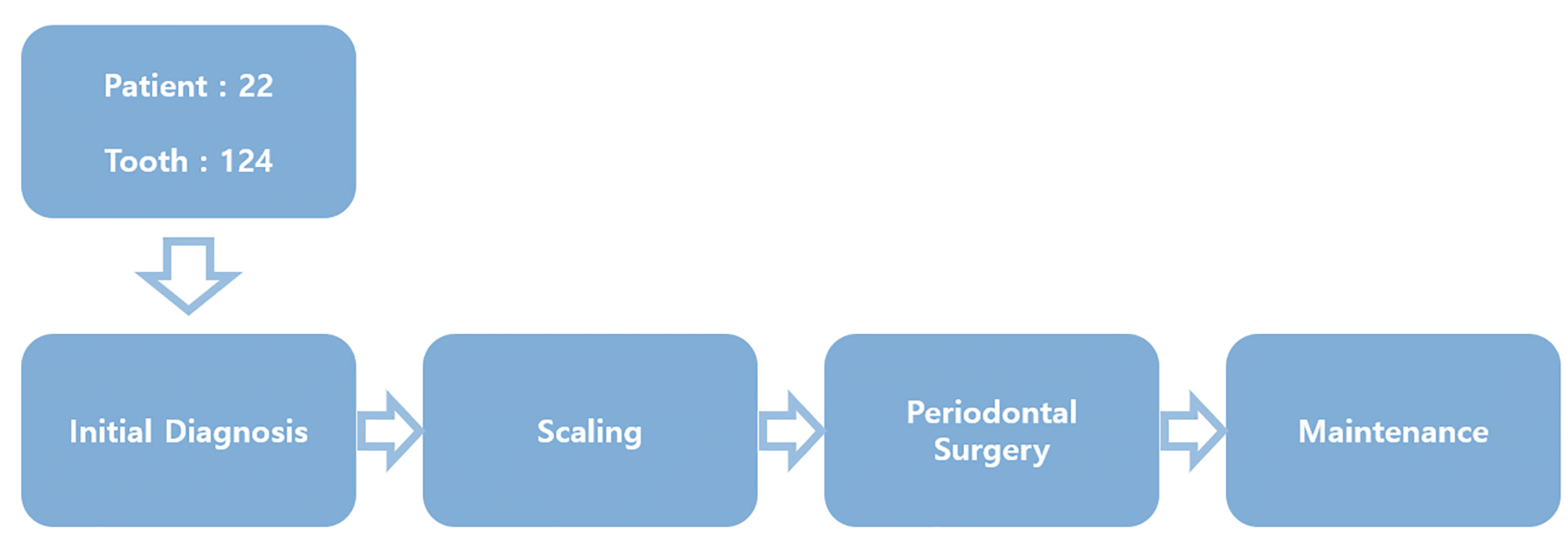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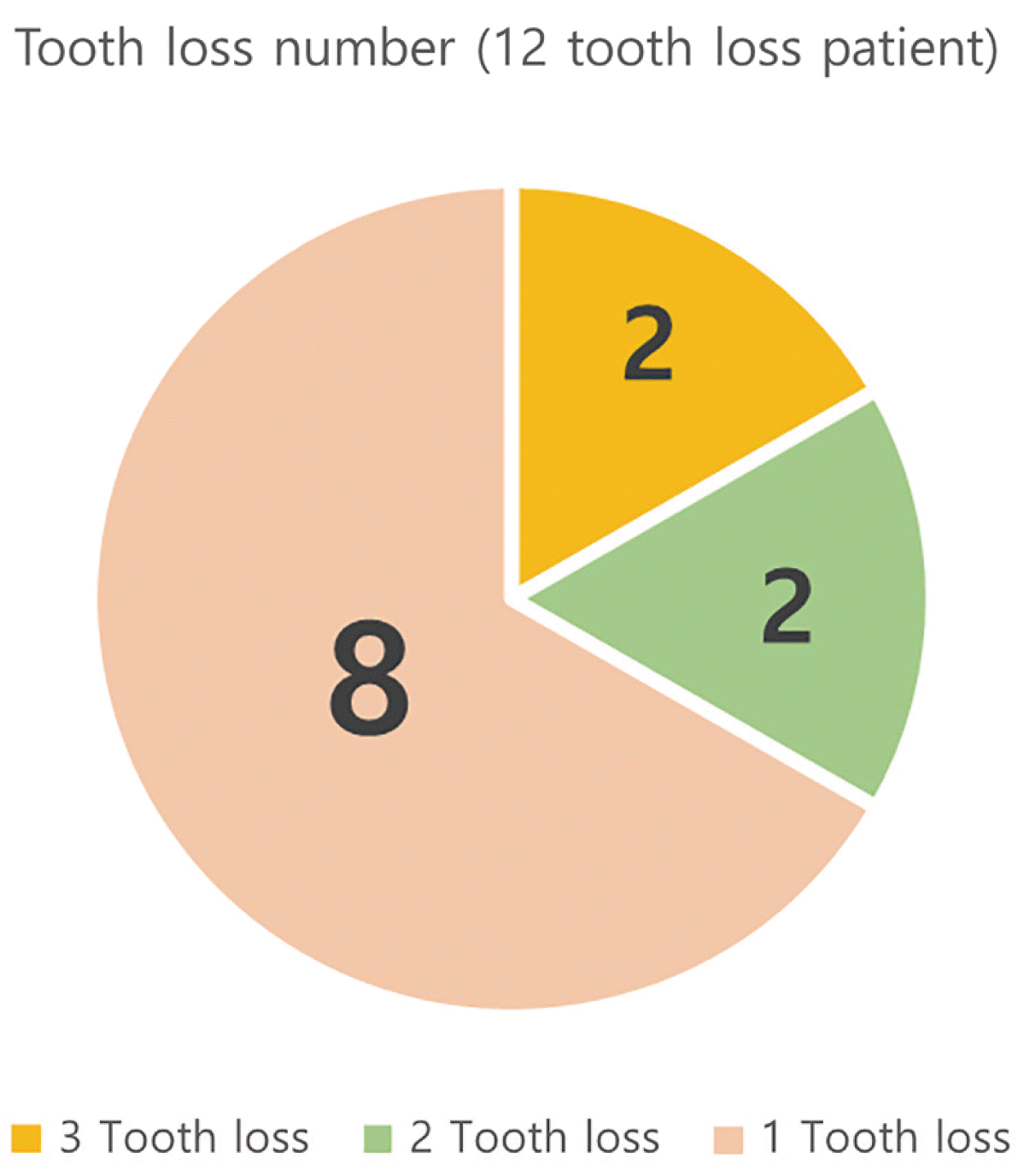
 XML Download
XML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