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otal ankle arthroplasty has become a viable motion-preserving alternative to ankle arthrodesis, especially in the last two decades. Recent improvements have been achieved in the strength of implant design and surgical technique. Nevertheless, addressing preoperative deformities is essential for successful outcomes of total ankle arthroplasty. Residual malalignment can produce instability and edge loading, causing acceleration of polyethylene wear, followed by osteolysis and an increased risk of revision surgery. Therefore, the accompanying deformities and their correction techniques need to be comprehensively elucidated and understood. In this article, we provide a review of the application of total ankle arthroplasty in arthritis with coronal plane varus and valgus deformities.
족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은 수술 기구 및 술기의 발전에 힘입어 말기 족관절 관절염의 치료에 있어 기존의 교과서적인 치료 방법이었던 족관절 유합술에 비해 관절 운동을 보존할 수 있는 수술기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술기이다.1) 과거에는 10도 내지 15도 이상의 외반 또는 내반 변형은 인공관절 치환술의 상대적인 금기로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동반 변형에 대한 적절한 교정 술기를 통한 만족스러운 수술 결과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2-4) 성공적인 수술 결과를 위해서는 동반 변형에 대한 교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적절한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잔존 변형이 남으면 단기적으로는 불안정성 및 탈구가, 중장기적으로는 불균형적인 부하로 인해 폴리에틸렌 삽입물의 마모가 가속화되어 골용해 및 그로 인한 치환물 해리 또는 침강이 유발될 수 있다.5,6)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시 동반 변형에 대한 이해 및 교정 방법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에 본 종설에서는 관상면에서 변형이 동반된 족관절 관절염에서 시행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하여 그 평가와 더불어 교정 술기 및 예후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동양인의 족관절 관절염에서는 내반 변형이 외반 변형에 비해서 빈도가 많은 관계로 내반 변형에 대한 술기는 좀 더 자세히 기술하였고 외반 변형에 대해서는 술기 결정을 위주로 다루었다.
족관절 주변 정렬의 평가는 하지 전체의 정렬을 고려하면서 신체 검진 및 영상의학적 평가 두 가지를 모두 시행하여야 한다. 족관절 주변의 정렬만을 고려하면 족관절의 변형을 교정하고 난 후에 무릎 관절에 변형이 생기거나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신체 검진을 통해 족관절과 후족부의 변형 및 유연성 여부의 평가를 시행해야 하며 아킬레스건 또는 비복근의 구축을 확인하여야 한다. 내반 변형의 경우에는 전족부의 회내 변형 및 그로 인한 제 1열의 족저굴곡 여부를 확인하고 비골근의 근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외반 변형의 경우에는 동반된 편평족 변형을 확인하고 내측 인대 그리고 후경골건 부전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신체 검진 및 정렬의 평가를 통해 일차적으로 수술 계획을 세우며 수술 중 치환물 삽입 후에 반드시 이를 다시 평가하여 추가적인 교정 술기의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영상의학적 평가는 족관절의 체중부하 전후방 및 측면 일반방사선 검사를 기본으로 하며 하지 장관골 영상(long bone lower extremity view), 후족부 정렬 영상(hindfoot alignment view), 그리고 족부의 체중부하 전후방 및 측면 사진을 추가로 촬영하여 족관절뿐만 아니라 하지 전체 정렬, 후족부 및 족부의 정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때 하지 장관골 영상에서 종골까지 포함된 영상을 이용하여 정렬을 확인하기도 한다. 족관절 체중부하 전후면 영상 상에서 관상면의 변형을 평가하는 척도는 경골-거골간 각(tibiotalar angle)과 거골 경사각(talar tilt angle)이 있다.2,5) 내반 변형에서는 경골-거골간 각이 중요한데 이는 경골의 해부학적 축과 거골 원개 관절면에 수직인 선 사이의 각도로써 10도 미만일 때는 중립, 10도 이상의 내측 경사가 있을 시에는 내반이 있다고 평가한다. 거골 경사각은 경골과 거골의 관절면을 이루는 두 선이 이루는 각으로 내외반 변형 모두에서 관절의 상합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그 외에도 과상부 또는 원위 경골 자체에 변형의 중심(center of rotation of angulation)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며, 10도 이상의 변형이 있다면 인공관절 치환술에 앞서 변형 부위에서의 교정 절골술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
Kim 등2)은 2009년에 내반 변형 족관절염 환자에서 인공관절 치환술 시 점진적 내측 삼각인대 유리술 및 추가 교정술기들을 포함한 변형 교정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Fig. 1). 비상합성 내반 변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족관절 격자는 정상에 가까운 형태를 띠지만 거골 경사에 의해 변형이 발생한다. 이는 삼각인대를 포함한 내측 구조물의 구축이 주원인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충분한 내측 유리술을 통해 적절한 인대 균형 및 정상 정렬을 얻을 수 있는데, 유리술 후에 경골 천장 및 거골 원개가 평행을 이루는지 확인해야 한다.2,7,8) 충분한 내측 유리술 후에 경미한 인대 불균형이 남아있거나 외측 이완성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외측 강화 술식을 시행한다(Fig. 2).2,7,8) 상합성 내반 변형의 경우에는 족관절 격자 자체가 거골 원개를 따라 경사를 형성하고 있는데, 내측 유리술 후 경골의 해부학적 축에 수직으로 중립화 경골 절제(neutralizing tibial cut)를 시행한다(Fig. 3).2,7,8) 이때는 추가적인 연골하 골 절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과도한 골 절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두꺼운 폴리에틸렌 삽입물 사용이 필요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대 균형 조절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내측 구조물의 유리술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충분한 내측 구조물 유리 후에도 저명한 인대 불균형이 관찰된다면, 이는 외측 연부조직 강화 술식만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후경골건 연장 등의 관절 외 내측 유리술 또는 비골 단축 절골술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 치환물 삽입 및 내외측 균형 조절 후에는 관절 운동 범위 및 관절 외 잔존 내반 변형을 확인 및 교정해야 한다. 심한 내반 변형에서는 아킬레스 건 또는 비복근의 구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자체로 후족부 변형의 일부 원인이 되기도 한다.9) 치환물 삽입 후 10도 이상의 수동적 족관절 배굴이 불가능하다면 Silfverskiold 검사를 시행하여 경피적 아킬레스건 연장술 또는 비복근 건막 연장술을 시행한다. 이후 후족부의 정렬을 확인하여 후족부 내반이 있는 경우에는 종골의 외측 폐쇄성 쐐기 절골술 또는 필요시 거골하관절 유합술을 시행한다.2,7) 또한 장기간의 족관절 내반 변형은 전족부의 회내 및 제 1열의 족저굴곡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소견이 있을 시에는 제 1중족골 배굴 절골술을 시행해야 한다(Fig. 4).2,7)
전방 접근을 통해 족관절을 노출한 후 관절낭 및 인대의 구축을 유발할 수 있는 관절 주변의 골극들을 철저히 제거한다. 골극을 모두 제거한 뒤 경골 천장과 거골 사이의 내외측 균형을 확인해야 한다. 모의 치환물 블록, 골막 거상기(periosteal elevator), 장력 측정기(tensioner), 층류 확장기(lamina spreader)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술자의 선호도에 따른다. 내반 변형에서는 내측의 구축이 관찰되며 이는 대부분 심부 내측 삼각인대와 후경골건의 구축에 기인한다. 심부 내측 삼각인대는 그 원점이 내과에 위치하며 거골의 내측 측면에 부착된다. 삼각인대의 구축을 박리하는 방법으로는 내과 부착부에서의 완전 골막하 유리술을 제시하는 경우10)도 있으며 원위 부착부에서의 점진적 유리술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7) 경골과 거골의 절제 후 시험용 삽입물을 삽입한 뒤 수동으로 내반 및 외반 부하를 가하여 인대 균형을 평가한다. 심한 내반 변형에서는 내측 구조물의 구축이 잔존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절개를 통해 후경골건의 연장술을 통해 추가적인 내측 유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부 조직 유리술 외에도 Doets 등11)은 내과 절골술을 통한 교정을 보고한 바 있으나 13.3% (2/15)의 불유합을 보고하고 있어 추가적 교정을 얻을 수는 있으나 절골부의 통증 및 불유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측부의 구축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소 과한 접근일 수 있다.
내측 구축을 해결한 뒤 외측부 이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치환물을 삽입한 상태에서 외측 간격이 내측에 비해 확연하게 넓거나, 적당한 강도의 내반 스트레스를 가하였을 때 폴리에틸렌 삽입물의 아탈구 소견이 보일 시에는 외측 지대 보강술을 시행해야 한다. 외측 지대 보강술은 비골 단축 절골술과 같은 골 교정술과 변형 Broström 술식 또는 장비골건 이전술과 같은 연부조직 술식으로 나누어진다. 비골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고, 충분한 내측 유리술 후에도 확연한 외측 이완이 남아있다면 비골 단축 절골술을 통한 골 교정이 필요하다. 외측 간격이 확연히 넓지는 않지만 내반 스트레스 시 경미한 폴리에틸렌 아탈구 소견이 보일 시에는 연부조직 강화 술기의 적응이 된다. 인대 구조물 및 하신건 지대 상태가 양호하다면 변형 Broström 술식을 시행할 수 있으나 오래 지속된 내반 족관절염 환자에서는 잔존 인대구조가 소실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장비골건을 제 5중족골에 이전하는 술식12)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 술식은 외측 안정성을 증가시켜주는 동시에 제 1열의 족저굴곡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인공관절 치환술과 동시에 시행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내반 족관절염이 오래되면 족배굴곡 제한이 대부분 동반된다. 치환물 삽입 후 10도 이상의 족배굴곡이 불가능하다면 아킬레스건을 연장한다.7,8) Silfverskiold 검사를 통해 비복근 단독 구축 여부를 확인한 뒤 아킬레스건 연장 또는 비복근 건막 연장술을 시행한다. 비복근의 단독 구축이 관찰된다면 비복근 건막 연장술을 시행할 수 있다. 건막 연장술은 근건 이행부에서 시행하거나 무릎 뒤쪽에서 시행할 수 있다. 비복근과 가자미근에 모두 구축이 있다면 족관절에서 아킬레스건을 연장하는데, 대표적으로 경피적 아킬레스건 연장(percutaneous triple hemisection) 술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족관절 인공관절의 경우에는 수술 자세의 문제로 개방적 아킬레스건 연장술보다 선호되는 술식이나 과도한 힘을 가해서 아킬레스건의 완전 파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Brunner 등14)은 2010년에 외반 변형이 동반된 족관절염의 분류 및 치료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Fig. 5). 족관절의 외반 변형이 체중부하 전후방 발목관절 단순 방사선사진에서 확인되는 상합성 관절을 제 1형으로, 외반 거골경사각이 발생하여 관절 내측의 벌어짐이 발생하는 비상합성 관절을 제 2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벌어짐의 정도에 따라 10도 미만을 2A형, 10도 이상을 2B형으로 분류한다. 10도 미만의 내측 벌어짐이 있는 외반 변형에서는 대부분 내측 연부조직이 부전의 상태는 아니므로, 후족부의 선열이 교정되어 있다면 인공 관절이 들어가면서 내측 연부 조직의 긴장이 유지되므로 인공관절 시행에 금기가 되지는 않는다(Fig. 6). 그러나 2B형에서는 내측 연부조직의 부전(삼각 인대 및 후경골건)으로 인해 인공 관절 후에 내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인대 봉합술이나 재건술이 필요하고, 이러한 수술을 통해서도 내측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추천된다.
추가로 시행하는 술식들은 인공관절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순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골 자체의 외반이나 경골 관절면의 외반이 5도 이상 있다면 과상부절골술을 미리 고려하여야 하며 거골하관절의 관절염과 동반 변형 혹은 편평족 변형이 고정되어 있다면 거골하관절 유합술이나 삼중관절 유합술을 미리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골하관절의 관절염이 심하지 않고 교정 가능한 편평족이라면 편평족 교정을 위한 종골 절골술과 장족지굴건 이전술 및 내측 설상골 족저굴곡 절골술 등을 같이 시행할 수도 있다(Fig. 7). 수술 중에는 인공 관절을 넣고 나서 경비관절의 불안정증이 확인된다면 경비관절의 유합술이나 경비인대 결합 나사 고정 등을 고려할 수 있겠으며, 뒤꿈치의 외반이 확인된다면 종골의 내측 전위 절골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교정되지 않은 후족부는 족관절의 외반력으로 작동하여 인공 관절에 비대칭 부하를 가게 하여 관절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내측 연부 조직의 불안정성이 인공관절을 넣고 나서도 남아 있다면 환자에 따라 내측 인대 봉합술, 내측 인대 재건술 그리고 비골 연장술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술기를 진행하고 나서도 전족부의 회외 변형(supination)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내측 설상골이나 제 1중족골 기저부에서 족저굴곡 절골술을 시행한다.
다음은 고려해야 하는 부가 술기 들이다.
(1) 과상부 절골술
(2) 거골하관절 유합술, 이중관절 유합술, 삼중관절 유합술
(3) 경비관절 고정술 및 경비인대 고정술
(4) 내측 전위 종골 절골술
(5) 내측 인대 봉합술 내측 인대 재건술
(6) 비골 연장술
(7) 내측 설상골 혹은 제 1중족골 기저부 족저굴곡 절골술
과거에는 수술 전 관상면 변형이 인공관절 치환술 후 임상 결과와 합병증 면에서 변형이 없는 환자들에 비해 예후가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보고되었으며, 그로 인해 인공관절 치환술의 적응증을 10도 내지 15도 미만의 변형을 가진 환자들로 좁게 설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5,6,15-17) 하지만 Kim 등2)은 인공관절 치환술 시 내반 교정 알고리즘의 제시와 함께 27개월의 평균 추시 기간 동안 수술 전 중립 정렬의 환자들과 10도 이상의 내반 변형을 보였던 환자들 간에 수술 결과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Queen 등3)은 103예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술 전 변형이 수술 후 1년, 2년 추시에서 American Or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 (AOFAS) 점수, SF-36 점수, 보행 속도 등 모든 척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Kim 등18)은 변형 교정을 위해 인공관절 치환술과 더불어 후족부 유합술을 받은 환자들과 받지 않은 환자들 간 중기 추시에서 두 군 모두 양호한 임상 경과를 보였으며 두 군 간 시각 통증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와 AOFAS 점수에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Lee 등4)도 7.3년 경과 관찰한 술전 내반, 외반 그리고 중립 정렬에서 인공관절술에서 유사한 정도의 술 후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등 여러 논문에서 대부분 수술 전 변형이 5년 이상의 중기 추시 및 10년 이상 장기 추시에서도 임상 점수, 생존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절한 교정 술기의 사용을 통해 잔존 관상면 변형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 생존율에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4,9,19-21)
REFERENCES
1. Kim HJ, Suh DH, Yang JH, Lee JW, Kim HJ, Ahn HS, et al. 2017; Total ankle arthroplasty versus ankle arthrodesis for the treatment of end-stage ankle arthritis: a meta-analysis of comparative studies. Int Orthop. 41:101–9. doi: 10.1007/s00264-016-3303-3. DOI: 10.1007/s00264-016-3303-3. PMID: 27717989.
2. Kim BS, Choi WJ, Kim YS, Lee JW. 2009; Total ankle replacement in moderate to severe varus deformity of the ankle. J Bone Joint Surg Br. 91:1183–90. doi: 10.1302/0301-620X.91B9.22411. DOI: 10.1302/0301-620X.91B9.22411. PMID: 19721044.
3. Queen RM, Adams SB Jr, Viens NA, Friend JK, Easley ME, Deorio JK, et al. 2013; Differences in outcomes following total ankle replacement in patients with neutral alignment compared with tibiotalar joint malalignment. J Bone Joint Surg Am. 95:1927–34. doi: 10.2106/JBJS.L.00404. DOI: 10.2106/JBJS.L.00404. PMID: 24196462.
4. Lee GW, Wang SH, Lee KB. 2018; Comparison of intermediate to long-term outcomes of total ankle arthroplasty in ankles with preoperative varus, valgus, and neutral alignment. J Bone Joint Surg Am. 100:835–42. doi: 10.2106/JBJS.17.00703. DOI: 10.2106/JBJS.17.00703. PMID: 29762278.
5. Doets HC, Brand R, Nelissen RG. 2006; Total ankle arthroplasty in inflammatory joint disease with use of two mobile-bearing designs. J Bone Joint Surg Am. 88:1272–84. doi: 10.2106/JBJS.E.00414. Erratum in: J Bone Joint Surg Am. 2007;89:158. DOI: 10.2106/JBJS.E.00414. PMID: 16757761.
6. Haskell A, Mann RA. Ankle arthroplasty with preoperative coronal plane deformity: short-term results. Clin Orthop Relat Res. 2004; (424):98–103. doi: 10.1097/01.blo.0000132248.64290.52. DOI: 10.1097/01.blo.0000132248.64290.52. PMID: 15241149.
7. Kim BS, Lee JW. 2010; Total ankle replacement for the varus unstable osteoarthritic ankle. Tech Foot Ankle Surg. 9:157–64. doi: 10.1097/BTF.0b013e3181fcde82. DOI: 10.1097/BTF.0b013e3181fcde82.
8. Choi WJ, Yoon HS, Lee JW. 2013; Techniques for managing varus and valgus malalignment during total ankle replacement. Clin Podiatr Med Surg. 30:35–46. doi: 10.1016/j.cpm.2012.08.004. DOI: 10.1016/j.cpm.2012.08.004. PMID: 23164438.
9. Yoon YK, Park KH, Park JH, Lee W, Han SH, Lee JW. 2022; Long-term clinical outcomes and implant survivorship of 151 total ankle arthroplasties using the HINTEGRA prosthesis: a minimum 10-year follow-up. J Bone Joint Surg Am. 104:1483–91. doi: 10.2106/JBJS.22.00060. DOI: 10.2106/JBJS.22.00060. PMID: 35726878.
10. Bonnin M, Judet T, Colombier JA, Buscayret F, Graveleau N, Piriou P. Midterm results of the Salto Total Ankle Prosthesis. Clin Orthop Relat Res. 2004; (424):6–18. doi: 10.1097/01.blo.0000132407.75881.a0. DOI: 10.1097/01.blo.0000132407.75881.a0. PMID: 15241138.
11. Doets HC, van der Plaat LW, Klein JP. 2008; Medial malleolar osteotomy for the correction of varus deformity during total ankle arthroplasty: results in 15 ankles. Foot Ankle Int. 29:171–7. doi: 10.3113/FAI.2008.0171. DOI: 10.3113/FAI.2008.0171. PMID: 18315972.
12. Kilger R, Knupp M, Hintermann B. 2009; Peroneus longus to peroneus brevis tendon transfer. Tech Foot Ankle Surg. 8:146–9. doi: 10.1097/BTF.0b013e3181b37c61. DOI: 10.1097/BTF.0b013e3181b37c61.
13. Dwyer FC. 1959; Osteotomy of the calcaneum for pes cavus. J Bone Joint Surg Br. 41:80–6. doi: 10.1302/0301-620X.41B1.80. DOI: 10.1302/0301-620X.41B1.80. PMID: 13620710.
14. Brunner S, Knupp M, Hintermann B. 2010; Total ankle replacement for the valgus unstable osteoarthritic ankle. Tech Foot Ankle Surg. 9:165–74. doi: 10.1097/BTF.0b013e3181fc861c. DOI: 10.1097/BTF.0b013e3181fc861c.
15. Wood PL, Sutton C, Mishra V, Suneja R. 2009;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of two mobile-bearing total ankle replacements. J Bone Joint Surg Br. 91:69–74. doi: 10.1302/0301-620X.91B1.21346. Erratum in: J Bone Joint Surg Br. 2009;91:700. DOI: 10.1302/0301-620X.91B1.21346. PMID: 19092007.
16. Wood PL, Deakin S. 2003; Total ankle replacement. The results in 200 ankles. J Bone Joint Surg Br. 85:334–41. doi: 10.1302/0301-620x.85b3.13849. DOI: 10.1302/0301-620X.85B3.13849. PMID: 12729104.
17. Wood PL, Prem H, Sutton C. 2008; Total ankle replacement: medium-term results in 200 Scandinavian total ankle replacements. J Bone Joint Surg Br. 90:605–9. doi: 10.1302/0301-620X.90B5.19677. DOI: 10.1302/0301-620X.90B5.19677. PMID: 18450626.
18. Kim BS, Knupp M, Zwicky L, Lee JW, Hintermann B. 2010; Total ankle replacement in association with hindfoot fusion: outcome and complications. J Bone Joint Surg Br. 92:1540–7. doi: 10.1302/0301-620X.92B11.24452. DOI: 10.1302/0301-620X.92B11.24452. PMID: 21037349.
19. Krishnapillai S, Joling B, Sierevelt IN, Kerkhoffs GMMJ, Haverkamp D, Hoornenborg D. 2019; Long-term follow-up results of Buechel-Pappas ankle arthroplasty. Foot Ankle Int. 40:553–61. doi: 10.1177/1071100719828379. DOI: 10.1177/1071100719828379. PMID: 30700155.
20. Yang HY, Wang SH, Lee KB. The HINTEGRA total ankle arthroplasty: functional outcomes and implant survivorship in 210 osteoarthritic ankles at a mean of 6.4 years. Bone Joint J. 2019; 101-B:695–701. doi: 10.1302/0301-620X.101B6.BJJ-2018-1578.R1. DOI: 10.1302/0301-620X.101B6.BJJ-2018-1578.R1. PMID: 31154845.
21. Zafar MJ, Kallemose T, Benyahia M, Ebskov LB, Penny JØ. 2020; 12-year survival analysis of 322 Hintegra total ankle arthroplasties from an independent center. Acta Orthop. 91:444–9. doi: 10.1080/17453674.2020.1751499. DOI: 10.1080/17453674.2020.1751499. PMID: 32285738. PMCID: PMC8023928.
Figure 2
Incongruent varus ankle. After medial release, the modified Brostrom procedure was performed for residual lateral opening. Calcaneal lateral closing wedge osteotomy was performed to correct heel varus after implant inser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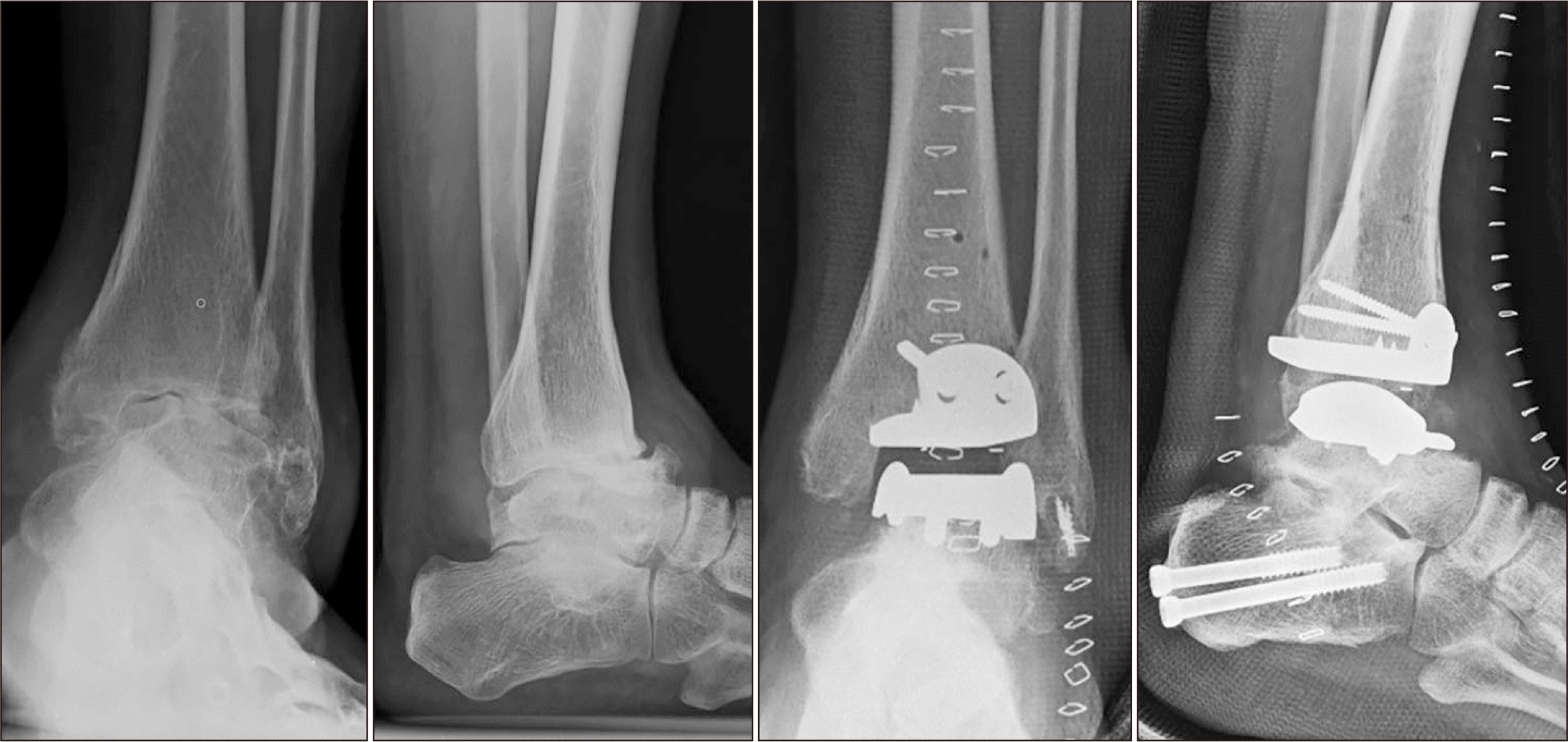
Figure 3
Congruent varus ankle. Postoperative radiograph shows neutral alignment after medial release and neutralizing tibial cut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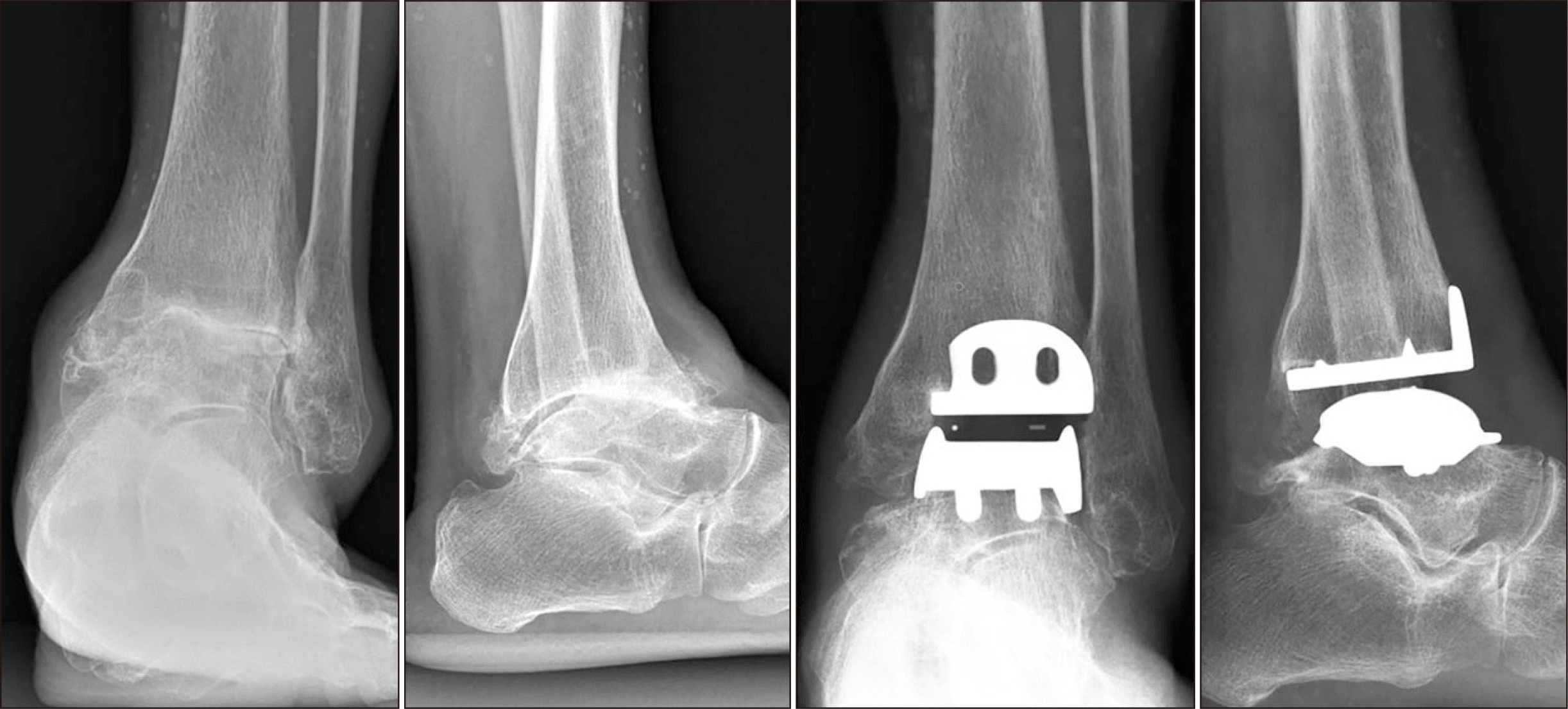
Figure 4
Correction algorithm for extra-articular deformity after implant insertion in varus ankle arthrit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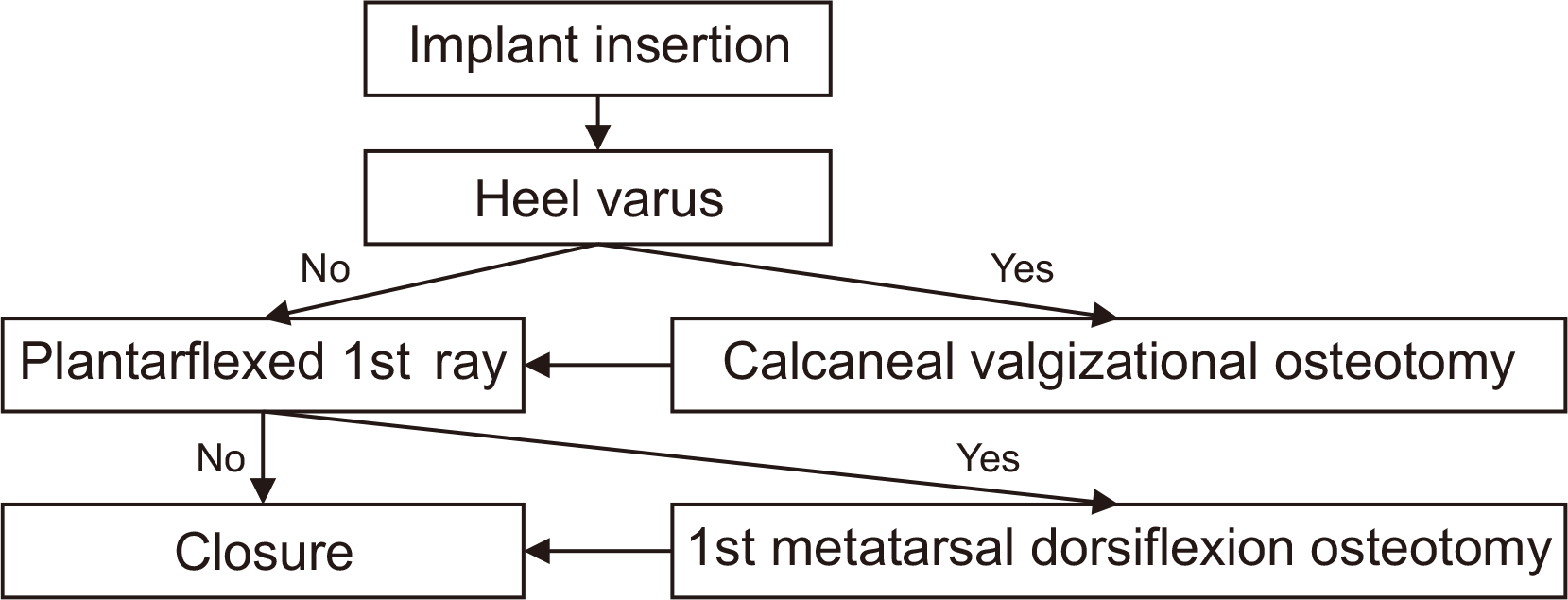
Figure 5
Classification of valgus deformity and associated procedures. TAR: total ankle replac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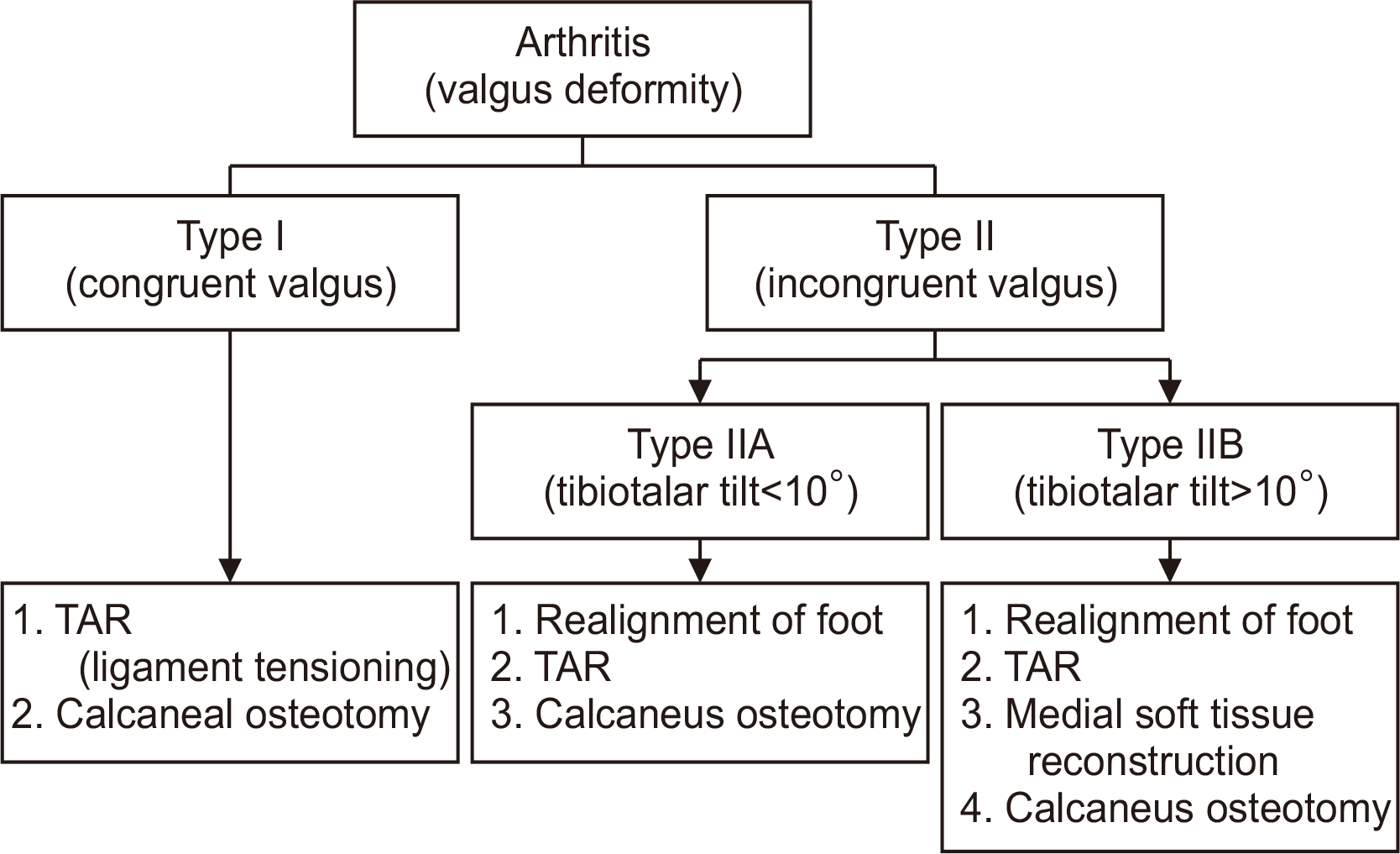




 PDF
PDF Citation
Citation Print
Pr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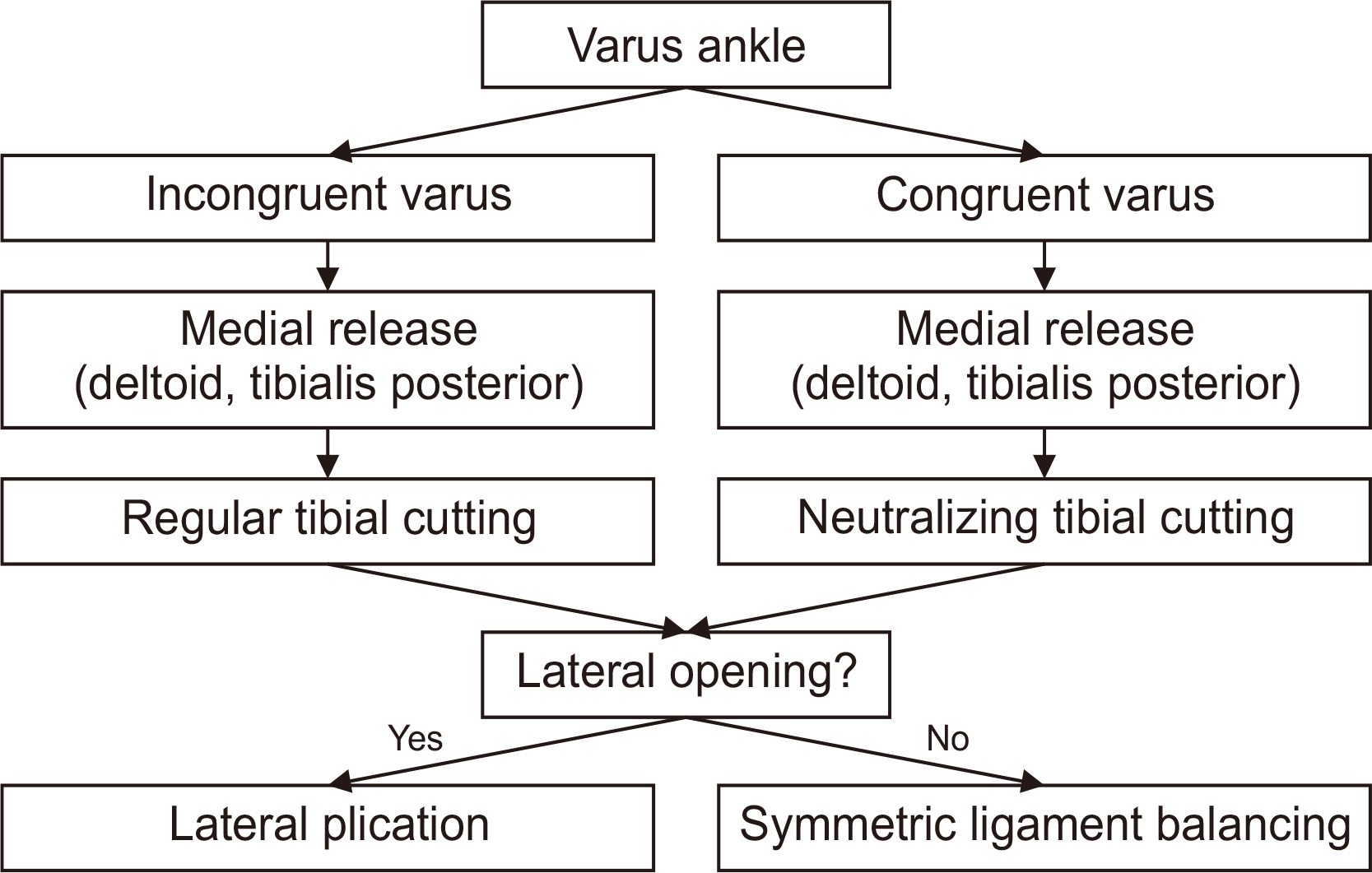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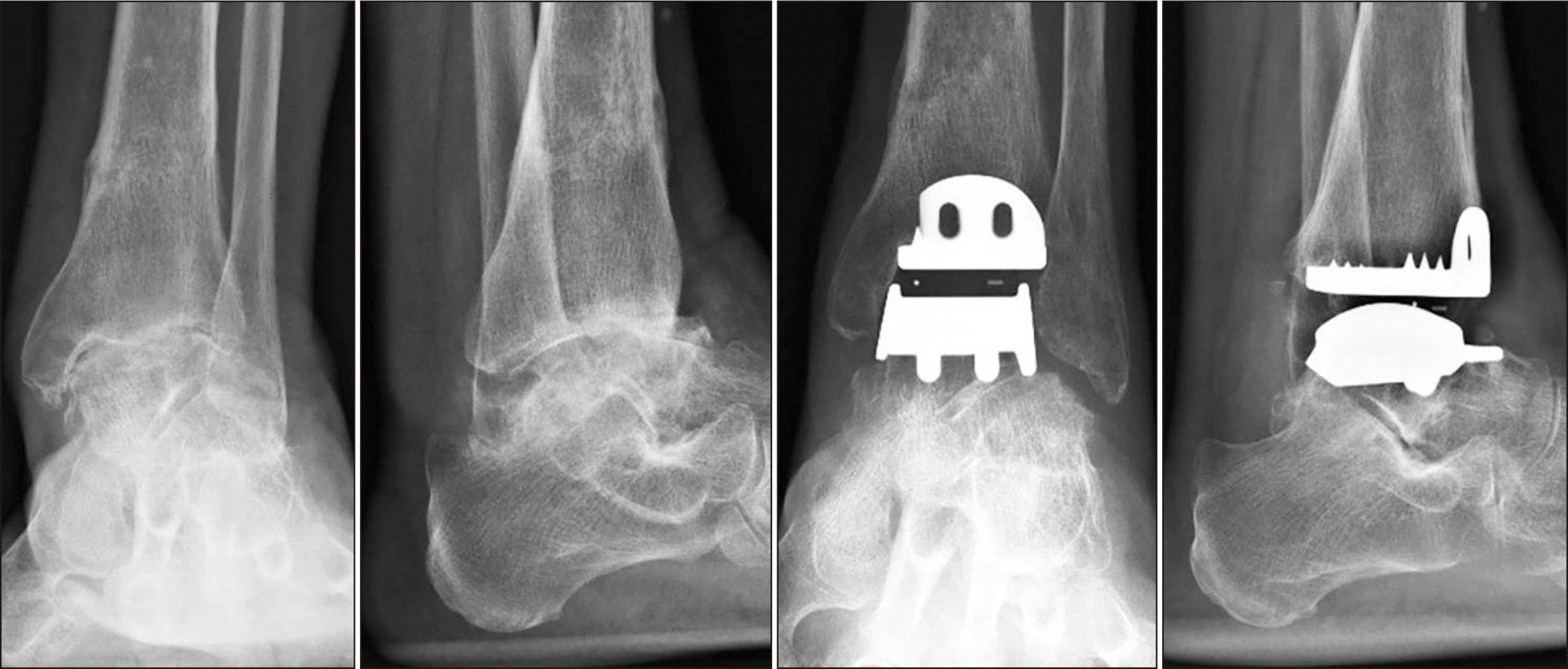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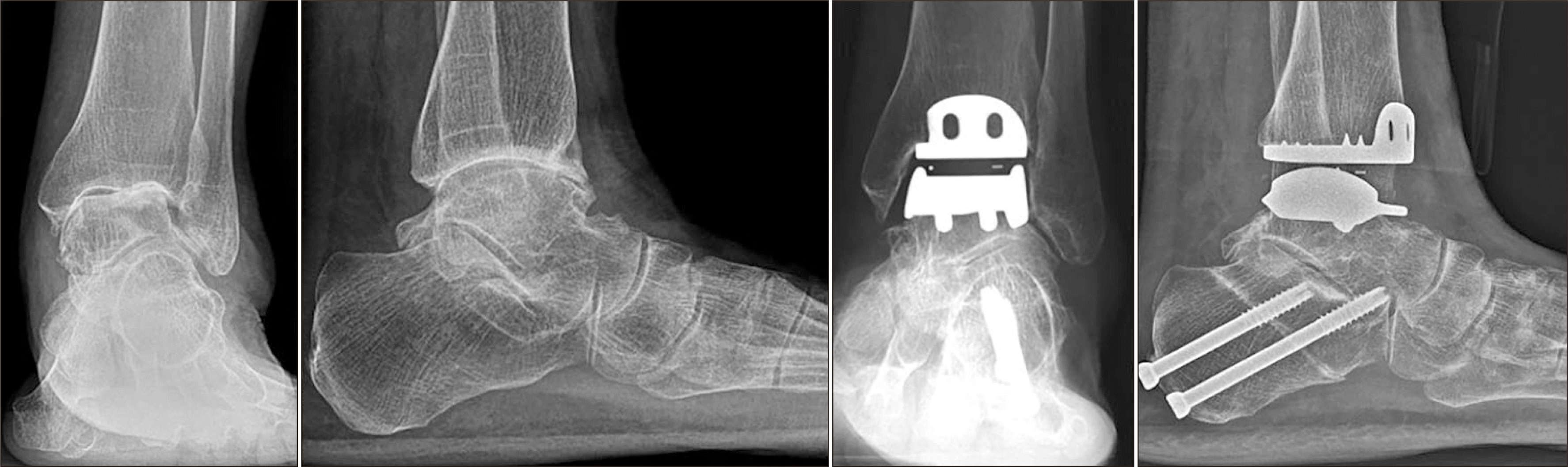
 XML Download
XML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