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Purpose
Despite continuous updates of standard treatment guidelines for acute ankle sprain and chronic ankle instability (CAI), in practice preferred treatment protocols vary widely. Based on a Korean Foot and Ankle Society (KFAS) member survey, this study reports current trends in the management of ankle ligament injuries.
Materials and Methods
Materials and A web-based questionnaire containing 34 questions was sent to all KFAS members in September 2021. Questions mainly addressed clinical experience and preferences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ankle ligament injuries. Answers with a prevalence of ≥50% among respondents were considered to reflect tendencies.
Results
Eighty-four of the 550 members (15.3%) responded. Answers that showed a tendency were as follows: commonest additional image study (ultrasound), conservative treatment modality (immobilization, oral medication), frequency of surgical treatment (<5 cases per annum), most important factor when deciding on surgical treatment (activity level, e.g., occupation or sport), and commonest surgical procedure (open ligament repair). Answers that showed a tendency for CAI were as follows: most important symptom (repeated sprain, giving way), radiological factors (talar tilt, osteochondral lesion, anterior talar translation), and patient factors (occupation, sports activities, recurrent instability after surgery, etc.). For decision making regarding surgical treatment and method, the most preferred surgical procedure was the modified Broström procedure, and the most common repair technique was suture anchor technique. The following were considered poor prognostic factors; generalized laxity, failed previous surgery, cavovarus, severe mechanical instability, heavy work, obesity, and dissatisfaction after surgery because of residual pain.
Conclusion
This study updates information regarding current trends in the management of ankle ligament injuries in Korea, and reveals consensus opinions and variations in approaches to patients with an acute or chronic injury. The divergence of approaches identified indicates the need for further studies to determine standard guidelines and long-term results.
Go to : 
급성 족관절 염좌(acute ankle sprain)는 관절 주위에 있는 다양한 인대의 손상을 야기하며, 해부학적으로 크게 외측 인대 손상, 원위경비인대(distal tibiofibular syndesmosis) 손상, 내측 삼각인대(deltoid ligament) 손상으로 나눌 수 있다. 전체 족관절 염좌의 약 90%∼95% 정도가 외측 염좌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 전거비인대(anterior talofibular ligament), 종비인대(calcaneofibular ligament), 후거비인대(posterior talofibular ligament) 등이 주로 손상되는 외측 인대 복합체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 실정이나 급성 족관절 염좌는 가장 흔한 근골격계 스포츠 손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의 경우 전체의 약 15%∼25%가량을 차지한다고 보고된다.2) 일반적으로 수상 후 3주 이내의 족관절 인대 손상을 급성 염좌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약 20%∼30%는 재손상이나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chronic ankle instability)으로 이행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므로3) 급성 족관절 인대 손상에 대한 적절한 초기 치료와 예방 조치는 만성 불안정증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 환자의 주 증상은 대개 족관절의 무력감(giving way) 또는 불안감으로 표현되는 기능적 불안정성(functional instability)이며 의료진에 의해 확인된 족관절의 기계적 불안정성(mechanical instability) 정도와 비골근 강화운동 및 고유수용감각 훈련 등의 기능회복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술을 결정하게 된다.4) 수술적 치료 방법은 크게 해부학적 수술법과 비해부학적 재건 수술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까지는 해부학적 인대 봉합술인 변형 Broström 술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선호되는 술식이다. 그러나 해부학적 인대 봉합술이 모든 환자에서 최선의 수술법이 될 수는 없다. 남아있는 인대 조직이 불량하여 봉합술을 적용하기에 제한이 있거나 족관절 인대 수술의 불량한 예후인자로 알려져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건 이식을 이용한 해부학적 인대 재건술 또는 다양한 보강물을 활용한 인대 봉합술(augmented ligament repair) 등이 시행되고 있다.5-7) 또한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과 흔히 동반되는 관절 내 병변들을 함께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관절경하 인대 봉합술도 점차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8)
급성 족관절 염좌 및 만성 불안정증 환자에서의 치료에 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표준치료지침(standard treatment guideline)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실제 임상에서는 매우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그중에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논란이 있는 치료 방법들도 있다. 특히 급성 족관절 염좌에서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 적절한 적응증의 선택,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에서 최근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술식들(관절경적 변형 Broström 술식, 봉합테이프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최소 침습적 인대 재건술 등) 사이의 임상적 유용성이나 장기 추시 안정성에 대한 문제 등은 치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다양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본 설문 연구에서는 족관절 인대 손상 환자들을 활발히 진료하고 있는 국내 정형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치료 경향의 변화와 추세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Go to : 
2021년 9월 총 550명의 대한족부족관절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족관절 인대 손상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설문조사가 웹(구글 드라이브)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12일간 시행되었으며 총 84명이 답변을 마쳐 최종 응답률은 15.3%였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6.7세(범위 34∼68세)로 30대가 12명(14.3%), 40대가 44명(52.4%), 50대가 23명(27.4%), 60대가 5명(5.9%)이었다. 응답자의 현 근무지 형태는 대학병원이 37명(44.0%), 전문병원이 12명(14.3%), 병원이 23명(27.4%), 의원이 12명(14.3%)이었다. 족부 영역의 수술 집도 및 진료 경력은 평균 12.1년(범위 1∼30년)으로 5년 미만이 9명(10.7%), 5∼10년이 21명(25%), 10∼15년이 28명(33.3%), 15∼20년이 14명(16.7%), 20년 이상이 12명(14.3%)이었다. 최근 5년간 족부 영역의 연간 수술 건수는 평균 100건 미만이 13명(15.5%), 100∼300건이 24명(28.6%), 300∼500건이 23명(27.4%), 500∼700건이 17명(20.2%), 700건 이상이 7명(8.3%)이었다. 전체 진료 환자 중 급성 염좌 및 만성 불안정증을 모두 포함한 족관절 인대 손상의 환자의 비율은 5% 미만이 9명(10.7%), 5%∼10%가 19명(22.6%), 10%∼15%가 19명(22.6%), 15%∼20%가 15명(17.9%), 20%∼30%가 16명(19.0%), 30% 이상이 6명(7.1%)이었다. 본 설문에서 급성 족관절 염좌에 의한 인대 손상은 전거비인대의 완전 파열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를 의미하였다.
Go to : 
급성 족관절 인대 손상 환자에게서 신체검사 및 단순방사선 사진 이외에 통상적으로 거의 항상 시행하는 검사로는 초음파 42명(50.0%), 부하 방사선 검사(stress view) 18명(21.4%),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검사 17명(20.2%), 기립 방사선 검사(standing view) 12명(14.3%),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r tomography) 3명(3.6%)이었으며 특별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21명(25.0%)있었다. 주로 선택하는 보존적 치료 방법을 최대 3개까지 문의한 결과, 깁스 또는 보조기를 이용한 고정(immobilization)이 77명(91.7%), 약물이 55명(65.5%), 목발 또는 지팡이 등을 이용한 체중부하 제한(restricted weight-bearing)이 38명(45.2%), 물리치료(physical therapy)가 21명(25.0%), 인대재생 촉진 주사가 4명(4.8%), 체외충격파(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가 3명(3.6%)에서 응답되었다. 주로 사용하는 보호 장치로는 부목(splint)이 41명(48.8%), 등자형 보조기(aircast 등)가 19명(22.6%), 석고고정(cast)이 17명(20.2%), walker-boots 또는 족관절 고정 보조기(ankle foot orthosis)가 4명(4.8%), 단순 족관절 보호대(elastic ankle bandage 등)가 3명(3.6%)이었다.
급성 족관절 인대 파열 후 족관절의 관절운동을 허용하는 시기는 ‘1주 이내’ 11명(13.1%), ‘1∼2주’ 38명(45.2%), ‘3∼4주’ 19명(22.6%), ‘1개월 이후’ 5명(5.9%)이었으며, ‘통증이 견딜만(tolerable)하다면 기간과 상관없이 허용한다’는 응답도 11명(13.1%) 있었다. 급성 족관절 인대 파열 후 체중부하를 허용하는 시기는 ‘1주 이내’ 26명(30.9%), ‘1∼2주’ 22명(26.2%), ‘3∼4주’ 13명(15.5%), ‘1개월 이후’ 3명(3.6%)이었으며, ‘통증이 견딜만하다면 기간과 상관없이 허용한다’는 응답도 20명(23.8%) 있었다. 급성 족관절 인대 파열 환자에서 MRI 검사를 결정하는 시기는 ‘수상 직후’가 13명(15.5%), ‘2주 정도의 보존적 치료 후’ 4명(4.8%), ‘2∼4주 정도의 보존적 치료 후’ 11명(13.1%), ‘1∼2개월 정도의 보존적 치료 후’ 16명(19.0%), ‘2∼3개월 정도의 보존적 치료 후’ 10명(11.9%), ‘3∼6개월 후 증상이 지속될 때만 시행한다’가 23명(27.4%)이었으며, ‘MRI가 필요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응답도 7명(8.3%) 있었다.
급성 족관절 인대 파열에 대한 연간 수술(인대 봉합술) 시행 빈도는(최근 5년간 평균) 5건 미만이 45명(53.6%), 5∼10건이 18명(21.4%), 10∼20건이 10명(11.9%), 20∼30건이 5명(5.9%), 30∼50건이 3명(3.6%), 50건 이상이 3명(3.6%)이었다.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기 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기간은 3개월 이상이 40명(47.6%), 2∼3개월이 14명(16.7%), 2주 이내가 11명(13.1%), 1∼2개월이 9명(10.7%), 2∼4주가 5명(5.9%), 수상 직후가 1명(1.2%)이었으며, ‘환자가 수술적 치료를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응답자도 4명(4.8%) 있었다. 급성 족관절 인대 파열에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는 기준을 최대 3개까지 문의한 결과, ‘스포츠 혹은 직업 등의 활동도’가 54명(64.3%), ‘관절 내 유리체 등의 동반 손상’이 40명(47.6%), ‘이번 외상 이전의 불안정증’이 38명(45.2%), ‘전거비인대의 완전 파열 및 원위경비인대나 삼각인대의 동반 손상’이 22명(26.2%), ‘환자의 나이’가 18명(21.4%), ‘파열된 인대의 감입(말려들어감)’이 15명(17.9%), ‘신체 다른 부위의 동반손상’이 9명(10.7%), ‘전거비인대의 완전 파열 및 종비인대의 파열’이 7명(8.3%), ‘하지의 부정정렬’이 5명(5.9%), ‘수상 직후의 통증 정도’가 3명(3.6%), ‘체중이나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1명(1.2%), ‘수상 직후의 심한 부종이나 피하출혈’이 1명(1.2%)에서 응답되었다. 주로 사용하는 수술 방법으로는 개방적 인대 봉합술이 52명(61.9%), 관절경 검사 후 개방적 인대 봉합술이 12명(14.3%), 관절경적 인대 봉합술이 9명(10.7%), 인대 재건술이 3명(3.6%), 단순 인대 보강술(internal brace augmentation 등)이 2명(2.4%)이었으며, ‘급성 족관절 인대 파열에 대해 수술한 적이 없다’는 응답자도 6명(7.1%) 있었다.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 환자의 증상에 대해 수술 필요성 판단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도(중요도를 0∼5점 사이에서 선택: 0점은 ‘전혀 중요하지 않음’/5점은 ‘매우 중요함’)를 설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Fig. 1).
① 반복적인 족관절 접질림: 중요도 평균은 4.4점/4점(중요함) 이상으로 응답한 술자는 69명(82.1%)
② 족관절의 무력감: 중요도 평균은 3.7점/4점(중요함) 이상으로 응답한 술자는 45명(53.6%)
③ 족관절 통증: 중요도 평균은 3.3점/4점(중요함) 이상으로 응답한 술자는 35명(41.7%)
④ 직업 혹은 운동 시의 불편감(피로도): 중요도 평균은 3.2점/4점(중요함) 이상으로 응답한 술자는 35명(41.7%)
⑤ 스포츠 능력 저하(참여 제한): 중요도 평균은 3.2점/4점(중요함) 이상으로 응답한 술자는 37명(44.0%)
단순 방사선 검사(stress view 포함) 및 MRI 검사 소견에서 수술 필요성 및 방법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도(중요도를 0∼5 사이에서 선택: 0점은 ‘전혀 중요하지 않음’/5점은 ‘매우 중요함’)에 대한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Fig. 2).
① 거골 경사각(talar tilt angle): 중요도 평균은 3.7점/4점(중요함) 이상으로 응답한 술자는 49명(58.3%)
② 동반된 골연골 병변: 중요도 평균은 3.6점/4점(중요함) 이상으로 응답한 술자는 47명(56.0%)
③ 거골 전방 전위(anterior talar translation): 중요도 평균은 3.5점/4점(중요함) 이상으로 응답한 술자는 44명(52.4%)
④ 관절 내 유리체: 중요도 평균은 3.4점/4점(중요함) 이상으로 응답한 술자는 40명(47.6%)
⑤ 비골하 골편(subfibular ossicle): 중요도 평균은 2.7점/4점(중요함) 이상으로 응답한 술자는 31명(36.9%)
⑥ 비골건 병변: 중요도 평균은 2.7점/4점(중요함) 이상으로 응답한 술자는 25명(29.8%)
⑦ 퇴행성 관절염 소견: 중요도 평균은 2.5점/4점(중요함) 이상으로 응답한 술자는 24명(28.6%)
⑧ 골극(bony impingement): 중요도 평균은 2.5점/4점(중요함) 이상으로 응답한 술자는 16명(19.1%)
환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관한 지표에서 수술 필요성 및 방법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도(중요도를 0∼5 사이에서 선택: 0점은 ‘전혀 중요하지 않음’/5점은 ‘매우 중요함’)에 대한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Fig. 3).
① 환자의 직업이나 활동도: 중요도 평균은 3.9점/4점(중요함) 이상으로 응답한 술자는 59명(70.2%)
② 스포츠 활동 참여도: 중요도 평균은 3.8점/4점(중요함) 이상으로 응답한 술자는 54명(64.3%)
③ 수술 후 재발 여부: 중요도 평균은 3.7점/4점(중요함) 이상으로 응답한 술자는 53명(63.1%)
④ 불안정증 유병 기간: 중요도 평균은 3.6점/4점(중요함) 이상으로 응답한 술자는 44명(52.4%)
⑤ 하지 부정정렬 또는 발의 변형: 중요도 평균은 3.6점/4점(중요함) 이상으로 응답한 술자는 50명(59.5%)
⑥ 전신성 인대 이완증 여부: 중요도 평균은 3.5점/4점(중요함) 이상으로 응답한 술자는 44명(52.4%)
⑦ 환자의 나이: 중요도 평균은 3.5점/4점(중요함) 이상으로 응답한 술자는 47명(55.9%)
⑧ 반대측 족관절의 불안정증 유무: 중요도 평균은 3점/4점(중요함) 이상으로 응답한 술자는 25명(29.8%)
⑨ BMI: 중요도 평균은 2.9점/4점(중요함) 이상으로 응답한 술자는 26명(31.0%)
⑩ 환자의 성별: 중요도 평균은 2점/4점(중요함) 이상으로 응답한 술자는 10명(11.9%)
신체검사 및 부하 방사선 검사상 뚜렷한 기계적 불안정증이 확인되는 경우 수술에 앞서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기간은 ‘1개월 이내’ 4명(4.8%), ‘1∼2개월’ 14명(16.7%), ‘2∼3개월’ 36명(42.9%), ‘3∼6개월’ 16명(19%), ‘6개월 이상’ 1명(1.2%)이었으며, ‘환자가 수술적 치료를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응답자가 11명(13.1%), ‘뚜렷한 불안정증이 발견되면 즉시 수술을 결정한다’는 응답자도 2명(2.4%) 있었다.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에 대한 연간 수술적 치료(인대 봉합술 및 인대 재건술) 시행 빈도는(최근 5년간 평균) 5건 미만이 18명(21.4%), 5∼10건이 5명(6.0%), 10∼20건이 18명(21.4%), 20∼30건이 14명(16.7%), 30∼50건이 14명(16.7%), 50∼100건이 9명(10.7%), 100건 이상이 6명(7.1%)이었다. 신체검사 및 부하 방사선 검사상 뚜렷한 기계적 불안정증이 확인되지 않는 기능적 불안정증(functional ankle instability)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의 역할에 대한 설문에는 ‘매우 도움이 된다’가 3명(3.6%),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가 38명(45.2%), ‘조금 도움이 된다’가 15명(17.9%), ‘거의 도움이 안된다’가 23명(27.4%),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가 5명(5.9%)에서 응답되었다.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 환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술 방법에 대한 질문에 답한 82명 중 고식적인 개방적 인대 봉합술(변형 Broström 술식)이 58명(70.7%), 개방적 인대 봉합술 및 신전 지대(extensor retinaculum) 이외의 조직이나 인조물을 이용한 보강술이 14명(17.1%), 관절경적 인대 봉합술이 8명(9.8%), 건 이식을 이용한 해부학적 인대 재건술이 2명(2.4%)에서 응답되었다. 인대 봉합술 시 외측 인대가 비골부착부에서 끊어진 경우 주로 사용하는 재부착(reattachment) 방법에 대한 질문의 응답자 81명 중 봉합 나사(suture anchor)가 65명(80.2%), 골 터널(bone tunnel, transosseous suture) 술식이 11명(13.6%), 비골 골막(periosteum)에 봉합하는 술식이 4명(4.9%)이었으며, 비골에 재부착시키지 않고 인대 중간부에서 중첩 봉합(plication) 한다는 응답자도 1명(1.2%) 있었다. 수술 시 봉합할 만한 인대 조직이 남아있지 않았던 경우는 평균 13.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의 약 30%는 봉합할 만한 인대 조직이 남아있지 않았던 빈도가 20% 이상이었다고 응답하였다.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 시 관절 내 병변을 위한 관절경 수술이 같이 시행되는 빈도는 평균 53.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의 약 51%는 관절경 수술을 같이 시행하는 경우가 50%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 시 각 동반 병변들을 동시에 치료하는 빈도에 대한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다빈도 응답 3개까지만 기술함) (Fig. 4).
① 활액막염: ‘거의 항상 시행’이 24명(28.6%), 30%∼50%가 12명(15.5%), 10%∼20%가 12명(14.3%)
② 연부조직 충돌(soft tissue impingement): 50% 이상이 15명(19.1%), 5%∼10%가 15명(17.9%), ‘거의 항상 시행’이 14명(16.7%), 5% 미만이 13명(15.5%)
③ 관절 내 유리체: 5%∼10%가 18명(21.4%), 10%∼20%가 14명(16.7%), ‘거의 항상 시행’이 12명(14.3%)
④ 거골 골연골 병변: 20%∼30%가 17명(20.2%), 10%∼20%가 14명(16.7%), 5%∼10%가 14명(16.7%), 5% 미만도 14명(16.7%)
⑤ 골극: 10%∼20%가 17명(20.2%), 5% 미만이 16명(19.1%), 5%∼10%가 14명(16.7%)
⑥ 비골건 병변: 5% 미만이 32명(38.1%), 5%∼10%가 17명(20.2%), 10%∼20%가 14명(16.7%)
⑦ 원위경비골간 인대결합(syndesmosis) 손상: 5% 미만이 34명(40.5%), 5%∼10%가 17명(20.2%), 10%∼20%가 10명(11.9%)
⑧ 후족부 부정정렬(내반 변형): 5% 미만이 41명(48.8%), 10%∼20%가 14명(16.7%), 5%∼10%가 13명(15.5%)
⑨ 아킬레스건 강직증(tightness): 5% 미만이 42명(50.0%), 5%∼10%가 15명(17.9%), 10%∼20%가 11명(13.1%)
인대 봉합술과 관련된 불량한 예후인자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도(중요도를 0∼5 사이에서 선택: 0점은 ‘전혀 중요하지 않음’/5점은 ‘매우 중요함’)에 대한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Fig. 5).
① 전신성 인대 이완증: 중요도 평균은 3.9점/4점(중요함) 이상으로 응답한 술자는 53명(63.1%)
② 이전 인대 수술 후의 재발성 불안정증: 중요도 평균은 3.8점/4점(중요함) 이상으로 응답한 술자는 53명(63.1%)
③ 후족부의 요내반 변형(cavovarus): 중요도 평균은 3.5점/4점(중요함) 이상으로 응답한 술자는 49명(58.3%)
④ 심한 기계적 불안정증: 중요도 평균은 3.5점/4점(중요함) 이상으로 응답한 술자는 44명(52.4%)
⑤ 육체적으로 노동 강도가 심한 직업: 중요도 평균은 3.4점/4점(중요함) 이상으로 응답한 술자는 44명(52.4%)
⑥ 고도 비만: 중요도 평균은 3.4점/4점(중요함) 이상으로 응답한 술자는 43명(51.2%)
⑦ 오랜 불안정증 유병기간: 중요도 평균은 3.1점/4점(중요함) 이상으로 응답한 술자는 31명(36.9%)
⑧ 큰 비골하 골편(>1 cm): 중요도 평균은 2.9점/4점(중요함) 이상으로 응답한 술자는 31명(36.9%)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에 대한 수술 후 불안정증이 재발되는 빈도는 평균 10.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의 약 55%는 불안정증이 재발되는 경우가 10%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재발성 불안정성 환자에서 주로 사용하는 재수술 방법에 대한 질문에 재수술을 한 경험이 없다고 답한 14명을 제외하고, 인대 봉합 후 보강술이 29명(41.4%), 개방적 인대 봉합의 재시행이 22명(31.4%), 자가건 또는 동종건 이식을 이용한 해부학적 인대 재건술이 15명(21.4%), 비해부학적 인대 재건술이 3명(4.3%), 관절경적 인대 봉합술 또는 재건술이 1명(1.4%)이었다.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에서 본인이 시행한 수술적 치료 후의 평균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29명(34.5%), ‘만족’이 47명(55.9%), ‘보통’이 6명(7.1%), ‘불만족’이 2명(2.4%), ‘매우 불만족’은 0명이었다. 수술적 치료 후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의 주된 이유를 최대 3개까지 문의한 결과, ‘잔존 통증’이 63명(75.0%), ‘불안정증의 재발’이 40명(47.6%), ‘기능적 불안정증의 불충분한 회복’이 28명(33.3%), ‘불충분한 운동능력 회복’이 22명(26.2%), ‘족관절의 관절운동 제한’이 20명(23.8%), ‘천부 비골신경 손상에 의한 불편감’이 11명(13.1%),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이 9명(10.7%), ‘창상 합병증’이 5명(5.9%)에서 응답되었다(Fig. 6). 본인이 수술 집도를 시작한 이후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에 대한 수술 술기가 충분히 숙련되는 데 걸린 기간은 ‘시작하자 마자’가 3명(3.6%), 1년 이하가 33명(39.3%), 1∼3년이 34명(40.5%), 3∼5년이 10명(11.9%), 5∼10년이 1명(1.2%), 10년 이상 또는 ‘아직도 어렵다’는 응답이 3명(3.6%)이었다.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 후 족관절의 관절운동을 허용하는 시기는 ‘1주 이내’ 4명(4.8%), ‘1∼2주’ 4명(4.8%), ‘2∼3주’ 16명(19.0%), ‘3∼4주’ 30명(35.7%), ‘4주 이후’ 30명(35.7%)이었다.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 후 체중부하를 허용하는 시기는 ‘1주 이내’ 2명(2.4%), ‘1∼2주’ 11명(13.1%), ‘2∼3주’ 20명(23.8%), ‘3∼4주’ 10명(11.9%), ‘4∼6주’ 21명(25.0%), ‘6주 이후’ 9명(10.7%)이었으며, ‘통증이 호전되면 즉시 허용한다’는 응답도 12명(14.3%) 있었다.
Go to : 
본 설문 연구는 다양한 경력과 근무 형태를 가진 대한족부족관절학회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족관절 인대 손상 치료의 동향을 조사하여 보고하고 있다. 특히 급성 족관절 외측 인대 파열 시의 접근법과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세부 현황 및 선호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설문 항목 중 응답자의 50% 이상이 선택한 내용은 현재 국내에서 일반적인 경향(tendency)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설문 응답률이 전체 회원의 15.3%로 제한되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명시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고, 족부족관절학회 회원이 아니면서 족관절 인대 손상을 치료하는 정형외과 의사들의 치료 경향은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으나 설문의 응답은 수술적 치료의 경험이 있는 활동적인 회원들이 주로 참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국내의 진단과 치료 경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설문 결과에서 나타난 양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급성 족관절 인대 손상 환자에게서 신체검사 및 단순방사선 사진 이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추가 검사는 초음파이다.
2) 급성 족관절 인대 손상 환자에서 주로 선택하는 보존적 치료 방법은 석고고정 또는 보조기를 이용한 고정과 약물 처방이다.
3) 급성 족관절 인대 파열에 대한 연간 수술(인대 봉합술) 시행 빈도는 대개 5건 미만이다.
4) 급성 족관절 인대 파열에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스포츠 혹은 직업 등의 활동도’이다.
5) 급성 족관절 인대 파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술법은 개방적 인대 봉합술이다.
6)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 환자에서 수술 필요성 판단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증상은 반복적인 족관절 접질림이며 그다음으로 족관절의 무력감이다.
7)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 환자에서 수술 필요성 및 방법 선택 시 영상 검사상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소견은 거골 경사각이며 그다음으로 동반된 골연골 병변 유무, 거골 전방 전위이다.
8)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에 환자에서 수술 필요성 및 방법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환자의 개별적인 특성은 직업이나 활동도이며 그다음으로 스포츠 활동 참여도, 수술 후의 재발 여부, 불안정증의 유병 기간, 하지 부정정렬 또는 발의 변형 유무, 전신성 인대 이완증 유무, 환자의 나이이다.
9)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술법은 고식적인 개방적 인대 봉합술(변형 Broström 술식)이다.
10) 인대 봉합술 시 외측 인대가 비골 부착부에서 끊어진 경우 주로 사용하는 재부착 방법은 봉합 나사를 이용하는 술식이다.
11)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 시 불량한 예후인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전신성 인대 이완증이며 그다음으로 이전 인대 수술 후의 재발성 불안정증, 후족부의 요내반 변형, 심한 기계적 불안정증, 육체적으로 노동 강도가 심한 직업, 고도 비만이다.
12)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 후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의 주된 이유는 ‘잔존 통증’이다.
최근 시행 빈도가 늘고 있는 급성 외측 족관절 염좌에서의 수술적 치료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영역이며,1,9-12) 수술적 치료의 임상적 우월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뚜렷한 근거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인대 손상의 중등도에 관계없이 동반 손상이 없는 급성 외측 족관절 염좌에서의 수술적 치료는 현재까지 권장되지 않으며 대개 외측 인대 복합체의 완전 파열(3단계 손상)과 심한 불안정성을 보이는 젊은 운동선수에 있어서만 제한적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15) 본 설문 연구에서 전체 응답자의 약 53.6%는 급성 족관절 인대 파열에 대한 연간 수술 시행 빈도는 5건 미만이었으나 30건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7.2%였다.
2018년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15개국, 32명의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 설문조사(international survey) 연구에서, Michels 등16)은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 환자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 상당수의 의견일치(consensus)가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제적인 표준 임상지침의 정립 가능성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높은 비율의 의견일치를 보인 주요 내용은 술 전 MRI 검사의 필수성(86.7%), 기능적 불안정증 환자에 대한 접근법(3∼6개월 이상의 재활치료 후에도 증상 호전에 실패하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 89.9%), 기계적 불안정증 환자에 대한 수술법(여전히 인대 봉합술이 대표적인 술식, 76.7%), 인대 재건술의 적응증(전신성 인대 이완증, 60%; 불량한 잔존 인대조직을 보이는 경우, 70%) 등이었으며 국내 술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 설문 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확인되었다. 반면, 응답자의 60%가 수술 필요성 및 방법 선택 시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를 필수 요소로 고려하지 않은 점, 기능적 불안정증 환자에 대한 수술법으로 관절경적 인대 봉합술을 가장 선호한 점(응답자의 40%) 등은 본 설문 연구에서의 국내 치료 경향과 큰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응답자가 각 소속 병원의 객관적인 통계자료에 근거하기보다는 본인의 경험과 대략적인 기억에 의존하여 답변을 제출한 것이므로 수집된 데이터의 정확성에 부족함(insufficient accuracy)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세부적인 수치나 백분율보다는 국내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족관절 인대 손상 치료법들의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참고 자료 정도로 활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웹(구글 드라이브) 기반으로 이루어진 본 설문조사의 최종 응답률은 15.3%로 총 550명 중 84명에서만 설문이 완료되어 수집된 데이터의 대표성에 부족함(insufficient representativeness)이 있다.
Go to : 
REFERENCES
1. van den Bekerom MP, Kerkhoffs GM, McCollum GA, Calder JD, van Dijk CN. 2013; Management of acute lateral ankle ligament injury in the athlete. Knee Surg Sports Traumatol Arthrosc. 21:1390–5. doi: 10.1007/s00167-012-2252-7. DOI: 10.1007/s00167-012-2252-7. PMID: 23108678.

2. DiGiovanni CW, Brodsky A. 2006; Current concepts: lateral ankle instability. Foot Ankle Int. 27:854–66. doi: 10.1177/107110070602701019. DOI: 10.1177/107110070602701019. PMID: 17054892.

3. Hubbard TJ. 2008; Ligament laxity following inversion injury with and without chronic ankle instability. Foot Ankle Int. 29:305–11. doi: 10.3113/FAI.2008.0305. DOI: 10.3113/FAI.2008.0305. PMID: 18348827.

4. Baumhauer JF, O'Brien T. 2002; Surgical considerations in the treatment of ankle instability. J Athl Train. 37:458–62. PMID: 12937567. PMCID: PMC164377.
5. Cho BK, Kim YM, Choi SM, Park HW, SooHoo NF. Revision anatomical reconstruction of the lateral ligaments of the ankle augmented with suture tape for patients with a failed Broström procedure. Bone Joint J. 2017; 99-B:1183–9. doi: 10.1302/0301-620X.99B9.BJJ-2017-0144.R1. DOI: 10.1302/0301-620X.99B9.BJJ-2017-0144.R1. PMID: 28860398.

6. Coetzee JC, Ellington JK, Ronan JA, Stone RM. 2018; Functional results of open Broström ankle ligament repair augmented with a suture tape. Foot Ankle Int. 39:304–10. doi: 10.1177/1071100717742363. DOI: 10.1177/1071100717742363. PMID: 29420055.

7. Kang HJ, Jung HG. 2018; Indications of lateral ankle ligament reconstruction with a free tendon and associated evidence. J Korean Foot Ankle Soc. 22:91–4. doi: 10.14193/jkfas.2018.22.3.91. DOI: 10.14193/jkfas.2018.22.3.91.

8. Guelfi M, Zamperetti M, Pantalone A, Usuelli FG, Salini V, Oliva XM. 2018; Open and arthroscopic lateral ligament repair for treatment of chronic ankle instability: a systematic review. Foot Ankle Surg. 24:11–8. doi: 10.1016/j.fas.2016.05.315. DOI: 10.1016/j.fas.2016.05.315. PMID: 29413768.

9. Pihlajamäki H, Hietaniemi K, Paavola M, Visuri T, Mattila VM. 2010; Surgical versus functional treatment for acute ruptures of the lateral ligament complex of the ankle in young me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 Bone Joint Surg Am. 92:2367–74. doi: 10.2106/JBJS.I.01176. DOI: 10.2106/JBJS.I.01176. PMID: 20833874.
10. Pijnenburg AC, Bogaard K, Krips R, Marti RK, Bossuyt PM, van Dijk CN. 2003; Operative and functional treatment of rupture of the lateral ligament of the ankle. A randomised, prospective trial. J Bone Joint Surg Br. 85:525–30. doi: 10.1302/0301-620X.85B4.13928. DOI: 10.1302/0301-620X.85B4.13928. PMID: 12793557.
11. Pijnenburg AC, van Dijk CN, Bossuyt PM, Marti RK. 2000; Treatment of ruptures of the lateral ankle ligaments: a meta-analysis. J Bone Joint Surg Am. 82:761–73. doi: 10.2106/00004623-200006000-00002. DOI: 10.2106/00004623-200006000-00002. PMID: 10859095.

12. Povacz P, Unger SF, Miller WK, Tockner R, Resch H. 1998; A randomized, prospective study of operative and non-operative treatment of injuries of the fibular collateral ligaments of the ankle. J Bone Joint Surg Am. 80:345–51. doi: 10.2106/00004623-199803000-00006. DOI: 10.2106/00004623-199803000-00006. PMID: 9531201.

13. Cho BK. 2018; Evidence-based treatment of acute lateral ankle sprain. J Korean Foot Ankle Soc. 22:135–44. doi: 10.14193/jkfas.2018.22.4.135. DOI: 10.14193/jkfas.2018.22.4.135.

14. Feger MA, Glaviano NR, Donovan L, Hart JM, Saliba SA, Park JS, et al. 2017; Current trends in the management of lateral ankle sprain in the United States. Clin J Sport Med. 27:145–52. doi: 10.1097/JSM.0000000000000321. DOI: 10.1097/JSM.0000000000000321. PMID: 27347860.

15. Al-Mohrej OA, Al-Kenani NS. 2016; Acute ankle sprain: conservative or surgical approach? EFORT Open Rev. 1:34–44. doi: 10.1302/2058-5241.1.000010. DOI: 10.1302/2058-5241.1.000010. PMID: 28461926. PMCID: PMC5367574.

16. Michels F, Pereira H, Calder J, Matricali G, Glazebrook M, Guillo S, et al. 2018; Searching for consensus in the approach to patients with chronic lateral ankle instability: ask the expert. Knee Surg Sports Traumatol Arthrosc. 26:2095–102. doi: 10.1007/s00167-017-4556-0. DOI: 10.1007/s00167-017-4556-0. PMID: 28439639.

Go to : 




 PDF
PDF Citation
Citation Print
Pr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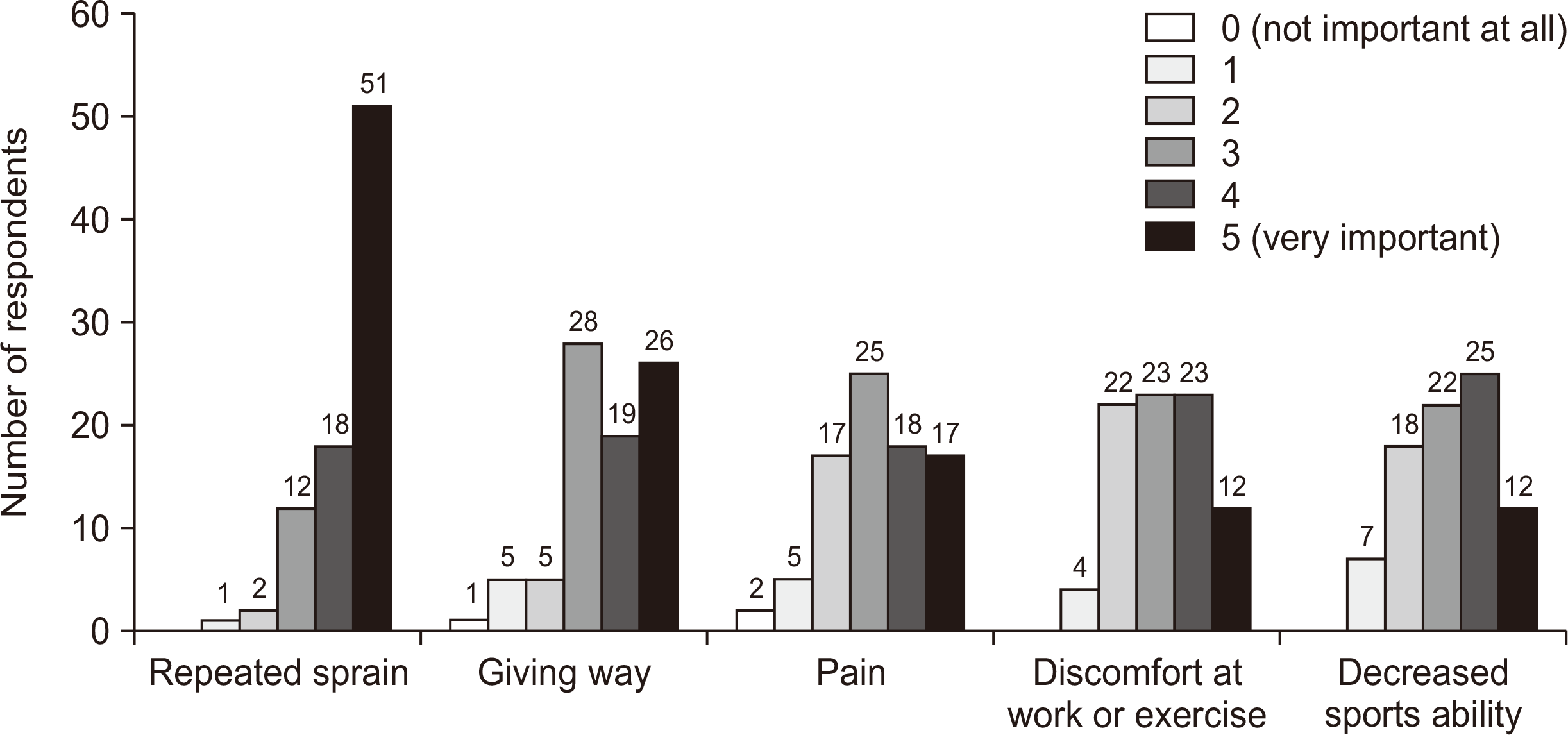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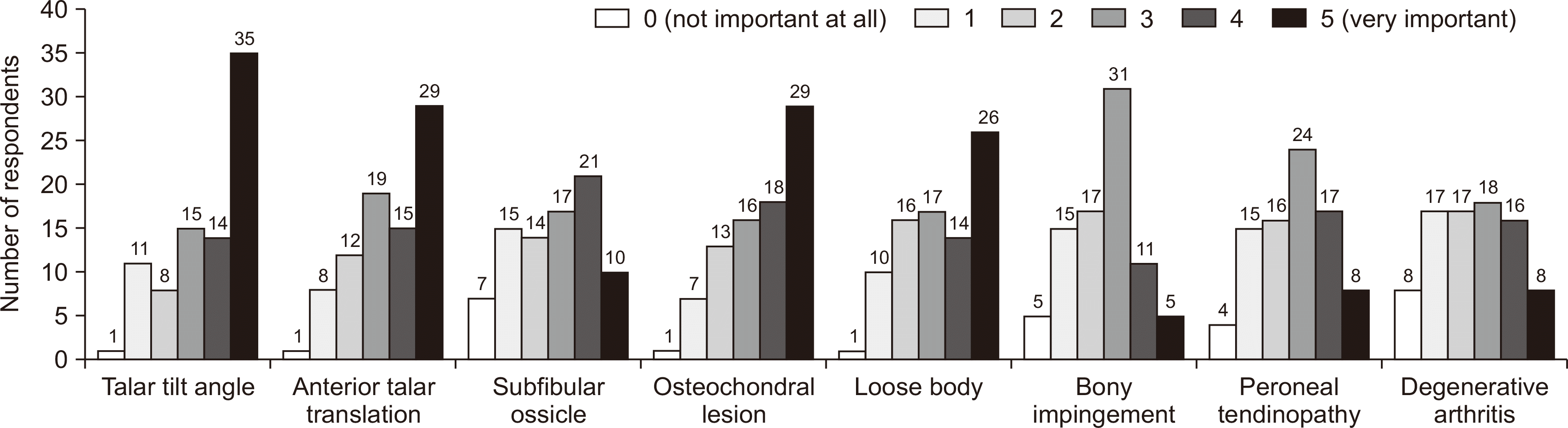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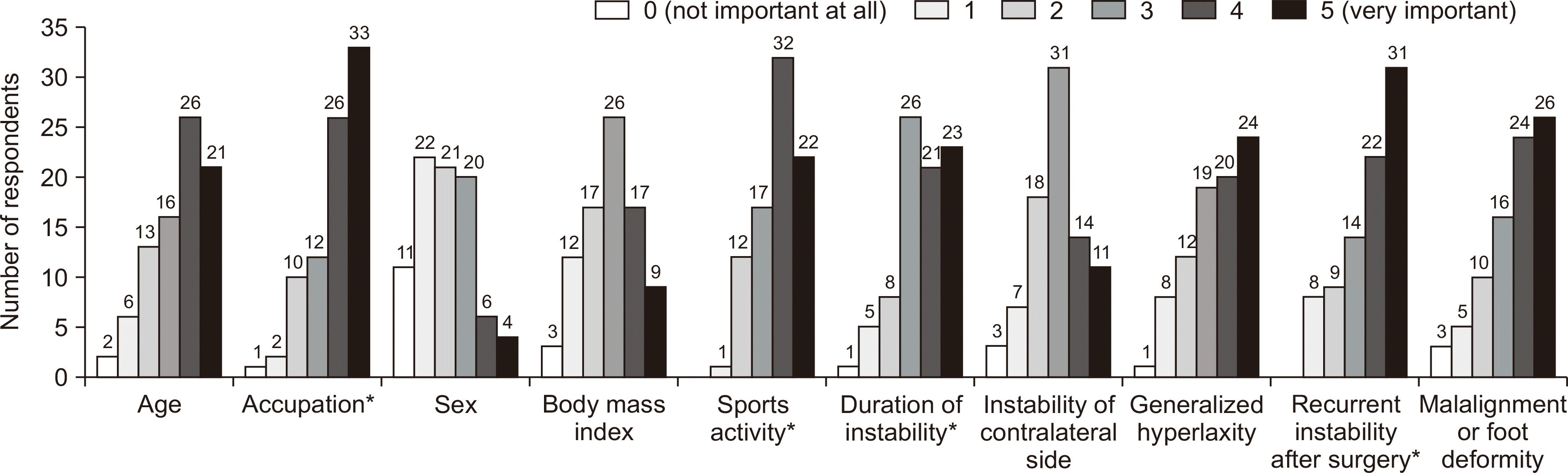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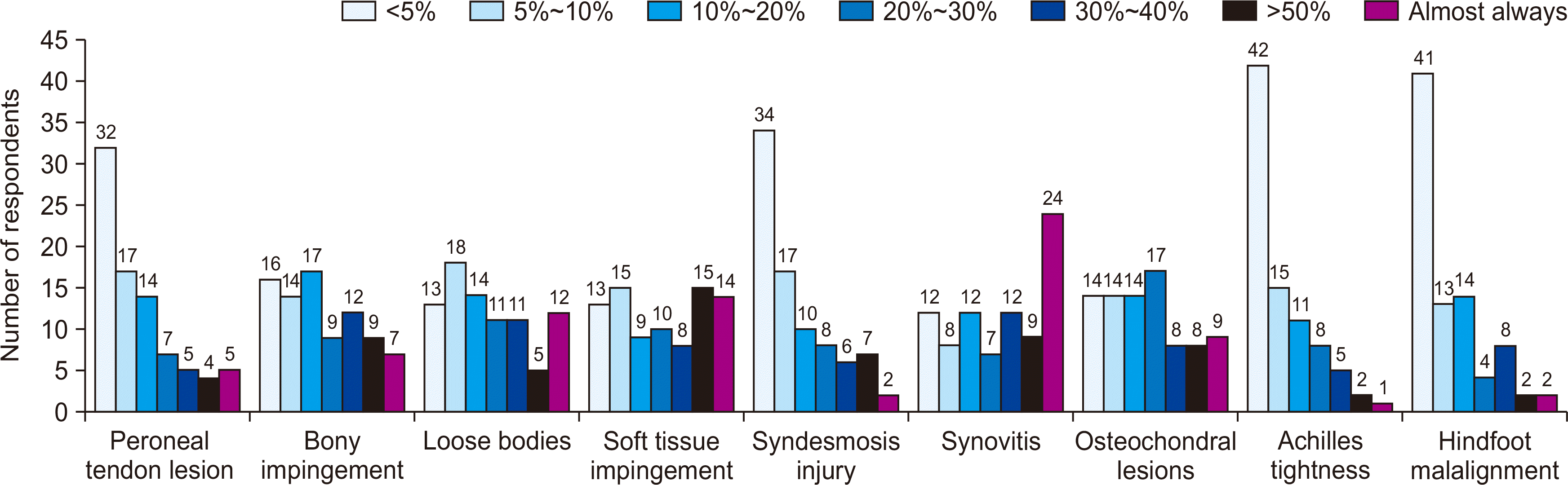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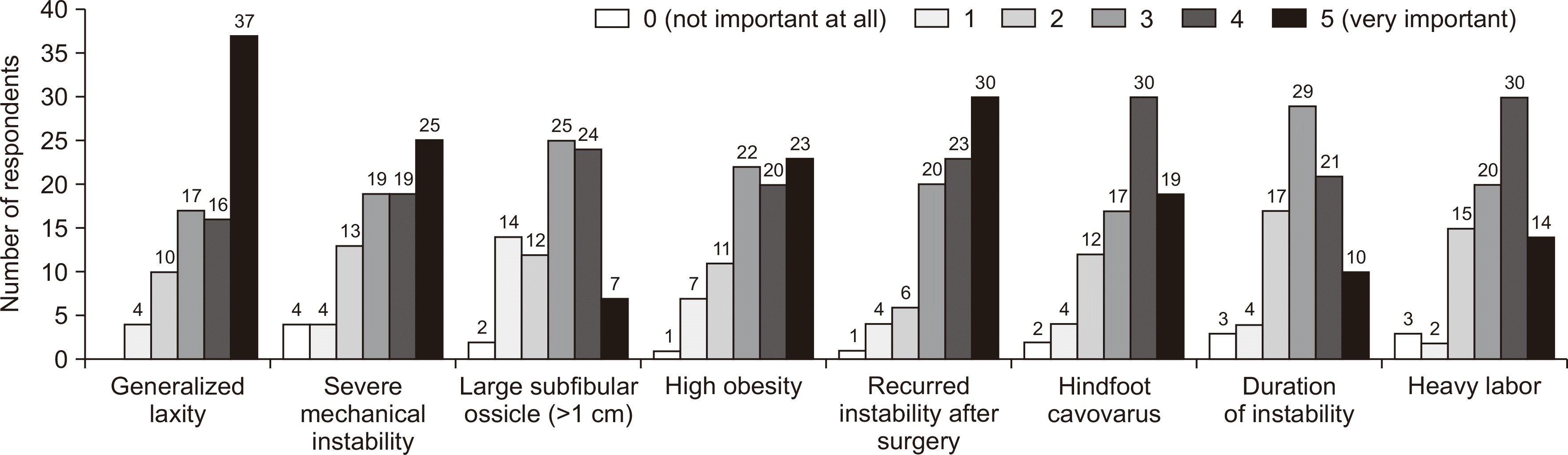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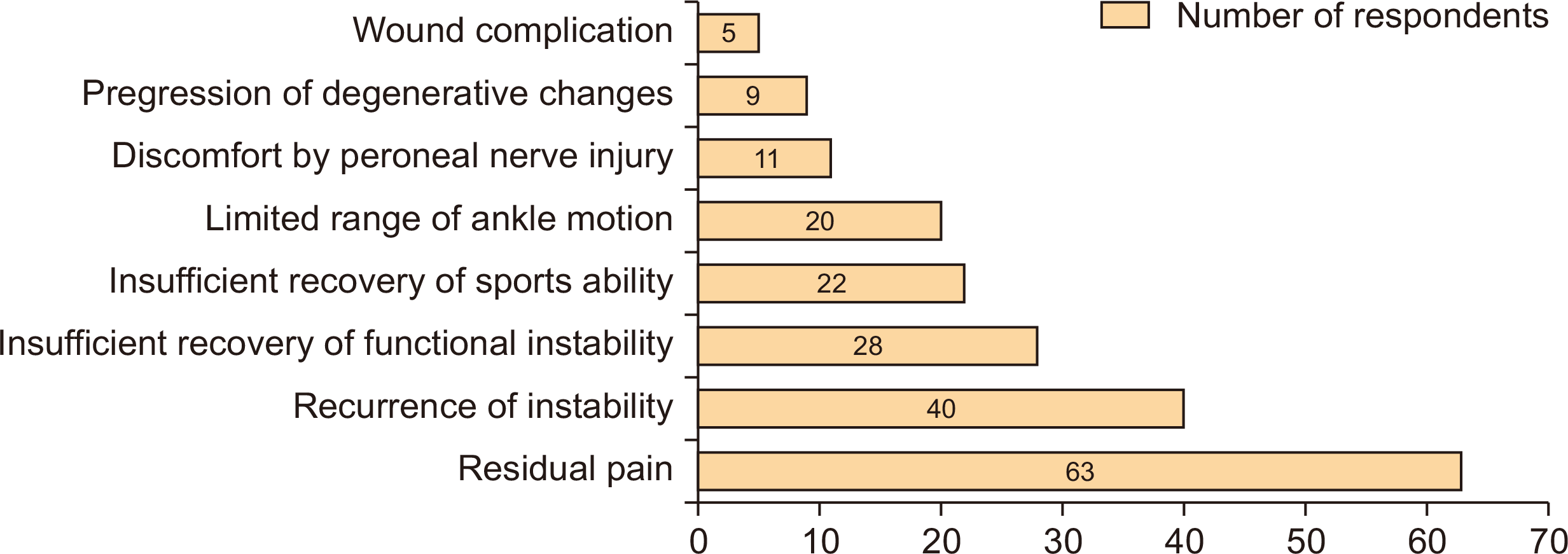
 XML Download
XML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