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has been
cited by other articles in ScienceCentral.
초록
치수 질환 그리고 치주 질환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치근단 조직과 변연부 치주 조직이 개통되는 것을 치주-근관 복합병소라 일컫는다. 치주-근관 복합 병소의 치료를 위해서는 근관치료 및 치주 재생 처치 둘 다를 필요로 하며, 이는 치근단 및 변연부 조직 모두의 치유를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치주-근관 복합 병소를 나타내는 하악 전치부 치아에서 근관치료 이후 조직유도 재생술을 시행하였으며, 각각의 증례에서 심한 치조골 흡수를 보이는 치아들은 3년이 넘는 경과 관찰기간 동안 발치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다. 따라서 하악 전치부에서 발생한 치주-근관 복합 병소의 근관치료 후 조직유도 재생술을 이용한 치료는 임상적으로 이점이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Go to :

Abstract
When inflammatory products are found in both periodontal and pulpal tissues simultaneously, a periodontal-endodontic combined lesion is established. The treatment of periodontal-endodontic combined lesions includes root canal therapy and periodontal regenerative procedure for resolution of both the apical and marginal inflammatory lesions. The present study reports the treatment of periodontal-endodontic combined lesions in the mandibular anterior area with root canal therapy, followed by guided tissue regeneration therapy. Teeth with severe bone destruction in each case could be preserved, without extraction, over a 3-year period. Therefore, it appears that treatment of periodontal-endodontic combined lesions in the mandibular anterior area using guided tissue regeneration technique after root canal therapy may provide clinical advantages.
Go to :

Keywords: 치주-근관 복합병소, 근관치료, 조직유도 재생술
Keywords: guided tissue regeneration, periodontitis, root canal therapy
서론
“치주-근관 복합 병소”는 치주와 치수 조직에서 염증성 산물로 인한 질환을 일컫는 용어이다.
1 치수 질환 그리고 치주 질환이 동시에 이환되어 치근단 조직과 변연부 치주 조직이 개통되면 치주-근관 복합 병소가 발생한다.
2 이 때 관여하는 해부학적 구조물들은 치근단공, 측방 근관, 부근관 그리고 상아세관 등으로 이들은 모두 치근단조직과 변연주 치주 조직을 연결시키는 혈관계를 이루고 있다.
3
치주-근관 복합 병소는 기원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1차적 치수질환에 의한 복합 병소, 1차적 치주질환에 의한 복합 병소 그리고 진성 복합 병소로 나눌 수 있다.
4 그러나 복합 병소에서 감별 진단을 정확히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임상가들이 질환의 진행과정에 대해 처음부터 현재 상태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의 병력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5 즉, 치주-근관 복합 병소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로 환자가 내원시 기원에 따라 정확히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심한 골 소실이 발생한 경우 치료의 예지성이 낮아진다.
치주-근관 복합 병소의 치료는 치주-근관 복합 병소의 치료를 위해서는 근관치료 및 치주 재생 처치 둘 다를 필요로 하며, 이는 치근단 및 변연부 조직 모두의 치유를 위함이다. 이 때 치주 재생 처치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술식이 재생형 골수술 중 조직유도 재생술이며, 이는 치조골 결손부를 차폐막으로 격리하여 치주인대내 미분화 세포들의 증식을 유도하여 치주 조직의 재생을 도모하기 위한 술식이다.
6,
7 본 연구에서는 치주-근관 복합 병소로 인해 근관치료 이후에도 잔존한 치조골 소실로 인한 증상 및 징후로 치주과에 의뢰된 환자들에서 조직유도 재생술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임상적, 방사선학적 결과를 두 가지 증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Go to :

증례보고
증례 A
67세의 남자 환자가 하악 좌측 중절치(#31) 부위에서 근관치료 후에도 잔존하는 깊은 치주낭이 관찰되어 개인 치과 의원에서 본원 치주과로 의뢰되었다. 환자의 구내 검사시 #31 부위의 근심협측에서 9 mm의 치주낭 깊이, 13 mm의 임상적 부착 수준이 탐지되었다. 치근단 방사선 사진에서도 #31의 근심에서 치근단 부위까지 방사선 투과상 병소가 관찰되었다. 이미 근관치료를 완료한지 6개월 정도 되었으므로 근관치료로는 광범위한 골소실 부위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외과적 치주치료 중 조직유도 재생술을 시행하기로 계획하였다. 하악 전치부에 1:100,000 에피네프린이 포함된 2% 리도카인(Lidocaine, Huons, Seongnam, Korea)을 이용하여 침윤 마취를 시행하고 15번 외과용 수술도로 열구 내 절개 후 판막을 거상하였다. #31의 근심협측 부위에서 치근단 하방까지 진행되어 있는 광범위한 골소실 부위가 관찰되었다. 골내 결손부에 잔존하는 육아조직을 먼저 소파하고 치근면에 부착되어 있던 치석을 제거하였다. 이후, 골흡수 부위에 이종골(small granules, particle size 0.25 - 1 mm, Bio-Oss, Geistlich, Wolhusen, Swiss)과 흡수성 차단막(13 × 25 mm, Bio-Gide, Geistlich)을 이용한 조직유도 재생술을 시행하였다. 비흡수성 단일사(Ethilon 4-0, Ethicon, Cincinnati, USA)를 이용하여 단속 치간 봉합법으로 봉합을 완료하였다. 3년까지 경과관찰 기간 동안 부종이나 발적 등의 연조직 염증 소견 없이 #31 근심 협측 부위의 치주낭 깊이와 임상적 부착 수준은 각각 3 mm, 9 mm로 유지되었다. 외과적 치주치료 이후 치은 퇴축의 정도는 증가하여 초기에 4 mm이던 부위가 6 mm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Table 1). 치근단 방사선 사진에서도 근심측 골소실 부위가 점차 신생골로 대체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Fig.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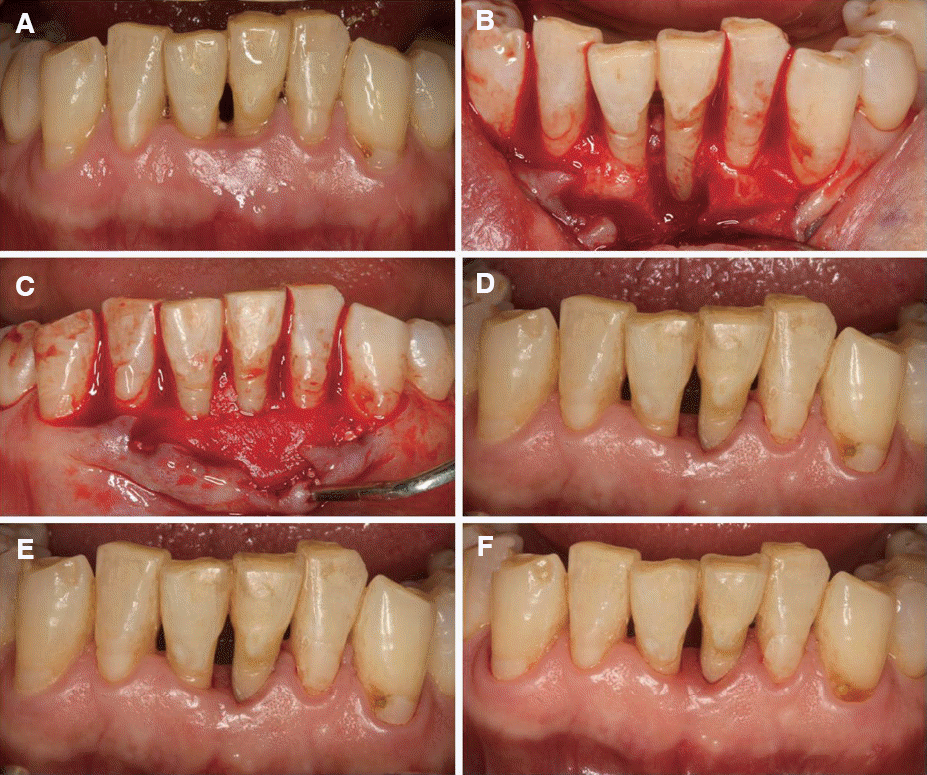 | Fig. 1Clinical photograph of Case A: (A) Initial photograph, (B) After removal of granulation tissue during guided tissue regeneration therapy (six months after root canal therapy), (C) After adaptation of xenograft bone graft material and resorbable membrane, (D) Follow-up after 6 months, (E) Follow-up after 1 year, (F) Follow-up after 3 year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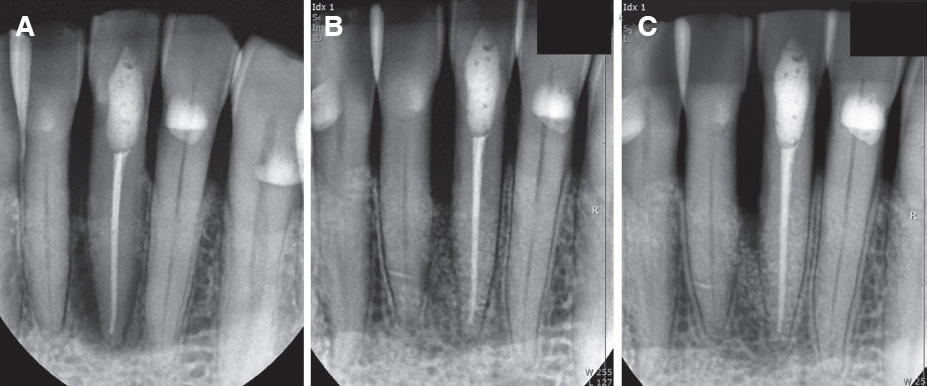 | Fig. 2Periapical radiography of Case A: (A) Initial radiography (six months after root canal therapy), (B) Six months after guided tissue regeneration therapy, (C) Three years after guided tissue regeneration therapy 
|
Table 1
Changes in clinical parameters from initial visit to 3-year follow-up
|
Case |
Parameters |
1st visit |
6-month follow-up |
1-year follow-up |
2-year follow-up |
3-year follow-up |
|
A (#31) |
PD |
9 mm |
5 mm |
4 mm |
3 mm |
3 mm |
|
CAL |
13 mm |
11 mm |
10 mm |
9 mm |
9 mm |
|
GR |
4 mm |
6 mm |
6 mm |
6 mm |
6 mm |
|
B (#31,41) |
PD |
7 mm/8 mm |
4 mm/ 4 mm |
3 mm/3 mm |
3 mm/3 mm |
3 mm/2 mm |
|
CAL |
8 mm/10 mm |
6 mm/6 mm |
6 mm/5 mm |
6 mm/5 mm |
6 mm/4 mm |
|
GR |
1 mm/2 mm |
2 mm/2 mm |
3 mm/2 mm |
3 mm/2 mm |
3 mm/2 m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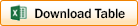
증례 B
63세의 남자 환자로 본원 치과보존과에서 #41 부위의 근관치료를 완료한 후에도 치근단 방사선 사진상 하악 중절치 부위의 골소실 부위가 감소하지 않고 동요도가 2도 정도로 지속되어 발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치주과로 의뢰되었다. 치과보존과에서 초진 당시 #41 부위만 전기 치수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기에 #41만 근관치료를 시행하였다. 근관충전 후 3개월이 경과하였으나, 방사선 사진상 골소실 부위는 여전히 #31에서 #41에 이르는 광범위한 채로 남아있었다. 구내 검사시 누공과 부종이 관찰되었고, #31 부위에서 7 mm, 41 부위에서 8 mm의 치주낭 깊이가 탐지되었다. 본 증례는 근관치료 이후에도 골소실 부위가 해결되지 않아 근관 기원만의 치근단 병소가 아닌, 치주-근관 복합 병소로 진단하였다. 또한 근관치료가 완료된 후 이미 3개월 이상을 기다린 상태였으므로, 더 이상의 근관치료 자체로 인한 골 치유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외과적 치주치료 중 하나인 조직유도 재생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근관치료 완료 4개월째 하악 전치부에서 1:100,000 에피네프린이 포함된 2% 리도카인을 이용하여 침윤마취를 시행후 15번 외과용 수술도로 열구내 절개를 이용하여 판막을 거상하였다. #31,41의 협측 및 설측에 이르는 골소실 부위가 관찰되었으며, 오염된 육아조직을 먼저 제거하고 치근면에 부착된 괴사된 조직과 치석을 제거하였다. 이후 골흡수 부위에 이종골과 흡수성 차단막을 이용하여 조직유도 재생술을 시행하였다. 비흡수성 단일사를 이용하여 단속 치간 봉합법으로 봉합을 완료하였다. 수술 당일, 동요도가 있는 치아의 안정을 위해 복합레진을 이용한 잠간 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교합 간섭을 제거하기 위해 교합 조정을 하였다. 술후 1년까지 내원시마다 교합 간섭이 있는지 점검하였고 필요시 교합 조정을 시행하였다. 또한 조직유도 재생술을 완료한지 1년째 경과 관찰 기간부터 잠간 고정술을 위해 해당 치아와 인접치에 부착하였던 복합레진을 부분적으로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3년까지 경과관찰 기간 동안 부종이나 발적 등의 연조직 염증 소견 없이 #31, #41 부위의 치주낭 깊이는 각각 3 mm, 2 mm로 유지되었다. 다만, 외과적 치주치료 이후 치은 퇴축의 정도는 증가하여 #31 협측에서 초기에 1 mm이던 부위가 3 mm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Table 1). 3년의 경과관찰 기간 동안 치근단 방사선 사진상 골소실 부위가 점점 줄어들고 조직유도 재생술을 시행한 부위가 신생골로 대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Fig.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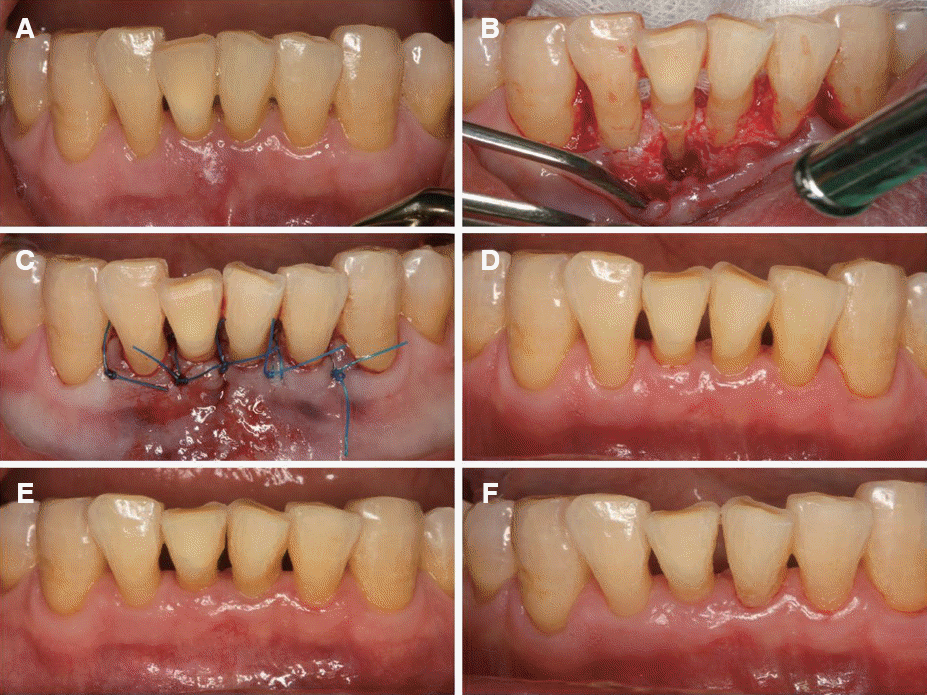 | Fig. 3Clinical photograph of Case B: (A) Initial photograph showing fistula and swelling at mandibular right central incisor (immediately after root canal therapy), (B) After removal of granulation tissue during guided tissue regeneration therapy (three months after root canal therapy), (C) After adaptation of xenograft bone graft material and resorbable membrane, followed by suturing, (D) Follow-up after 6 months, (E) Follow-up after 1 year, (F) Follow-up after 3 year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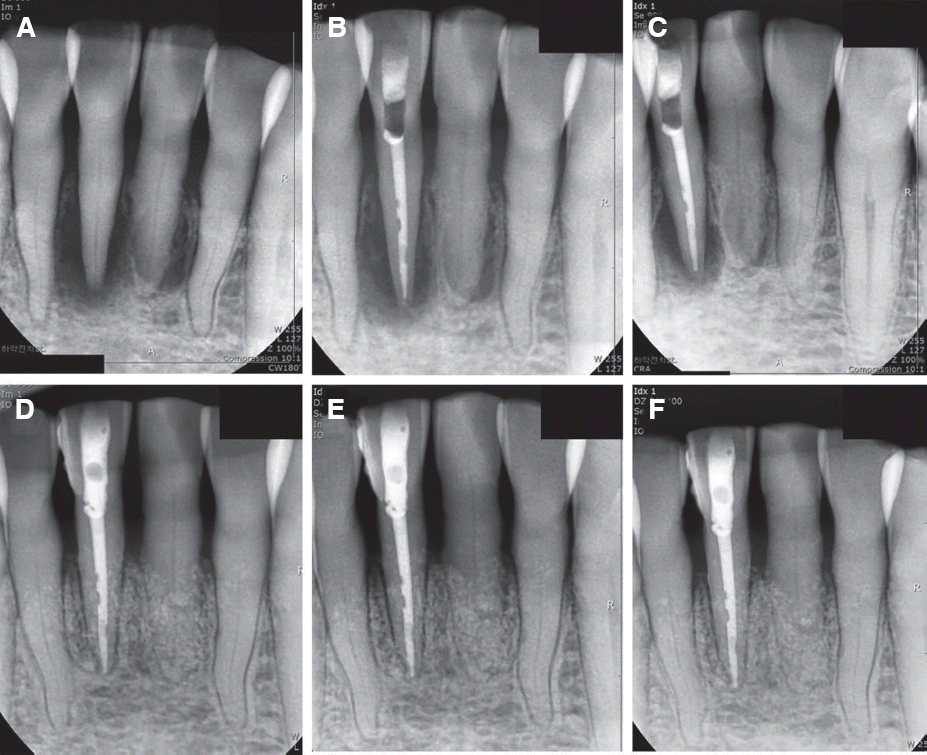 | Fig. 4Periapical radiography of Case B: (A) Initial radiography, (B) Immediately after root canal therapy, (C) Three months after root canal therapy, (D) Six months after guided tissue regeneration therapy, (E) One year after guided tissue regeneration therapy, (F) Three years after guided tissue regeneration therapy 
|
Go to :

고찰
치주-근관 복합 병소에서 변연 조직에서부터 치근단 조직까지 개통되어 있는 경우 감별 진단이 쉽지 않으며, 치료법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치주 조직의 파괴 없이 치수 병소만 존재하는 경우 근관치료만 시행하면 되나, 증가된 치주낭 깊이, 치은 부종, 광범위한 골소실이 동반되면서 치수 괴사가 관찰된다면 근관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이후 필요시 치주염 치료를 시행한다.
5,
8 그러나 전기 치수 반응 검사에서 양성을 나타내면, 즉 유수치인 경우 근관치료 없이 치주치료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치주 조직만의 염증이 복합 병소의 기원이라고 진단되면, 별도의 근관치료 과정 없이 치주치료 만으로 염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8-
10 그러나 Bender와 Seltzer 등
11은 치주 질환이 치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178개의 치아를 조직학적으로 관찰한 결과, 우식이나 수복치료를 받지 않았으나 치주질환에 이환된 치아의 79%가 치수내 병적인 변화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Bergenholtz와 Lindhe 등
12도 치주염에 이환된 치아의 57%에서 치수의 병적인 변화를 관찰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후 치주염이 장기간 지속되면 치수 조직의 섬유화, 석회화, 교원섬유의 흡수 등이 유발되며 불규칙한 또는 반응성 상아질 형성이 일어나기도 한다.
3 따라서 치주염 그 자체가 치수에 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치근단공의 미세 혈관 구조가 병적인 침범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치수는 생활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13 치주 질환으로 치수 조직내 병적인 변화가 유발되어도 주근관이 관여되지 않는 한, 치수는 전기 치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것은 대구치에서 치수의 부분 괴사만 진행된 경우 더욱 흔하다.
3,
14
만일 치수염으로 치수가 괴사된다면, 치근단공에서 또는 부근관에서 치주 인대를 매개로 한 염증성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즉, 치수 기원의 염증성 부산물이 치근단에 도달하게 되면, 측방 근관, 부근관 그리고 상아 세관이 치주 조직에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11 치근단 병소와 함께 치근단공의 직경, 협측 또는 설측골판의 부재 등은 직접적으로 치주 조직의 치유에 영향을 준다.
15 따라서 치수 기원의 치근단 병소의 존재는 치주 인대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 치주 조직의 파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전통적인 치주치료에 대한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16
치석제거술이나 치근활택술 또는 치주수술 동안 치수내로 미생물의 침범과 치수의 이차적인 괴사가 일어날 수 있다.
13 그 이유는 치석제거술이나 치주수술 동안 상아질이 치근 표면으로부터 기구 조작에 의해 제거되어 미생물이 상아세관으로 침투되어 치수에 염증성 병변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12 이와 유사하게 근관치료 없이 치주수술만 시행한 경우 치수 생활력을 상실한 경우도 있다.
17 일부 연구에서는 1차적 치주질환에 의한 복합병소에 의한 경우라도 근관치료 자체 만으로도 치주 조직의 재생이 일어남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18 따라서 골소실이 동반된 치주-근관 복합 병소에서 치아를 치료할 경우, 외과적 치주치료 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근관치료의 선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근관치료 이후 외과적 치주치료로 잔존한 골 결손부를 처치하여야 하며, 이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술식이 조직유도 재생술이다.
5 조직유도 재생술은 차단막을 이용하여 치주낭 상피와 접합상피의 치근단 방향으로의 이주를 차단하고 선택된 조직으로부터 세포증식을 유도하여 상실된 치주 조직을 재생할 수 있는 원리를 이용하는 술식이다.
19 본 증례에서도 근관치료 이후 잔존한 골결손부를 처치하기 위해 조직유도 재생술을 시행하였다. 다만, 근관치료 자체가 치근단 부위에서 상당히 많은 골치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근관치료 이후 최소 3개월 정도는 기다렸다가 재평가 이후 치주수술을 하는 것이 추천된다.
5 본 증례에서도 근관치료 이후 모두 3개월 이상 경과한 후 재평가를 시행한 후 조직유도 재생술을 시행하였다.
외과적 치주치료를 계획할 때 근관치료 이후 임상적 동요도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면, 잠간 고정술을 고려해야 한다.
5 왜냐하면, 조직 유도 재생술 등 외과적 치주치료를 받은 치아에서 증가된 동요도는 상피 부착의 근단부 이주 등으로 인하여 치조골 재생 및 치주 조직 재생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 본 증례에서도 근관 치료 이후에도 처음부터 존재하던 동요도가 감소하지 않아 조직유도 재생술 직후 잠간 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당일에 교합간섭을 제거하기 위한 교정 조정을 하였다. 이후 경과 관찰시 골 결손부가 치유되어 감에 따라 잠간 고정술에 이용된 복합 레진을 부분적으로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본 증례에서는 두 증례 모두 치조정에서부터 치근단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골소실이 관찰되어 근관치료를 먼저 시행하였으나 근관치료 만으로는 골 결손부가 해결되지 않았다. 첫번째 증례의 경우 타 의원에서 근관치료를 완료한 후 의뢰하였으며, 근관치료 시행전 전기 치수 반응 검사가 음성이었는지 양성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또한 전기 치수 반응 검사에서 양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근관치료를 의도적으로 시행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근관치료를 완료한지 6개월 정도가 경과 되었음에 불구하고 협측에서 광범위한 골 소실 부위가 잔존함을 보았을 때 단순한 치수 기원의 병소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워 부가적인 치주수술을 시행하기로 계획하였다. 두번째 증례의 경우 치과보존과에서 전기 치수 반응 검사에서 음성을 나타낸 치아만 먼저 근관치료를 시행하였으나 근관치료 이후에도 잔존하는 광범위한 골 결손부 때문에 치주과에 의뢰하였다. 두 증례 모두 단순한 치수 병소 기원이 아닌 치주-근관 복합 병소로 인한 광범위한 골소실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근관치료 이후에도 잔존한 골소실로 지속적인 징후 또는 증상이 관찰되어 의뢰된 상기와 같은 증례들에서는 결국 외과적 치주치료가 동반되어야 하며, 이 때 조직유도 재생술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치주-근관 복합 병소에서 근관치료와 조직유도 재생술로 치아를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구강 위생관리 능력과 협조도가 필수적일 것이며, 근관치료 및 조직유도 재생술로 치근단 및 변연부 조직에서 염증 산물을 완전히 제거함이 전제조건일 것이다. 본 증례에서는 협조도가 좋은 환자에서 구치부 다근치 보다 치료를 위한 기구의 접근이 쉽고 시야 확보가 잘 되는 전치부 단근치 치아에 해당 술식을 진행하였기에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치주-근관 복합 병소를 치료하고자 할 때 상기와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Go to :

결론
치주-근관 복합 병소로 인해 변연부 치주 조직 뿐만 아니라 치근단 부위 조직까지 광범위한 골소실이 관찰되는 경우, 치아를 보존하기 위해 근관치료와 함께 조직유도 재생술과 같은 재생형 골수술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증례에서 치주-근관 복합병소로 인해 근관치료 이후에도 잔존한 골 결손부로 인한 증상 및 징후로 의뢰된 환자들에서 근관치료 이후 조직유도 재생술을 시행하여 치주낭 깊이의 감소, 신생골 형성 등을 관찰할 수 있었다.
Go to :

Acknowledgements
본 연구는 2018년도 부산대학교병원 임상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Go to :

References
1. Singh P. Endo-perio dilemma:a brief review. Dent Res J. 2011; 8:39–47. PMID:
22132014. PMCID:
PMC3177380.
4. Simon JH, Glick DH, Frank AL. The relationship of endodontic-periodontic lesions. J Periodontol. 1972; 43:202–8. DOI:
10.1902/jop.1972.43.4.202. PMID:
4505605.
5. Oh SL, Fouad AF, Park SH. Treatment strategy for guided tissue regeneration in combined endodontic-periodontal lesions:case report and review. J Endod. 2009; 35:1331–6. DOI:
10.1016/j.joen.2009.06.004. PMID:
19801225.
6. Pontoriero R, Nyman S, Lindhe J, Rosenberg E, Sanavi F. Guided tissue regeneration in the treatment of furcation defects in man. J Clin Periodontol. 1987; 14:618–20. DOI:
10.1111/j.1600-051X.1987.tb01526.x. PMID:
3480298.
7. Pontoriero R, Nyman S, Ericsson I, Lindhe J. Guided tissue regeneration in surgically-produced furcation defects:An experimental study in the beagle dog. J Clin Periodontol. 1992; 19:159–63. DOI:
10.1111/j.1600-051X.1992.tb00632.x. PMID:
1556243.
8. Casullo DP. The integration of endodontics, periodontics and restorative dentistry in general practice. Part I. Diagnosis. Compend Contin Educ Gen Dent. 1980; 1:137–47. PMID:
6950830.
9. Gold SI, Moskow BS. Periodontal repair of periapical lesions:the borderland between pulpal and periodontal disease. J Clin Periodontol. 1987; 14:251–6. DOI:
10.1111/j.1600-051X.1987.tb01528.x.
10. Langeland K, Rodrigues H, Dowden W. Periodontal disease, bacteria, and pulpal histopathology. Oral Surg Oral Med Oral Pathol. 1974; 37:257–70. DOI:
10.1016/0030-4220(74)90421-6.
11. Bender IB, Seltzer S. The effect of periodontal disease on the pulp. Oral Surg Oral Med Oral Pathol. 1972; 33:458–74. DOI:
10.1016/0030-4220(72)90476-8.
12. Bergenholtz G, Lindhe J. Effect of experimentally induced marginal periodontitis and periodontal scaling on the dental pulp. J Clin Periodontol. 1978; 5:59–73. DOI:
10.1111/j.1600-051X.1978.tb01907.x. PMID:
97332.
13. Rotstein I, Simon JH. Diagnosis, prognosis and decision-making in the treatment of combined periodontal-endodontic lesions. Periodontol 2000. 2004; 34:165–203. DOI:
10.1046/j.0906-6713.2003.003431.x. PMID:
14717862.
15. Brugnami F, Mellonig JT. Treatment of a large periapical lesion with loss of labial cortical plate using GTR:a case report. Int J Periodontics Restorative Dent. 1999; 19:243–9. PMID:
10635170.
16. Jansson L, Ehnevid H, Blomlöf L, Weintraub A, Lindskog S. Endodontic pathogens in periodontal disease augmentation. J Clin Periodontol. 1995; 22:598–602. DOI:
10.1111/j.1600-051X.1995.tb00811.x. PMID:
8583015.
17. Blank BS, Levy AR. Combined treatment of a large periodontal defect using GTR and DFDBA. Int J Periodontics Restorative Dent. 1999; 19:481–7. PMID:
10709514.
18. Kwon EY, Cho Y, Lee JY, Kim SJ, Choi J. Endodontic treatment enhances the regenerative potential of teeth with advanced periodontal disease with secondary endodontic involvement. J Periodontal Implant Sci. 2013; 43:136–40. DOI:
10.5051/jpis.2013.43.3.136. PMID:
23837128. PMCID:
PMC3701835.
19. Nyman S, Gottlow J, Karring T, Lindhe J. The regenerative potential of the periodontal ligament. An experimental study in the monkey. J Clin Periodontol. 1982; 9:257–65. DOI:
10.1111/j.1600-051X.1982.tb02065.x. PMID:
6954167.
20. Ferencz JL. Splinting. Dent Clin North Am. 1987; 31:383–93.
Go to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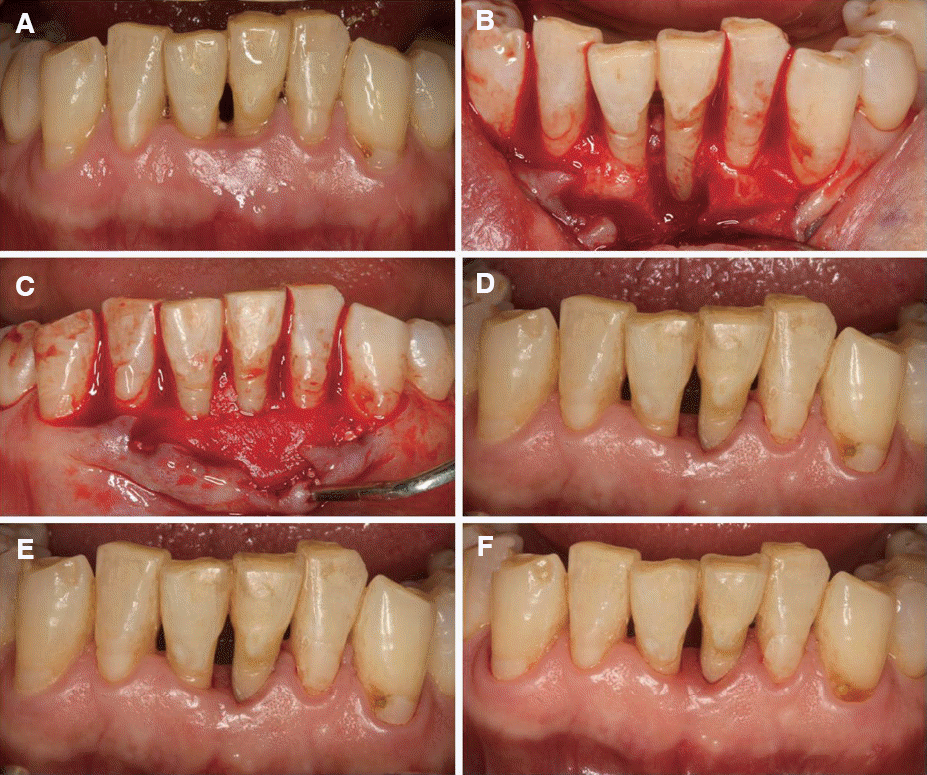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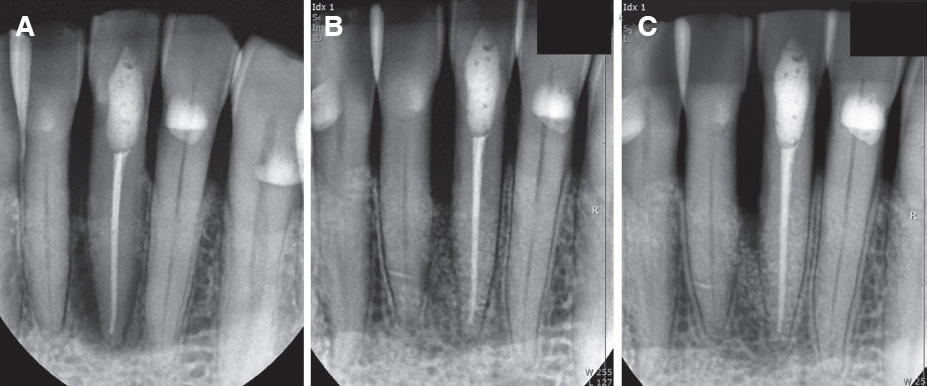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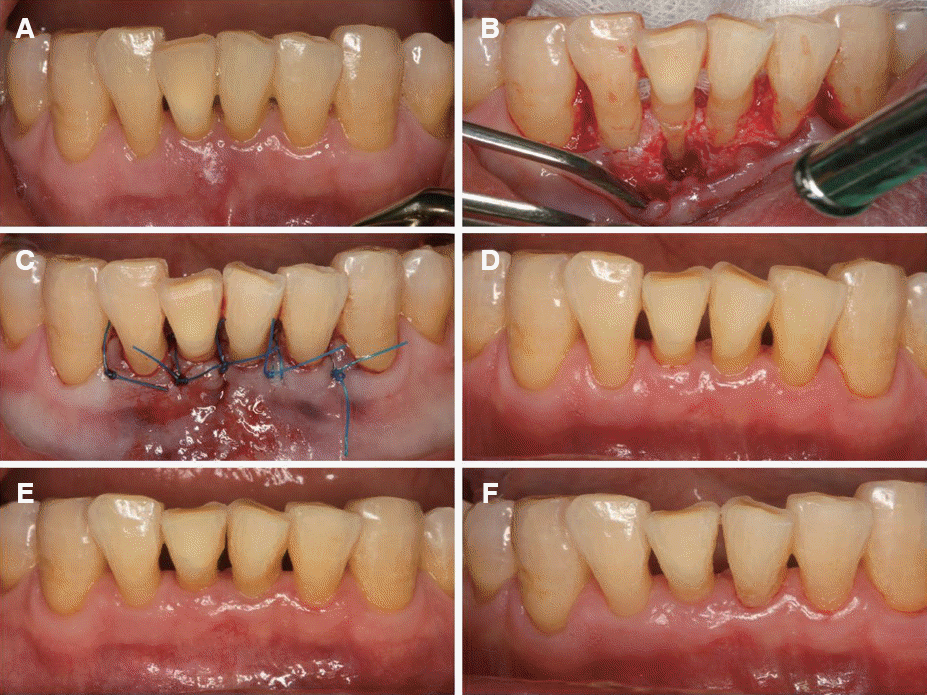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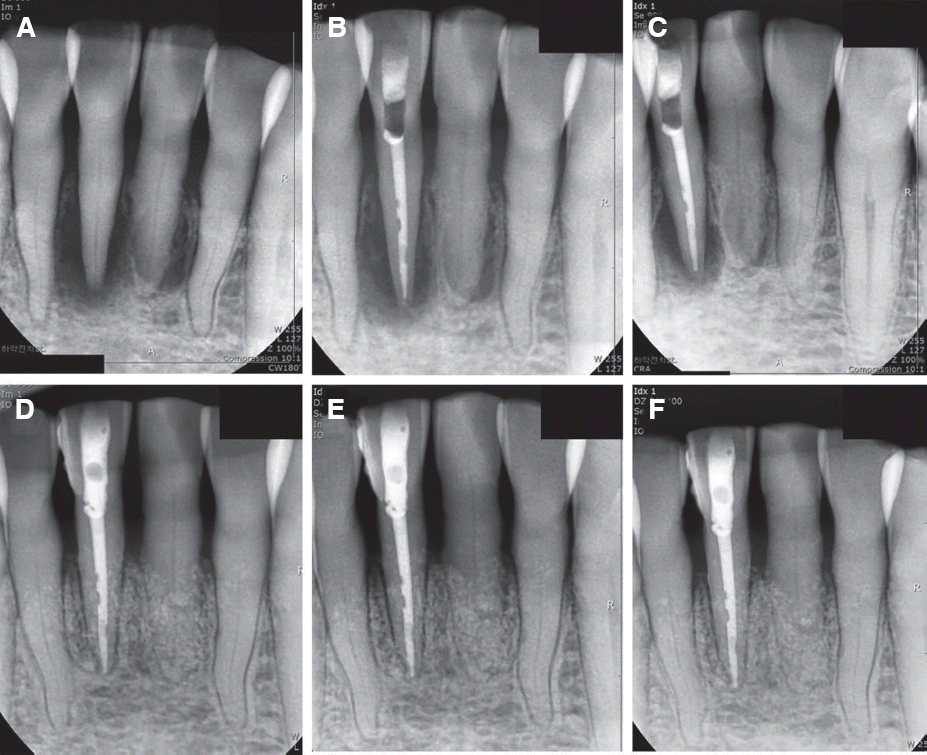




 PDF
PDF Citation
Citation Print
Print



 XML Download
XML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