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례: 61세 여자 환자가 2주 전부터 급격히 심해진 하부 흉골 뒤쪽의 찢어지는 듯하며 타는 듯한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연하통과 연하곤란도 함께 호소하였다. 환자는 2년 전부터 간헐적인 가슴쓰림으로 비미란성 위식도역류 질환 진단하 양성자펌프억제제를 복용하며 증상은 최근까지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었으나 , 금번에는 약에 대한 반응이 없다고 하였다. 그 외에 환자는 고지혈증과 골다공증으로 약을 복용중이었으며, 반복되는 구강 궤양과 HLA B51 양성 소견으로 6년 전부터 베체트병 의심 하에 콜히친 0.6 mg bid, 프레드니솔론 5 mg prn을 복용하며 추적 관찰하고 있었다. 내원 5개월 전부터 구강 궤양이 악화되어 아자티오프린 50 mg qd를 추가하면서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 2개월 전부터 자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면서 다시 구강 궤양이 악화된 상태였다.
내원 당시 전신 상태는 양호하였고, 활력 징후는 혈압 138/86 mmHg, 맥박수 90회/분, 호흡수 19회/분이었다. 말초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6,550/μL (정상 3,000-9,500), 혈색소 12.5 g/dL (정상 11.0-15.0), 혈소판 427,000/μL (정상 140,000-400,000) 였다. 생화학 검사에서 혈중요소질소 7.0 mg/dL (정상 8-19), 크레아티닌 0.59 mg/dL (정상 0.51-0.95), C-반응성 단백 12.9 mg/L (정상 0-5.0)였다. 심전도는 정상 범위였고 , 고감도 트로포닌 아이 검사 (high-sensitivity troponin I) 수치는 <3.00 ng/L (정상 0-39.59), D-dimer 0.27 ug/mL (정상 0-0.5)였다.
흉통의 강도가 매우 심하였기 때문에 급성 심혈관계 질환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특수 프로토콜의 심장 전산화단층 촬영(triple rule-out CT) 및 도플러 심장 초음파를 시행하였고, 모두 정상 소견으로 확인되어 급성 관동맥 증후군, 대동맥 박리증 , 폐동맥 색전증의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이어서 시행한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에서 상절치로부터 23-28 cm 위치의 중부 식도에 내강의 70% 이상을 광범위하게 침범한 약 6 cm 크기의 깊은 지도상 궤양 병변이 확인되었다(
Fig. 1). 해당 병변에 대하여 시행한 조직생검의 병리 소견에서 비특이적인 염증과 다수의 림프구의 침윤, 혈관염 소견이 확인되었다. 악성 세포의 증거는 없었고(
Fig. 2A), 항산균 염색 (acid-fast bacillus stain)은 음성이었다(
Fig. 2B). 추가로 시행한 면역조직화학 검사에서 거대세포 바이러스도 음성 소견을 확인하여 악성 종양이나 감염성 식도염의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Fig. 2C).
 | Fig. 1Upper endoscopic findings at the initial presentation revealing a large ulcerative lesion with an irregular border, occupying more than 70% of the circumference of the esophagu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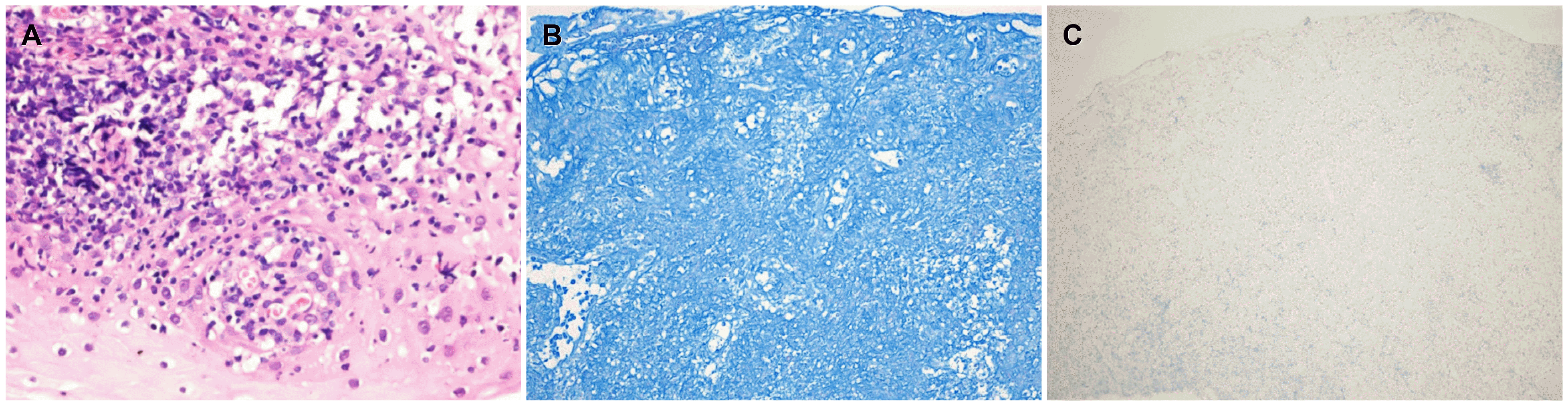 | Fig. 2(A) Histopathology findings of the endoscopic biopsy specimen showing heavy neutrophil infiltration in the esophageal mucosa and capillary proliferation suggesting vasculitis (H&E, x400). (B) Acid-fast bacillus special stain shows a negative result (Acid-fast stain, x200). (C) Immunohistochemistry assay for cytomegalovirus shows a negative result (Immunohistochemistry, x100). 
|
이를 바탕으로 환자는 과거 병력을 고려하여 베체트병의 식도 침범에 의한 소견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 류마티스내과 약제(콜히친 0.6 mg bid, 아자티오프린 50 mg qd)를 재개하고 프레드니솔론 20 mg qd 투약을 함께 시작하였다. 이후 흉통은 빠르게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투약을 다시 시작하고 4주 후부터 프레드니솔론을 감량하고 아자티오프린을 증량하기 시작하였다. 3개월 뒤 프레드니솔론 7.5 mg qd, 아자티오프린 100 mg qd, 콜히친 0.6 mg bid를 복용하며 시행한 추적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에서 식도 궤양은 크게 호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Fi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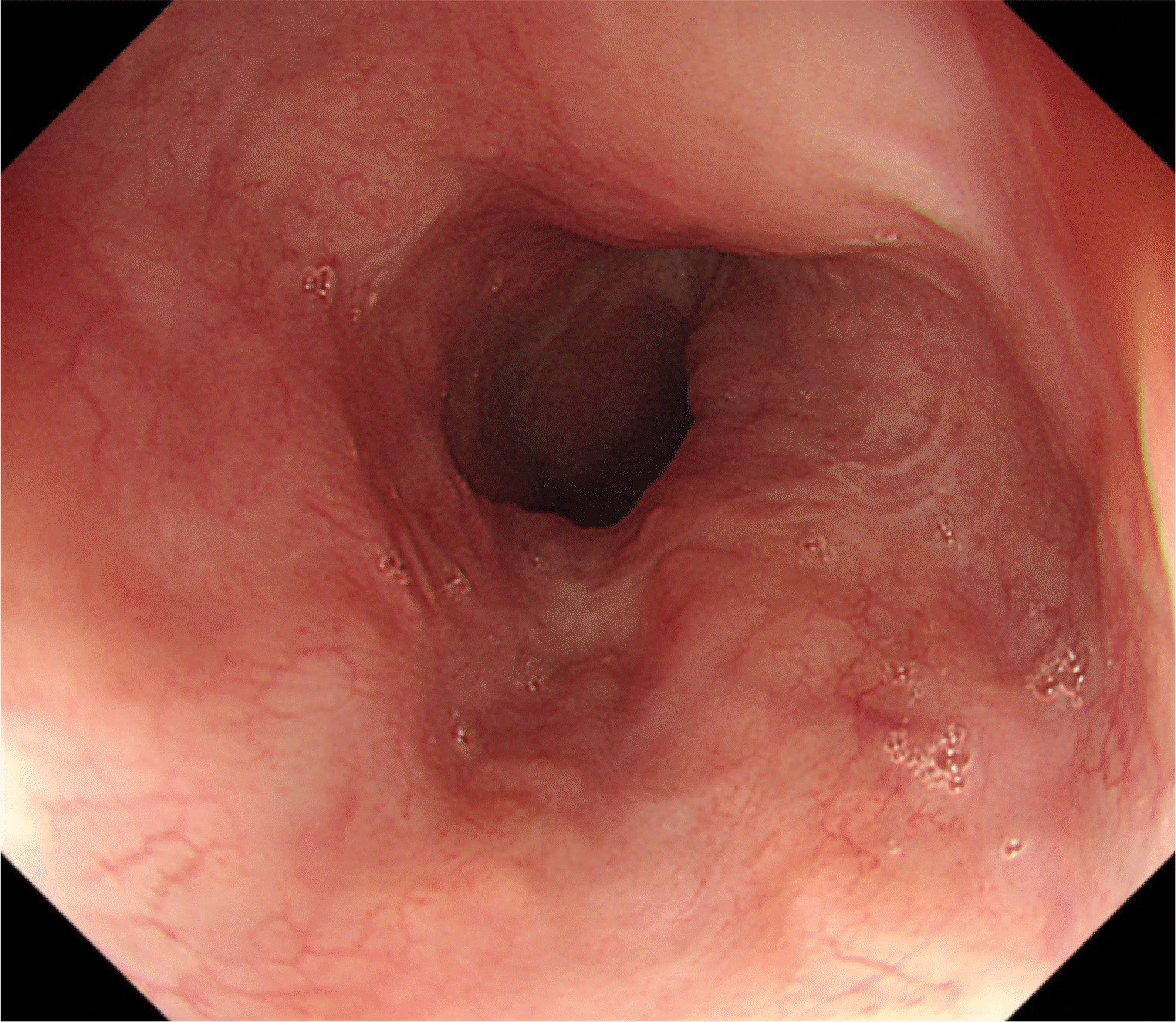 | Fig. 3Follow-up upper endoscopic finding. The previously observed ulcer has improved greatly and can be seen as a faint scar. 
|
진단: 베체트병의 식도 침범
베체트병은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다양한 기관을 침범하는 특발성의 염증성 질환으로서 반복적인 구강 궤양, 포도막염, 성기 궤양, 피부 병변 등이 특징적이다. 하지만 베체트병 의 발병 기전은 아직도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며, 발현 양상이 다양하고 진단적 가치가 있는 검사가 없어 진단에 어려움이 많다.
1
베체트병 환자에서 위장관 침범을 보이는 빈도는 다른 장기에 비해 낮은 편인데, 나라마다 2.9-60%까지로 그 편차가 큰 편이다. 질병의 이환율 및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며, 좋지 않은 예후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장관 증상이 동반된 경우 주로 나타내는 증상으로는 복통, 설사, 혈변 등이 있다. 위장관의 모든 구간을 침범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회맹부를 침범하는데 비해, 위, 십이지장, 공장의 침범은 드물고 식도의 침범은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도 침범 빈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베체트병 환자의 약 2-11%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문헌으로 보고되는 베체트병의 식도 침범 증례의 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
2
베체트병에 의한 식도 병변을 진단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으면 베체트병과의 연관성을 놓치기 쉽다. 기존의 보고에 따르면, 베체트병에 의한 식도 병변은 그 형태가 다양한데 중부 또는 하부 식도의 비특이적인 단발성 또는 다발성의 궤양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드물게 출혈, 천공, 누공이나 협착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가 보고된 바 있다.
3 이러한 궤양성 병변 외에, 무증상 베체트병 환자에서도 식도 조직 검사 소견, 식도내압 검사 소견을 모두 종합하면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알려진 것보다 식도 침범 빈도가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추정되기도 하나, 대부분의 경우 비특이 적인 소견을 보였다는 한계가 있다.
4 이에 모든 베체트병 환자에서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일률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으나, 상부위장관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는 적극적으로 시행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진단을 위해서는 다른 식도 질환과의 감별이 중요한데 , 베체트병으로 진단되었거나 의심되는 환자 에서 특히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가 많으므로 기회 감염이나 면역 저하와 연관된 식도 병변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거대세포 바이러스나 단순포진 바이러스 등에 의한 바이러스성 식도염, 결핵성 식도염 , 식도의 악성 종양과도 감별이 필요하겠으며 , 약제 유발 식도염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5
베체트병의 위장관 침범의 경우 치료는 그 중증도나 약제에 대한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데, 급성 악화를 보일 때에는 스테 로이드 투여가 빠른 병변의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5 일반적으로 경증일 경우 5-aminosalicylate derivatives 를, 더 중증일 경우 아자티오프린을 사용할 수 있다.
6,7 하지만 이러한 약제에 대한 치료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 , 일부에서 anti-TNF monoclonal antibody 와 같은 생물학적 제재, thalidomide 등의 약제를 사용해볼 수도 있다. 콜히친의 경우는 주로 베체트병의 피부 점막 침범이나 관절 침범, 구강 궤양 등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 위장관 침범에서는 그 역할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5,8 위장관 침범을 보인 베체트병 환자들의 약 1/3가량에서 출혈, 천공, 폐쇄 등으로 응급 수술이 필요하였다는 보고도 있어 , 위장관 침범이 있거나 의심 되는 환자들에서 면밀한 추적을 시행하고 ,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어야 하겠다.
9
본 증례와 같이 , 베체트병으로 진단되거나 관련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진단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흉통 , 연하통 등의 증상이 있을 시 반드시 식도 침범 가능성을 한번쯤 의심해 보아야 하겠다. 이를 통해 식도 침범의 발견과 치료가 늦어 져 심한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Go to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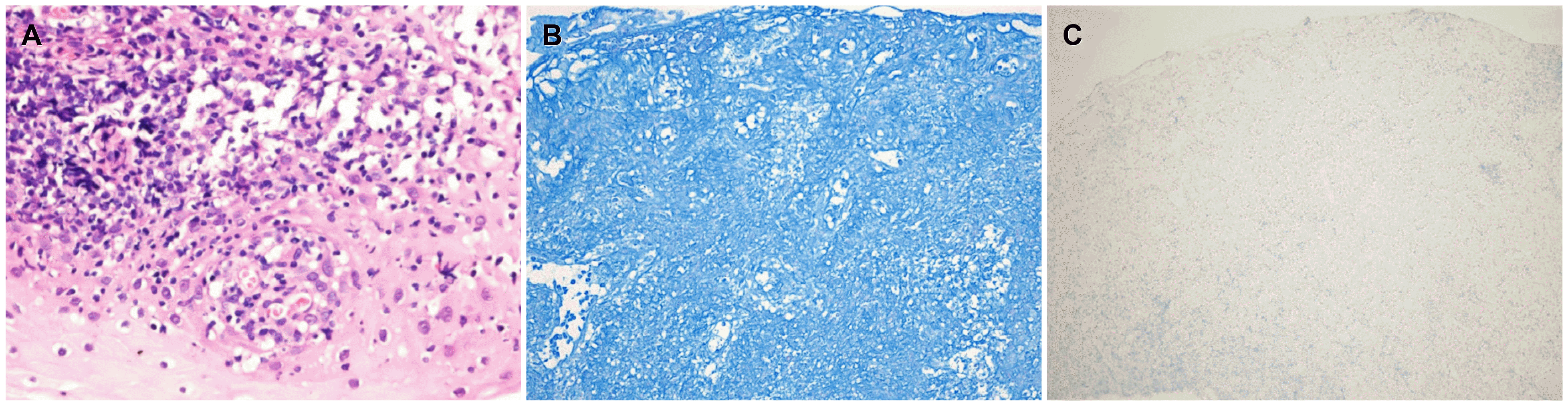




 PDF
PDF Citation
Citation Print
Pr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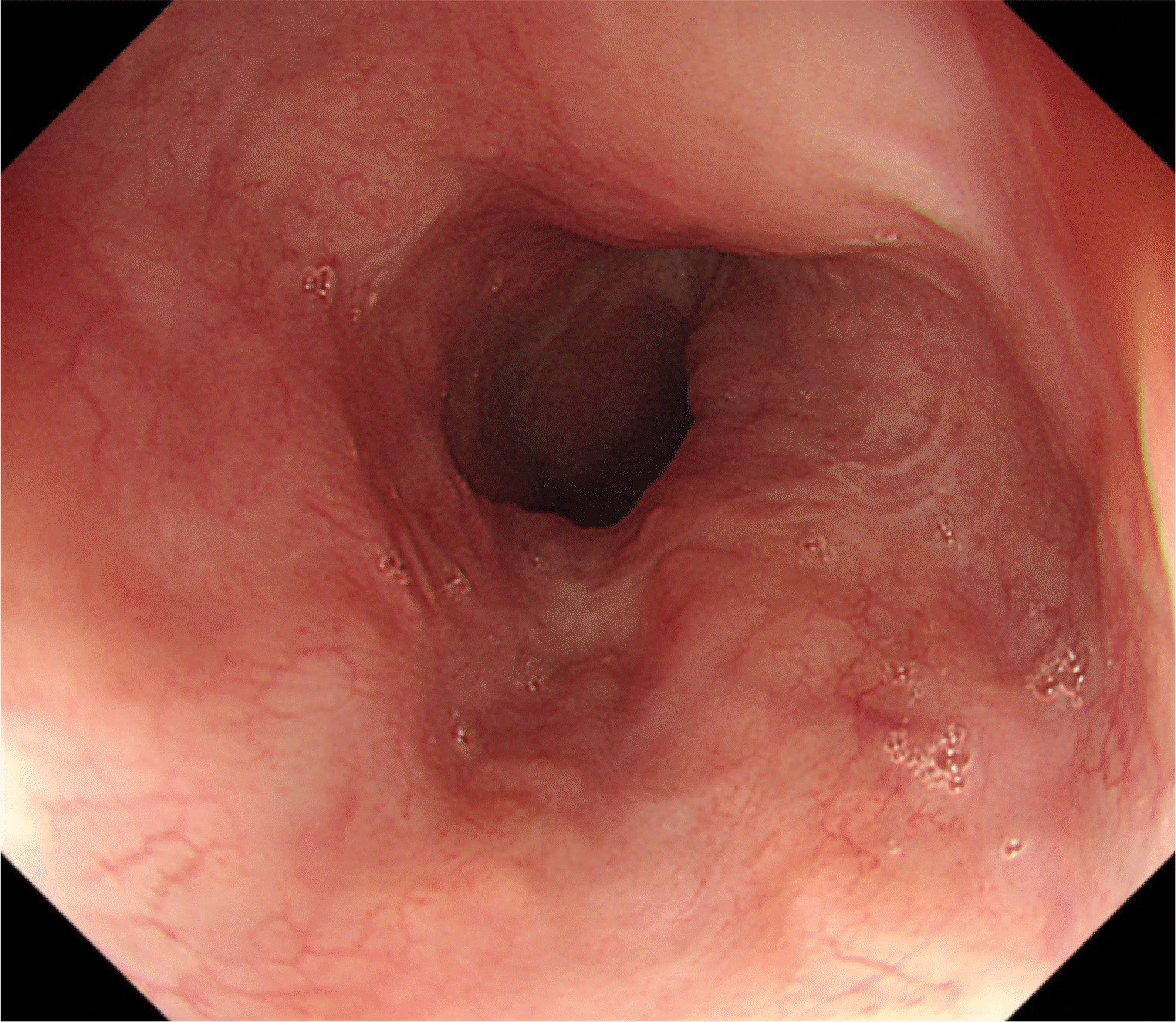
 XML Download
XML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