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대상 및 방법
실패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 대하여 재재건술을 시행하고 2년 이상 추시가 가능하였던 46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일차 재건술의 실패 원인과 동반 손상을 분석하였고, 임상적 평가는 2000 International Knee Documentation Committee (IKDC) 주관적 슬관절 점수, Lachman 검사, Pivot shift 검사와 KT-1000 arthrometer 검사를 이용하였다
초록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auses of failure after a primary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ACLR), associated injuries, and the clinical results of revision ACLR.
Materials and Methods
This study evaluated 46 patients (46 knees), who were followed at least two years after revision ACLR. The evaluations included the causes of failure after primary ACLR, associated injuries, 2000 International Knee Documentation Committee (IKDC) subjective knee scores, Lachman test, Pivot shift test, and KT-1000 arthrometer measurement.
Results
The most common cause of failure was trauma (27 patients, 58.7%) and 19 failures (19 patients, 41.3%) were caused using an inappropriate surgical technique. The associated injuries were meniscus tears in 29 cases (63.0%) and articular cartilage injuries of Outerbridge grade II to IV in 19 cases (41.3%). The IKDC scores, Lachman test, Pivot shift test, and KT-1000 arthrometer measurements were improved significantly at the final follow-up.
Conclusion
The most common cause of failure after primary ACLR was trauma. One stage revision ACLR resulted in relatively satisfactory stability but less satisfactory clinical function than the primary reconstruction, as reported previously, which is believed to be due to the more associated injuries.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은 일차 재건술에 비해 시행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술기가 어렵고 술 후 임상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3,4,5) 그 이유로는 일차 재건술 시 이미 형성된 골 터널의 부적절한 위치나 골 결손으로 인해 새로운 터널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일차 재건술보다 관절 강직 등의 합병증과 주변 구조물의 손상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는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르며, 골 터널이 확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이식물을 고정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전방십자인대 손상에 따른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시행 빈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재건술 후에 다시 스포츠 활동에 복귀하는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이식건의 재파열이나 실패로 재재건술을 시행 받는 빈도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발생하는 이식건의 실패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외상이나 기술적인 문제, 감염, 이식물 융합의 실패, 지나친 재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7,8,9) 따라서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이식건의 실패 원인과 동반 손상을 정확히 분석하여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많은 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의 이식건의 실패 원인과 임상적 추시 결과를 보고한 논문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일차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실패 원인과 재재건술 시 동반 손상을 분석하고, 술 후 안정성 및 임상적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가설은 재재건술 시의 동반 손상이 일차 재건술의 경우보다 많으며, 임상적 결과도 좋지 못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전에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 중 슬관절부 통증 및 불안감이 있으며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이식물의 재파열 소견이 보이고 이학적 검사상 중등도의 전방 전위(grade 2) 이상의 슬관절의 전방 동요가 관찰되는 경우를 실패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로 정의하였다. 2001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실패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 대하여 단일 다발을 사용한 한 단계 재재건술을 시행하고 2년 이상 추시가 가능하였던 46예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동반된 인대 손상이 있는 경우와 양측 십자인대 파열이 있는 경우, 감염이 있었던 경우, 관절섬유증,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등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남자가 41명, 여자가 5명이었으며 수술 당시 평균 연령은 31.0세(17–49세)였다. 일차 재건술을 타원에서 시행 받은 경우가 23예(50.0%),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시행받은 경우가 23예(50.0%)였다. 재건술 후 재재건술까지의 평균 기간은 55.3개월(5–164개월)이었으며, 평균 추시 기간은 35.3개월(24–92개월)이었다.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일차 재건술의 실패 원인과 동반 손상을 분석하였고, 임상적 평가를 위해 주관적 검사로 술 전 및 술 후 최종 추시점에서 International Knee Documentation Committee (IKDC, 2000) 주관적 슬관절 점수를 측정하였다. IKDC 주관적 슬관절 점수는 18개의 항목의 결과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로 하였으며, 이를 다시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객관적 검사로 Lachmann 검사, Pivot shift 검사, KT-1000 arthrometer 검사상 환측 대비 건측의 전방 전위 차이를 시행하였고 이러한 동요 검사의 결과는 IKDC 슬관절 검사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고 평가하였다. IKDC 슬관절 검사는 부종, 운동 범위, 인대 검사와 기타 4가지 항목을 평가하나 부종, 운동 범위, 인대 검사의 결과로만 최종 등급을 정하였다.
수술은 동일 술자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이식건 및 이식골의 준비, 대퇴 과간 절흔 성형술, 골 이식, 경골 및 대퇴 터널의 재 천공, 이식건의 고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일차 재건술 시 사용한 이식물은 자가건 5예(골-슬개건-골 4예, 슬괵건 1예), 동종건 32예(경골건 21예, 아킬레스건 8예, 골-슬개건-골 3예), 인조 인대 9예였으며,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 시 사용한 이식물은 동종 아킬레스건 34예, 동종 경골건 12예였다. 일차 재건술 시 형성한 대퇴 터널의 골 결손으로 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 동종 아킬레스건을 사용하였고 그 외 터널 중복이 없거나 일차 재건술 시 형성한 터널의 위치가 적절하며 터널 확장이 심하지 않은 경우, 인조 인대를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 경골건을 사용하였다.
동종 아킬레스건은 종골 부위를 길이 25–30 mm, 직경 10 mm로 다듬고 관절 내 이식건의 길이는 30 mm로 하였으며 경골 부위는 whip stich를 시행하였다(Fig. 1). 필요할 경우 동종 아킬레스건에 부착되어 있는 종골의 피질-망상골을 이용하여 대퇴골 및 경골의 골 결손부에 골 이식을 시행하였다. 관절경하에서 전방십자인대 잔존물에 대해 변연 절제를 시행하고 대퇴 과간 절흔 성형술은 최소한으로 시행하였다. 경골 터널은 일차 수술의 대부분의 예에서 시행되었던 55°–60°보다 작은 40°-45°로 하여 새로운 터널을 형성하였다. 대퇴 터널은 슬관절을 100° 이상 굴곡한 자세에서 전내측 통로를 통하여 건의 직경에 따라 9–10 mm의 천공기를 이용해 30 mm 깊이로 재확공을 하였다. 이로써 기존의 경 경골 대퇴터널의 경 경골 방향과 다르게 대퇴터널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간섭 나사와 이식물의 다방향성(divergence)을 없앨 수 있었다. 기존의 대퇴 터널과 새로 형성할 대퇴 터널이 중복이 되었을 때에는 기존의 터널에 이식할 동종 아킬레스건에 부착되어 있는 종골의 피질-망상골을 이용하여 골 이식을 한 후 터널을 형성할 때 역회전으로 재확공하였다(Fig. 2, 3).10) 동종 경골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새로 형성된 경골 터널을 통해 offset guide의 후각을 위치시킨 후 유도 강선을 삽입한 뒤 핀을 따라 준비된 이식물의 지름과 같은 크기의 확공기를 이용하여 대퇴 터널(25–30 mm)을 완성하였다.
이식건을 경골 터널을 통하여 대퇴 터널로 통과시키고 대퇴부의 고정은 동종 아킬레스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흡수성 간섭 나사를 사용하여 고정하였고, 동종 경골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흡수성 횡고정 핀인 RIGIDfix cross pin (DePuy Mitek, Raynham, MA, USA)을 사용하여 대퇴골 외상과부위에서 대퇴 터널로 관통시켜 고정하였다. 경골부의 고정은 모든 예에서 슬관절을 신전시켜 이식건을 긴장시킨 상태에서 이식건이 대퇴 과간 절흔과 충돌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경골 터널의 지름과 같은 크기의 흡수성 간섭 나사로 고정한 후 screw와 spiked washer로 이중 고정하였다.
실패 원인은 외상이 27예(58.7%)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스포츠 손상(high velocity trauma)이 18예, 낙상(trivial trauma)이 9예였다. 비외상에 의한 수술 실패는 19예(41.3%)였다. 이 중 대퇴 터널의 부정 위치가 10예(21.7%), 경골 터널의 부정위치가 1예(2.2%), 인조인대 사용에 따른 실패가 7예(15.2%)였다. 터널의 부정 위치에 있어서는 대퇴 터널이 과다 수직인 경우가 5예, 과다 전방인 경우가 3예, 과다 수직이면서 과다 전방인 경우가 2예에 해당하였고, 경골 터널은 과다 전방인 경우에 해당하였다. 외상력이 없고 경골 및 대퇴 터널의 위치에도 이상이 없는 경우가 1예(2.2%) 있었으며 이는 이식물 융합의 실패로 판단하였다(Table 1).
실패 원인이 외상이었던 군과 비외상이었던 군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재건술 이후 재재건술까지의 기간은 외상이었던 군에서 평균 53.1개월, 비외상이었던 군에서 평균 58.9개월이었다.
동반 손상의 경우 전체 46예 중 반월상 연골 손상 29예(63.0%), Outerbridge 등급 II 이상의 관절 연골 손상이 19예(41.3%)에서 확인되었다. 반월상 연골 손상 중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12예(26.1%), 외측 반월상 연골 손상 6예(13.0%),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 동반 손상 11예(23.9%) 관찰되었으며 이에 대한 치료로 부분 절제술 13예, 아전 절제술 10예, 전 절제술 1예, 봉합술을 10예에서 시행하였다(Table 2, 3, 4). Outerbridge 등급 II 이상의 관절 연골 손상은 대퇴 내과 11예, 경골 내과 5예, 대퇴 외과 4예, 경골 외과 3예, 슬개-대퇴 7예에서 관찰되었으며 14예에서는 연골성형술을, 2예에서는 미세골절술을 시행하였다(Table 3, 4).
실패 원인이 외상이었던 군과 비외상이었던 군을 비교해 보았을 때 반월상 연골 손상 및 관절 연골 손상의 빈도는 외상이었던 군에서 각각 18예(66.6%), 12예(44.4%)였고, 비외상이었던 군에서 각각 11예(57.9%), 7예(36.8%)였다.
임상적 결과에서 IKDC 점수는 술 전 평균 49.4점(20–72점)에서 최종 추시 시 82.8점(67–91점)으로 의미 있게 향상되었다(p<0.05). Lachman 검사는 술 전 모든 예에서 양성(+1, 18예; +2, 23예; +3, 5예)이었으나 최종 추시 시 40예(86.9%)에서 음성 또는 경도의 전방 전위(+1, firm end point), 6예(13.0%)에서 중등도의 전방 전위(≥+1)를 보였다(p<0.05). Pivot shift 검사는 술 전 모두 양성에서 최종 추시 시 음성인 경우가 38예(82.6%), 경도의 양성(+1)인 경우가 8예(17.4%)였다(p<0.05). KT-1000 arthrometer 검사는 술 전 평균 6.8 mm (3–5 mm, 10예; 6–10 mm, 31예; >10 mm, 5예)에서 최종 추시 시 평균 2.6 mm (0–2 mm, 27예; 3–5 mm, 14예; 6–10 mm, 5예)로 의미 있게 향상되었다(p<0.05) (Table 5). 전 예에서 최종 추시 시까지 감염이나 관절섬유화(arthrofibrosis)와 같은 합병증은 없었다.
본 연구 결과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 시 술 전 실패의 원인은 외상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적절한 수술 술기에 따른 실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손상 및 각종 사고의 증가로 전방십자인대 손상의 빈도가 늘어나면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시행 빈도도 증가하고 있지만, 술 후 이식건의 실패나 재발성 슬관절 불안정성 등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인해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의 빈도도 점점 늘고 있다.11)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발생하는 이식건의 실패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Johnson과 Coen6), Johnson 등7)은 기술적인 문제, 외상, 이식물 융합의 실패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기술적인 문제가 가장 흔하다고 하였다. 또한 기술적인 문제 중에는 대퇴 터널의 부적절한 위치가 가장 주된 원인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보고된 다기관 코호트 연구9)에 따르면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을 시행하는 데 있어 가장 흔한 단일 원인은 외상이 약 32%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약 2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술적인 문제 중 대퇴 터널의 부적절한 위치가 80%로 가장 많았으며 경골 터널의 부적절한 위치가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Wright 등8)은 가장 흔한 원인은 외상으로서 49%를 차지한다고 하였으며 두 번째는 기술적인 문제로 46%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외상에 의한 원인이 27예(58.7%)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는 18예(39.1%)에서 기술적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차 수술 시 사용된 이식물이 동종건인 경우 자가건보다 수술 후 결과도 좋지 않고 실패율도 높다는 보고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일차 수술 시에 사용된 이식물이 동종건인 경우가 자가건인 경우보다 더 많았다. 이는 비용적 문제, 느린 생물학적 재형성 속도, 감염성 질병의 전파 우려, 면역 거부 반응의 가능성 등과 함께 제기되는 동종건의 단점 중 하나이다.12,13,14)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의 목표는 슬관절을 안정화시키고 관절연골 및 반월상 연골의 추가적인 손상을 막고 슬관절의 기능을 최대로 회복시키는 데 있다.3,15,16,17) 다기관 코호트 연구9)에 따르면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 시 74%에서 반월상 연골 손상을 동반하며,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은 40%, 외측 반월상 연골 손상은 35%로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이 더 흔하다고 하였다. Wright 등8)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재재건술 시 56%에서 반월상 연골 손상이 동반되어 있었으며, 37%에서 modified Outerbridge classification 등급 II 이상의 관절 연골 손상이 관찰되었다고 하였다. Grossman 등17)은 특히 내측 구획의 손상이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만성적인 인대의 실패와 계속적인 스포츠 활동은 연속적인 관절 연골 및 반월상 연골의 손상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반월상 연골 손상 29예(63.0%), 관절 연골 손상 19예(41.3%), 반월상 연골 및 관절 연골 동반 손상 12예(26.1%)로 분석되었으며 반월상 연골 손상 중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이 12예(26.1%)로 더 많은 손상 빈도를 보였으며, 관절 연골 손상 역시 내측 구획에서 주요하게 발생하였다.
Cohen 등18)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10–15년 추시에서 술 후 관절증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반월상 연골의 절제라고 하였으며 안정성 면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이더라도 기능적으로 더 나쁜 결과와 관계된다고 하였다. Shelbourne과 Nitz19)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5–15년 추시에서 다른 동반 손상과 비교하여 양측 반월상 연골을 부분 또는 전 절제한 경우가 주관적 점수가 가장 낮았다고 하였다. Kamath 등20)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이후에 관절연골 및 반월상 연골 손상이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 이후의 임상적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Thomas 등21)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군과 재재건술군을 비교하여 재재건술군에서 관절연골 및 반월상 연골의 손상률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고, 재재건술 군에서의 높은 관절연골 및 반월상 연골의 동반 손상률이 재재건술 후의 좋지 못한 임상적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반월상 연골 손상의 동반율이 63.0%, 관절 연골 손상의 동반율은 41.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재건술 시 관절 연골 손상 및 반월상 연골 손상이 만성화된 경우가 많아 봉합술 대신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볼 때 이러한 요소들이 술 후 환자들의 주관적 만족도를 감소시켰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재재건술 시 임상적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동반 손상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치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술 전 환자에 대한 면밀한 검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향후 장기 추시를 통하여 슬관절 전방 불안정성 발생 여부와 동반 손상의 종류 및 치료에 따른 관절증의 발생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수술 술기가 점점 발전해 감에 따라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의 가장 흔한 단일 원인이 기술적인 문제에서 외상으로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며, 적절한 수술 술기를 통해서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의 빈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겠다.
Figures and Tables
 | Figure 2Bone defects of pre-constructed femoral and tibial tunnels filled with calcaneal corticocancellous bone. |
References
1. Battaglia MJ 2nd, Cordasco FA, Hannafin JA, et al. Results of revision anterior cruciate ligament surgery. Am J Sports Med. 2007; 35:2057–2066.

2. Freedman KB, D'Amato MJ, Nedeff DD, Kaz A, Bach BR Jr. Arthroscopic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a metaanalysis comparing patellar tendon and hamstring tendon autografts. Am J Sports Med. 2003; 31:2–11.

3. Martinek V, Imhoff AB. Revision of failed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Orthopade. 2002; 31:778–784.
4. Pinczewski LA, Deehan DJ, Salmon LJ, Russell VJ, Clingeleffer A. A five-year comparison of patellar tendon versus four-strand hamstring tendon autograft for arthroscopic reconstruction of the anterior cruciate ligament. Am J Sports Med. 2002; 30:523–536.

5. Rappé M, Horodyski M, Meister K, Indelicato PA. Nonirradiated versus irradiated Achilles allograft: in vivo failure comparison. Am J Sports Med. 2007; 35:1653–1658.
6. Johnson DL, Coen MJ. Revision ACL surgery. Etiology, indications, techniques, and results. Am J Knee Surg. 1995; 8:155–167.
7. Johnson DL, Swenson TM, Irrgang JJ, Fu FH, Harner CD. Revision anterior cruciate ligament surgery: experience from Pittsburgh. Clin Orthop Relat Res. 1996; 325:100–109.

8. Wright RW, Gill CS, Chen L, et al. Outcome of revision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a systematic review. J Bone Joint Surg Am. 2012; 94:531–536.

9. MARS Group. Wright RW, Huston LJ, et al. Descriptive epidemiology of the Multicenter ACL Revision Study (MARS) cohort. Am J Sports Med. 2010; 38:1979–1986.

10. Battaglia TC, Miller MD. Management of bony deficiency in revision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using allograft bone dowels: surgical technique. Arthroscopy. 2005; 21:767.

11. Wolf RS, Lemak LJ. Revision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surgery. J South Orthop Assoc. 2002; 11:25–32.
12. Schilaty ND, Nagelli C, Bates NA, et al. Incidence of second anterior cruciate ligament tears and identification of associated risk factors from 2001 to 2010 using a geographic database. Orthop J Sports Med. 2017; 5:2325967117724196.

13. Grassi A, Nitri M, Moulton SG, et al. Does the type of graft affect the outcome of revision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a meta-analysis of 32 studies. Bone Joint J. 2017; 99:714–723.
14. Osti L, Buda M, Osti R, Massari L, Maffulli N. Preoperative planning for ACL revision surgery. Sports Med Arthrosc Rev. 2017; 25:19–29.

15. Allen CR, Giffin JR, Harner CD. Revision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Orthop Clin North Am. 2003; 34:79–98.

16. Garofalo R, Djahangiri A, Siegrist O. Revision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with quadriceps tendon-patellar bone autograft. Arthroscopy. 2006; 22:205–214.

17. Grossman MG, ElAttrache NS, Shields CL, Glousman RE. Revision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three- to nine-year follow-up. Arthroscopy. 2005; 21:418–423.

18. Cohen M, Amaro JT, Ejnisman B, et al.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after 10 to 15 years: association between meniscectomy and osteoarthrosis. Arthroscopy. 2007; 23:629–634.

19. Shelbourne KD, Nitz PA. Anterior cruciate ligament injuries in school aged athletes. In : Reider B, editor. Sports medicine: the school aged athlete. Philadelphia: WB Saunders;1991.




 PDF
PDF ePub
ePub Citation
Citation Print
Pr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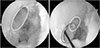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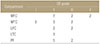


 XML Download
XML Download